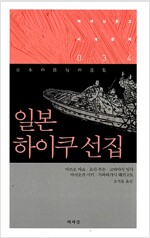
책세상문고 세계문학 34
일본 하이쿠 선집
<하이쿠는 5.7.5의 음수율을 지닌 17자로 된 일본의 짧은 정형시>
‘단가’는 5.7.5.7.7의 31자로 된 일본 고유의 정형시로 와카(和歌)라고도 하며, 하이쿠는 단가의 5.7.5.7.7에서 앞의 5.7.5을 독립시킨 17자의 단시를 의미한다. 하이쿠는 원래 에도시대의 하이카이(俳諧)가 모태로, 언어의 유희 내지는 해학적인 내용이 주로 담겨 있어 여흥의 하나로 즐기던 문학이다. 그러던 것이 마쓰오 바쇼(松尾芭蕉)의 출현으로 격조 높은 문예로 승화되었는데, 메이지(明治)시대에 들어 마사오카 시키가 혁신운동을 벌이면서부터 하이쿠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
마쓰오 바쇼 (松尾芭蕉, 1644년~1694년)
1. 말 터벅터벅, 날 그림으로 보는, 여름의 들판
2. 풀 베개 신세
개도 겨울비에 젖나
밤의 목소리
草枕犬も時雨るるか夜の声
풀 베개는 여행지에서 잠을 청하는 바쇼의 상태를 짐작하게 한다. 그런 그에게 어둠속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것도 좀 거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들려온다. 개는 쓸쓸한 겨울비를 견디기 어려워서 울고 있는 것이다. 바쇼도 개와 마찬가지로 겨울비에 젖는다. 낯선 여행지에서 겨울비를 맞는 처량한 느낌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p.10)
(같이 읽으면 좋은 책)

풀베개 - 나쓰메소세키 (오석륜 옮김, 책세상)
..................................................................
3. 길가에 핀, 무궁화는 말에게, 먹혀버렸네
4. 꾀꼬리여, 버드나무 뒤인가, 풀숲 앞인가
5. 가을바람에, 풀숲도 밭두둑도, 후하의 관문
6. 산길에 와서, 어쩐지 마음 끌리는, 제비꽃이네
7. 한 지붕 아래, 기녀도 잤느니라, 싸리와 달빛
8. 장맛비 내려, 두루미의 다리가, 짧아졌느냐
9. 뜨거운 해를 바다에 넣었구나, 모가니 강물
10. 고요함이여, 바위에 스며드는, 매미의 소리
11. 여행에 병드니, 꿈에서 마른 벌판, 헤매 다니네
12. 들여다보니, 냉이 꽃 피어 있는, 울타리구나
13. 오랜 연못에
개구리 뛰어드는
물소리 '텀벙'
古池や蛙飛び込む水のおと
아주 조용한, 인기척도 없는 오래된 연못가. 이미 봄도 깊어진 무렵의 어느 날. 개구리 한 마리가 물속에 뛰어 들었다. 주위가 너무나도 조용하고 평온했던 만큼 한순간 정적이 깨졌지만 또한 정적의 상태로 되돌아간 것이다. 고요함이 시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개구리와 관련하여 일본의 전통적인 시 형식인 와카나 렌가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울음소리다. 그에 반해 이 구는 물에 뛰어드는 개구리의 소리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참신함ㅁ이 돋보인다. 전통적인 서정을 버리고 개구리가 "텀벙" 물에 뛰어든 극히 비근한 장면을 소재로 다룬 이는 바쇼가 최초가 아닐까 싶다. 이 비근한 친밀감은 바로 하이카이 근본의 골계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 골계에 대해서 "오랜 연못에"라는 다섯 글자를 배치했을 때, 골계는 침잠하고 내면화되어 한적고담의 풍취가 지배하게 된다. "오랜 연못"과 "텀벙"소리는 서로가 미묘한 균형을 취하며 시정을 깊게 한다. 이 작품은 일본의 하이쿠를 얘기할 때마다 소개될 만큼 유명하다. - 계절어: 개구리(봄) (p.21)
(같이 읽으면 좋은 책)

도련님 - 나쓰메 소세키 (오유리 옮김, 문예세계문학)
.........................................................................................
14. 아빠 엄마가, 자꾸자꾸 그리운, 꿩 우는 소리
15. 선뜩선뜩한, 벽을 밟아가면서, 낮잠을 자네
16. 가을은 깊고, 이웃은 무얼 하는, 사람들일까
17. 나그네라고, 나를 불러보는, 이른 겨울비
18. 거친 바다여, 사도섬에 가로놓인, 은하수
19. 피안 벚나무, 꽃이 피면 늘그막, 생각이 나고
20. 여름 잡초여, 병사들 고함소리, 꿈의 자췬가
21. 매화 향기에, 아침 해 불쑥 솟는, 산길이로다
22. 꽃구름 속에, 종소리는 우에노인가, 아사쿠사인가
23. 무덤도 움직여라, 내가 우는 소리는, 가을의 바람
24. 따가운 햇살은, 아무런 변함 없이, 가을의 바람
25. 겨울날이여
말 위에 얼어붙은
그림자
冬の日や馬上に氷る影法師
이 시의 전문은 "논 사이에 좁은 길이 있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몹시 추운 곳이다"라고 되어 있다. 바람이 매서운 어느 겨울날, 말 위에 유랑을 하는 바쇼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이 시를 두고 바쇼의 시선이 말을 향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자신의 그림자를 향해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실제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바쇼가 방랑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림자를 통해 살피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림자는 자신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투영은 곧 자기 성찰을 의미한다. (p.33)
(같이 읽으면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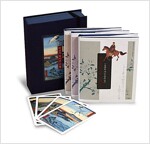
바쇼의 하이쿠 기행 - 바쇼 (김정례 옮김, 바다출판사)
.............................................................................................
26. 가는 봄이여
새는 울고 물고기
눈에는 눈물
行春や鳥啼魚の目は泪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헤어짐을 경험한다. 사랑하는 사람과도 헤어지게 되어 있다. 바쇼는 이 시를 통해 봄이 다해갈 무렵 제자들과 헤어지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봄도 지나갈 무렵, 그 아쉬움을 참기 어려워 새는 울고 물고기의 눈에는 눈물이 흥건하다. 그것을 바로 바쇼 일행의 이별을 슬퍼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한 석별의 슬픔을 나타내고자 허공의 새와 물속의 어류를 빌려왔다. 봄날의 이별은 왠지 더 가슴 아프다. (p.34)
27. 삭은 치아에, 어쩌다가 씹힌다, 김 속의 모래
28. 우울한 나를, 더 쓸쓸하게 하라, 뻐꾸기여
29. 장마 빗줄기, 남기고 뿌렸는가, 히카리도오
30. 이 길이여, 행인 없이 저무는, 가을의 저녁
31. 거룩하구나, 녹음과 신록위에, 빛나는 햇빛
32. 추석 달이여, 연못을 맴돌면서, 밤을 지새운다
33. 무슨 나무의, 꽃인 줄 모르지만, 향기롭구나
34. 밝은 달이여, 북쪽지역 날씨는, 알 수가 없네
35. 가라사키의, 소나무는 꽃보다, 어스름하네
36. 명월이구나
문에 밀려오는
밀물의 물마루
明月や門にさし來ル潮がしら
이 작품에 대해서 일본 근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의 한 사람인 고다 로한은 다음과 같은 감상을 전하고 있다. "평소에는 문에 미치지 못하는 밀물이 이때는 넘치도록 문으로 다가온다. 하늘에는 둥근 달이 있고, 문ㄴ에는 밀물이 넘친다. 이 시에는 활동이 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시다...도쿄만의 밀물은 가을밤에는 7척이나 되는 높이로 부풀어 오른다." 문으로 다가오는 명월과 물마루는 각각 하늘과 바다에 존재하는 이름이다. 물마루는 밀물의 가장 앞쪽을 가리키는 말이다. 달이 가장 밝을 때 물마루가 사람이 생활하는 문을 향해 다가온다고 표현하는 바쇼의 자연의 섭리에 대한 감각은 놀랍다. 하늘, 육지, 바다의 세 공간이 조화를 이루어내도록 표현 한 것은 어지간한 언어 감각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p.44)
(같이 읽으면 좋은 책)

오층탑 - 고다 로한 (이상경 옮김, 소화)
..............................................................
37. 달이 밝아라, 유교 고승 지고 온, 모래 위
38. 나비의 날개, 몇 번이나 넘는가, 담장의 지붕
39. 파란 버들가지, 진흙에 드리워진, 썰물일까나
40. 오두막집도, 주인이 바뀌는 때, 히니 인형집
41, 고마워라, 눈의 향기 감도는, 미나미다니
42. 서늘함이여, 초승달이 떠 있는, 하구로 산
43. 논에, 모 심고 떠나가는, 버드나무로다
44. 두견새 날고, 큰 대숲 담아내는, 달빛이어라
45. 논이랑, 보리랑, 그 속에도 여름의, 두견새 있네
46. 말해선 안 되는, 유도노에 적시는, 옷소매여라
47. 오징어 장수, 목소리 헷갈리는, 두견새 울음
48. 오동나무에, 메추라기가 우는, 담장의 안쪽
49. 국화 진 다음, 무보다 더 나은 것, 또 있을까나
50. 종소리 사라져, 꽃향기 울려 퍼지는, 저녁이로세
.......................................................................................
요사 부손 (与謝蕪村, 1716년 ~ 1784년)
1. 봉래산 가서, 축제나 한번 하세, 늘그막의 새해에
2. 세 그릇되는, 떡국이 돌아오네, 가장의 모습
3. 후지 산 보며, 지나는 사람있네, 연말 대목장
4. 두 그루로세, 매화야 지속을, 사랑하누나
5. 스님 제사의, 종이 울리는구나, 골의 얼음마저
6. 긴 봄 햇살에, 꿩이 내려앉았다, 다리 위에
7. 봄날의 바다, 하루 종일 쉼 없이, 출렁거리네
8. 고려의 배가, 그냥 지나쳐 가는, 봄 안개로세
9. 유채꽃이여, 달은 동쪽에 있고, 해는 서쪽에
10. 가는 봄이여
찬자를 원망하는
노래의 작자
行春や撰者をうらむ哥の主
부손에게는 왕조 시대의 생각을 떠올리며 지은 시가 많이 있는데, 이 죽품도 그중 하나다. 어떤 이가 칙찬집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며 회심의 노래를 지었지만, 결국은 입선되지 못했다. 부손은 바로 그 노래를 지은 작가를 생각하며 이 구를 읊었다. 그 작가는 새삼스레 원망한다고 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지만, 그렇게 자신이 있었던 자기 노래를 이번 칙찬집에서 떨어뜨린 선자가 미웠을 것이다. 칙찬집이란 천황의 명으로 시가나 문장 따위를 추려서 만든 책이다. 그렇게 그 가인은 언제까지나 푸념을 늘어놓는다. 봄은 가련한 낙선자 한 사람을 내버려두고 떠나려 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이 구에 담겨 있다. 가는 봄을 아쉬워하는 마음, 계절의 추이에 따른 일말의 애상감과 육체적 권태감 등을 낙선한 가인의 푸념과 어우러지게 한 것은 부손이 이루어낸 새 지평이라 할 만하다. 부손의 왕조 취미가 뛰어난 구를 생산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리라. (p.70)
(같이 읽으면 좋은 책)

모노가타리에서 하이쿠까지 (한국일어일문학회, 글로세움)
...............................................................................................
11. 목숨을 잃는, 부부가 됐을 것을, 옷 갈아입네
12. 두견새로세, 헤이안 성을 나네, 비스듬하게
13. 모란은 지고, 부딪쳐 겹쳐지네, 꽃잎 두세 장
14. 자기 이름 대라, 장대비 오는 조릿대 벌판, 두견새로세
15. 남생이 새끼여, 청회색 숫돌도 모르는, 맑은 산의 물
16. 시원함이여, 종에서 떠나가는, 종소리여라
17. 입추로구나, 백비탕 향기로운, 시약원이여
18. 소오아미의, 초저녁잠 깨우네, 대문자로세
19. 달이 밝은 밤, 가난한 마을을, 지나갔노라
20. 철새 날아와, 울음 울어 기쁘다, 나무 차양에
21. 도바전으로, 오륙기 서두르는, 태풍이어라
22. 국화의 이슬
물 대신 받아서
긴 벼루 목숨
きくの露受し硯のいのち哉
산골 마을에 아름다운 국화를 키우고 있는 집이 있다고 해서 보러 갔다. 그러자 주인인 노인이 종이와 벼루를 꺼내서 하이쿠를 지어달라고 부탁했다. 이때 부손이 이 시를 써서 건넨 것이다. 붓, 묵, 벼루가 있는데 그중에서 붓의 생명이 가장 짧고 벼루의 생명이 가장 길다. 지금 청을 받은 대로 국화에 피어 있는 이슬을 물 대신에 벼루에 받아서 쓰기로 했다. 벼루의 생명은 그로 인해 더욱더 늘어날 것임을 이 시는 암시한다. 그 정취가 깊다. 일본에서는 상당히 많이 알려진 작품이다. (p.84)
(같이 읽으면 좋은 책)

부송(요사부손) 하이쿠와 삶의 미학 - 유옥희 (제이앤씨)
.........................................................................................
23. 둥근 쟁반의, 메밀잣밤나무 열매, 옛 소리런가
24. 물새들이여, 배에서 나물을 씻는, 여인이 있네
25. 을씨년하네, 들에 해 떨어지는, 겨울 들판이여
26. 눈에 꺾인 가지여, 눈을 뜨거운 물로 만드는, 가마 밑이네
27. 파 사가지고, 마른 나무 사이를, 돌아왔노라
28. 역수 강물에, 흰 파 흘러내리는, 추위로구나
29. 도끼질하다
향기에 놀랐다네
겨울나무 숲
斧入て香におどるくや冬木立
겨울나무 숲에서 적당한 나무를 골라 도끼질을 한다. 완전히 잎이 떨어지고 바싹 말라버린 듯이 보이는 나무지만 막상 도끼를 박아 넣어보니 신선한 향기가 나고 생명이 맥박 치는 소리가 전해져 깜짝 놀란다. 이 작품의 감동은 이미 죽은 듯이 보이는 것에서 새로운 생명이 숨 쉬고 있음을 느끼는 데 있다. 작가가 강한 감명을 받은 순간이 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 (p.91)
(같이 읽으면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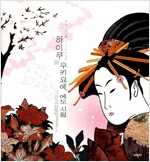
하이쿠와 우키요에, 그리고 에도 시절 - 마쓰오 바쇼, 요사 부손, 고바야시 잇사 (김향 옮김, 다빈치)
.................................................................................................................................................................
30. 붕어 식해여, 히코네의 성 위에, 구름 걸린다
31. 새 대나무여, 사가는 저녁놀이, 되었구나
32. 모기의 소리, 인동꽃 이파리가, 질 때마다
33. 봄의 물줄기
산이 없는 곳에서
흘러가노라
春の山水なき國を流れ
산다운 산도 없는, 눈에 들어오는 것은 모두 널찍하게 펼쳐진 평야뿐인 곳. 그 가운데를 한 줄기, 풍성한 봄의 물줄기가 부드럽게 봄빛을 반사하면서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흘러간다. 이 광경을 보는 지점은 산 위로 보인다. 이 물줄기가 흘러 가는 곳이 바다라는 것도 암시되어 있는 듯한 기분이 듣나. "산이 없는 곳에서"는 바다가 가까운 평야를 생각하게 하며, 마지막의 "흘러가노라"의 여운은 멀리 아득하게 흘러갈 큰 바다의 생태를 잘 반영하고 있다. 종래의 작품과는 완전히 이질적인, 시점이 높고 스케일이 큰 대관 풍경을 다룬 작품은 화가 부손이 발견한 특색 중 하나일 것이다. (p.95)
34. 제정신 아닌, 풀잎을 집은 마음, 나비일레라
...............................................................................
고바야시 잇사 ( 小林一茶, 1763년 ~ 1828년)
1. 여윈 개구리
지지 마라 잇사가
여기에 있다
やせ蛙まけるな⼀茶これにあり
'암개구리에 덤벼들려다 다른 수개구리에 밀려나서 작아진 마른 개구리여 제대로 하라, 잇사가 여기에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 개구리들의 군혼을 다루었다. 옛날에는 한 마리 암개구리를 두고 여러 마리 수개구리로 하여금 다투게 하는 유희를 즐기며 돈내기를 했다고 한다. 물론 지금은 행해지지 않는다. "잇사가 여기에 있다"라는 어구에서는 무사가 전장에서 자기 이름을 외칠 때의 어조가 느껴지는데, 잇사가 군담을 즐겨 들었다는 기록도 있으니 그 영향이 아닐가 한다. 50세를 넘길 때까지 독신으로 살았던 잇사가 개구리들의 싸움에 제법 번쩍이는 시선을 쏟고 있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재미있다. 이 작품에서는 약자에 대한 동정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잇사의 인간적인 냄새를 느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p.99)
2. 돈도야키여, 불꽃 위에 자꾸만, 눈이 내렸네
3. 보릿가을아, 아이를 업은 채로, 정어리 피네
4. 눈 흩날리네, 농담도 하지 않는, 시나노 하늘
5. 고아인 나는, 빛도 내지 못하는, 반딧불인가
6. 지는 참억새, 싸늘해지는 것이, 눈에 보이네
7. 귀뚜라미야, 오줌 누는 소리도, 가늘어진 밤
8. 무를 봅아서, 무로 내가 갈 길을, 가르쳐 주었네
9. 파란 하늘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는, 가을의 저녁
10. 맑은 아침에, 탁탁 소리를 내는, 숯의 기분아
11. 달아나는구나, 좀의 무리 중에도, 부모자식이
12. 죽은 엄마여, 바다를 볼 때마다, 볼 때마다
13. 아름다워라
종다리가 울음 울던
하늘의 흔적
うつくしきや雲雀の鳴きし迹の空
한바탕 울던 종다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언뜻 하늘을 올려다보니 하늘이 아름답다. 지상에는 파란 보리밭 융단이 깔려 있다. 하늘에는 하얀 레이스를 단 듯한 구름이 있다. "종다리가 울음 울던 하늘의 흔적"을 보며 "아름다워라"하고 영탄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말을 떠올리다가 "아름다워라"라는 말이 떠올랐을지도 모른다. "아름다워라"라는 말이 갖는 내용을 무한정으로 한 채, 그 아래 말들에 이어져야 할 미적 향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미 독자적인 관조를 살렸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독자적인 관조는 정지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종다리가 울음 울던 하늘의 흔적"이 극히 개성적인 대상 파악이기 때문에 "아름다워라"는 그 활성을 부여받았으며 공허한 울림이 되지 않았다. (p.112)
(같이 읽으면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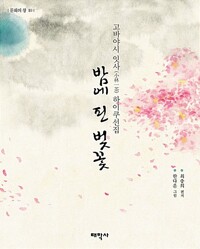
밤에 핀 벚꽃 - 고바야시 잇사 (최충희 옮김, 태학사)
..................................................................................
14. 저녁의 벚꽃, 오늘도 또 옛날이, 되어버렸네
15. 눈이 녹고서, 동글동글하여라, 둥근 달이여
16. 해 질 녘이여, 반딧물이에 젖는, 얇은 다다미
17. 후루도네여, 오리가 우는 밤의, 쓸쓸한 술맛
18. 산이 불타네, 눈썹에는 주르르, 밤비 내린다
19. 연꽃 있으나, 이를 비틀어서, 버릴 뿐이네
20. 조용함이여, 호수의 밑바닥에, 구름 봉우리
21. 저녁 벚꽃아, 집이 있는 사람은, 이내 돌아간다
22. 여름의 산에, 기름기가 도는, 밝은 달이여
23. 맑게 갠 하늘, 한낮에 혼자서, 걸어가노라
24. 덧없는 세상은, 덧없는 세상이건만, 그렇지만은
25. 저녁 후지 산에, 엉덩이 나란히 하고, 우는 개구리
26. 불 깜빡깜빡, 천연두 격리 병사, 눈보라여라
27. 소나무 솟고, 물고기 놀고 봄을, 아쉬워하네
28. 도랑이 있고, 얼음 위를 달리는, 쌀뜨물이네29. 번개로구나,, 무심코 있기만 한, 나의 얼굴로
29. 때리지 말라
파리가 손 비비고
발을 비빈다
やれ打つなが手を摺り足をする
손 비비고 발 비비는 파리의 행위를 "때리지 말라"는 애원의 태도로 재치 있게 읽어낸 작품이다. 의인화 수법이 이 구의 매력이다. 작고 보잘것없는 동물을 작품 세계에 무수히 등장 시킨 잇사는 과연 후세의 사람들로부터 비소한 동물을 가장 많이 노래한 시인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p.129)
30. 오늘이라는 날도, 장구벌레의 행동, 내일도 또한
31. 봄비 내리고, 잡아먹히려고 남은, 오리가 운다
32. 논의 기러기야, 마을 사람 몇 명은, 오늘도 간다
33. 새벽달이여, 아사마의 안개가, 밥상을 긴다
34. 뱅어 떼들이, 우르르 태어난다. 으스름달밤
................................................................................
마사오카 시키 (正岡 子規, 1867년 ~ 1902년)
1. 유채꽃이네, 확 번져가는 밝은, 변두리 동네
2. 말의 꼬리여, 잽싸게 몸을 돌려, 피하는 제비
3. 번개로구나, 노송나무만 있는, 골짜기 하나
4. 감을 먹으면, 종이 울리는구나, 호오류우지
5. 가는 가을에
종 치는 요금을
받으러 오네
行く秋の鍾つき料を取りに來る
1896년 작이다. 시키는 이 글을 짓기 전 해부터 요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 해에 들어와서부터는 보행이 자유롭지 못하고 병상에 눕는 일이 많은 나날이 계속되었다. 추측건대 시키는 누군가에게 '종 치는 요금'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모양이다. 시키가 있었던 시키암 근처의 절에서도 종 치는 명목으로 얼마간의 돈을 징수하고 있었을 것이다. 큰 금액이 아니어서 지불했지만, 시키는 무척이나 약삭빠른 에도 사람다운 얘기라고 재미있게 생각했을 수 있다. 늦가을의 공기는 맑았고, 그날의 종소리는 더 맑게 울려 퍼졌는지도 모른다. (p.141)
(같이 읽으면 좋은 책)

병상 육척 - 마사오카 시키 (유은경, 이원희 옮김, 인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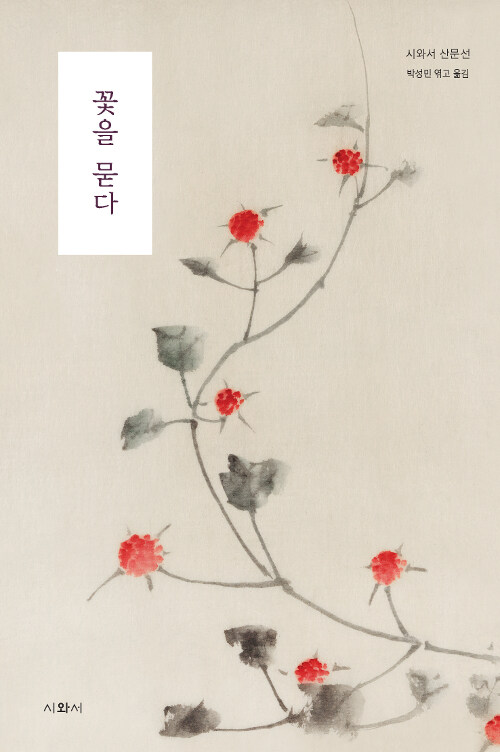
꽃을 묻다 (박성민 옮김, 시와서)
........................................................
6. 몇 번씩이나, 쌓인 눈의 높이를, 물어보았네
7. 삼천 수 되는, 하이쿠 조사하고, 감 두개로세
8. 어느 스님ㅁ이, 달도 안 기다리고, 돌아갔노라
9. 맨드라미가, 열네다섯 송이는, 있을 터이다
10. 살아 있는 눈을, 쪼러 오는 것일까, 파리의 소리
11. 빨간 사과와, 파란 사과가 탁자, 위에 놓였네
12. 인력거 타고, 숲으로 기어간다, 매미 떼 울고
13. 끊임없이 사람, 쉬었다 가는 여름, 들판의 돌 하나
14. 장작을 패는, 여동생 한 사람의, 겨울나기여
15. 귤을 깐다, 손톱 끝이 노란색, 겨울나기여
16. 여윈 말을, 요란스레 꾸몄네, 새해 첫 짐에
17. 문을 나서서
열 걸음만 걸어도
넓은 가을바다
門を出て十步に秋の海廣し
여행을 계속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늘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로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발걸음 닿는 곳마다 새로운 경관이 펼쳐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시인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이다. 시키에게서도 그러한 면모가 느껴진다. 문을 나선다. 열 걸음도 안 되어 뜻밖에도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진다. '이런 바다가 근처에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하는 의아함과 놀라움이 공존한다. 시계를 넓겨가는 사생의 흔적이 보이는 듯하다. (p.153)
(같이 읽으면 좋은 책)

마사오카 시키 수필집 - 마사오카 시키 (손순옥 옮김, 지만지)
18. 수세미 피고, 가래가 막아버려, 죽은 자인가
19. 가래가 한 되, 수세미 꽃의 즙도, 소용이 없네
20. 그저께 받을, 수세미 꽃의 즙도, 받지 못하고
....................................................................................
가와히가시 헤키고토 (河東碧梧桐.1873∼1937)
1. 빨간 동백이, 하얀 동백과 함께, 떨어졌구나
2. 봄날은 춥고, 수전위에 비치는, 조각구름아
3. 낙엽송은, 쓸쓸한 나무로다, 고추잠자리
4. 하늘을 집은, 게가 죽어 있구나, 뭉게구름아
5. 높은 산에서, 내려와서 낮에는, 초밥을 먹고
6. 젊을 때의 벗, 생각하면 은행잎, 떨어지누나
7. 생각지 않은
병아리 태어났네
겨울의 장미
思わずもヒヨコ生れぬ冬薔薇
이 작품은 헤키고토의 대표작 중 하나다. 겨울의 장미와 병아리의 조합은 의외의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밝고 자연스럽다. 오랫동안 암탉이 품고 있었던 알을 바라보며 '이제 안 되겠구나'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겨울이 한창일 때 병아리가 태어난 것을 두고 겨울의 장미로 표현한 데서 신선미가 느껴진다. 한번 읽으면 좀처럼 잊히지 않는구다. 색책도 인상적이고, 겨울 장미의 배후에 펼쳐진 겨울 하늘도 상상이 된다. 그런 분위기는 막 태어난 병아리를 축복하는 듯하다. (p.165)
...................................................................................................................................................................................................................................

봄에는 와카를 가을에는 하이쿠를 기억하라 (한국일어일문학회, 글로세움)

마츠오 바쇼오의 하이쿠 - 마츠오 바쇼우 (유옥희 옮김, 민음사)
.................................................................................................................................
'II. 고전 문학 (동양) > 2. 동양 - 고전 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루미 시초 – 마울라나 잘랄 앗 딘 알 루미 (이현주 역, 늘봄) (1) | 2023.02.03 |
|---|---|
| 중국명시감상 - 이석호.이원규 공저 (위즈온 (2) | 2023.02.02 |
| 어부사 - 굴원: 고문진보(후집) - 황견 엮음 (이장우.우재호.박세욱 옮김, 을유문화사) (1) | 2023.02.02 |
| 루바이야트 - 오마르 하이얌, 에드워드 피츠제럴드(영역), 에드먼드 조지프 설리번 (그림) (윤준 옮김, 지만지) (0) | 2023.02.02 |
| 백거이 시선 (김경동 편저, 문이재) (0) | 2023.02.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