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자 - 논어
제1장 학이
1.1 공자가 이르시기를; 도(태평성대를 이끈 옛 성인들의 통치이념)를 배우고 항상 변치 않는 태도로 부단히 노력하여, 그 성인들의 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기쁘지 않겠는가? 그렇게 배운 성인들의 도들 부단히 실천하여 나라를 다스리면, 자연스레 주변의 백성이 그 나라가 살기 좋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와서 지도자를 따를 터이니,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군자(도를 배우고 부단히 노력하여 실천하는 올바른 지도자)는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삼가여 부단히 도를 닦는 것이니, 설령 자신이 이처럼 부단히 노력하여 통치를 잘하고 있음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거나 속상해하지 않으면, 이것이야말로 참된 지도자가 아니겠는가?
子曰(자왈) 學而時習之(학이시습지)면 不亦說乎(불역열호)아 有朋(유붕)이 自遠方來(자원방래)면 不亦樂乎(불역낙호)아 人不知而不 (인부지이불온)이면 不亦君子乎(불역군자호)아.
<해설>
공자의 교육목표는 궁극적으로 도를 배우고 부단히 노력하여 실천하는 올바른 지도자인 군자를 양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임금을 보필하고 나아가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리게 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공자에게 있어서 배움의 대상은 다름 아닌 태평성대를 이끈 옛 성인들의 통치이념인 도이다.
도는 오늘날의 법도의 줄임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의미는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즉 "지도자가 나라와 백성을 다스림에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리'가 된다. 그런데 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다름 아닌 변치 않고 초지일관하는 태도이다. 따라서 본문의 "습"은 오늘날의 "배우다, 연습하다"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새가 날갯짓을 하여 스스로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부단히 연습하고 노력한다."라는 본래의 의미가 있는 것이니, 결국 이 말은 초지일관하는 마음으로 부단히 노력하여 도를 배우는 상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옛날의 가르침은, 집에는 글방이 있고, 향리에는 향학이 있으며, 취락에는 학당이 있고, 나라에는 국학이 있었다. 매년 입학하고, 매년 중반에 시험을 치렀다. 1년 차에는, 경을 나누고 뜻을 밝히는 것을 본다. 3년 차에는, 학업을 공경하고 벗들과 즐기는지를 본다. 5년 차에는, 널리 익히고 스승을 가까이하는 지 본다. 7년 차에는, 배움을 논하고 벗을 골라 뽑는 것을 보니; 이를 일컬어서 소성이라고 한다. 9년 차에는, 대부분을 깨달아서 통달하고, 굳건히 세워서 어긋나지 않으니; 이를 일컬어서 대성이라고 한다. 무릇 그러한 후에는, 백성을 교화시키고 풍속을 바꿀 수 있으니, 가까운 이들이 기꺼이 복종하고, 먼 이들이 따르게 된다. 이것이 큰 배움의 길이다. (예기, 학기)
군자는 중용에 의지하여, 세상을 피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으니, 오로지 성인이라야 그렇게 할 수 있다. (예기, 중용)
중이라는 것은, 편벽되지 않고 치우치지 않으며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함이 없는 것의 이름이요, 용은 늘 그러함이다. (예기, 중용,서)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 하며, 도를 닦는 것을 교라고 한다. 도라는 것은,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니, 떠날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이 때문에 군자는, 보이지 않는 바를 조심하고 삼가며, 들리지 않는 바를 두려워한다. 숨기는 것보다 더 드러나는 것이 없고, 미세한 것보다 더 잘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 따라서 군자는 그 홀로 있음을 삼가는 것이다. (예기, 중용)
(같이 읽으면 좋은 책)

중용,대학 강의 - 김충렬 (예문학사)
...................................................................................................................
1.2 유약이 말하기를; 그 사람됨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윗사람을 공경하는데도, 자신의 상관이나 지도자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드물다. 자신의 상관이나 지도자의 뜻에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상관이나 지도자를 배신하여 반란을 도모하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군자는 근본이 되는 효도와 공경에 힘쓰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부모에게 효도하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모습을 백성에게 보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백성 역시 자기를 따르게 하여 도(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옛 성현들의 통치이념)를 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어질음(사회에 나아가 자신의 군주를 진심으로 섬기고 따르는 것)의 기초이자 출발점인 것이다.
有子曰(유자왈) 其爲人也孝弟(기위인야효제)요 而好犯上者鮮矣(이호범상자선의)니 不好犯上(불호범상)이요 而好作亂者未之有也(이호작난자미지유야)니라.
1.3 공자가 이르시기를; 사회에 나아가 자신의 군주를 진심으로 섬기고 따르는 데 있어, 그를 기만하거나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말과 진솔한 얼굴빛으로 대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이는 어질음이 아니다.
子曰(자왈) 巧言令色(교언영색)이 鮮矣仁(선의인)이니라.
<해설>
이윤이 말하기를 "임금이 교묘한 말 때문에 옛 정치를 어지럽히지 않고, 신하가 총애와 이익 때문에 성공에 머무르지 않으면, 나라가 오래도록 아름답게 밫날 것입니다. (상서, 태갑,하)
익이 말했다. "아! 경계하소서! 근심이 없을 때 경계하고, 법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편안히 놀지 말고, 즐거움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략) 도를 어김으로써 귀족들의 찬양을 일으키지 말고, 귀족들을 어김으로써 자기의 욕망에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게으리지 않고 허황되지 않으면, 사방의 오랑캐들이 임금에게 올 것입니다. (상서, 대우모)
(같이 읽으면 좋은 책)

상서 깊이 읽기 - 위중 (이은호 옮김, 글항아리)

서경 강설 - 이기동 (성균관대출판부)
................................................................................
1.4 증자가 말하기를; 나는 매일 삼가여 나 자신에게 잘못이 없는지를 살피는데, 세 가지를 염두에 둔다. 첫 번째는 다른 이를 위해서 일을 도모할 때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는 태도를 보였는가. 두 번째는 친구와 교류함에 있어 믿음을 주는 성실함을 보였는가. 세 번째는 전해 내려오는 옛 성현들의 도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변치 않고 부단히 노력하는 초지일관된 태도를 보였는가를 살핀다.
曾子曰(증자왈) 吾日三省吾身(오일삼성오신)하노니 爲人謀而不忠乎(위인모이불충호)아 與朋友交而不信乎(여붕우교이불신호)아 傳不習乎(전불습호)아니라.
1.5 공자가 이르시기를; 제후의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는 겸손함과 신중함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나아가 검소한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백성에게 믿음을 주어야 한다. 또 사게절에 맞춰서 백성을 부림으로써, 그들의 원성을 사서는 안 된다.
子曰(자왈) 道千乘之國(도천승지국)호되 敬事而信(경사이신)하며 節用而愛人(절용이애인)하며 使民以時(사민이시)니라.
(같이 읽으면 좋은 책)

사기 본기 - 사마천 (신동준 옮김, 위즈덤하우스)
..............................................................................
1.6 공자가 이르시기를; 젊은이는 집에 있으면, 곧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으로 나가서는 곧 윗사람을 공경해야 한다. 또한 삼가여 변함없이 성실함을 보이고, 벼슬에 나아가서는 널리 백성을 사랑하되 자신의 군주를 진심으로 섬기고 따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행하고도 남는 힘이 있으면, 곧 한 걸음 더 나아가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옛 성현들이 실천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된 문장들을 배워야 할 것이다.
子曰(자왈) 弟子入則孝(제자입즉효)하고 出則弟(출즉제)하며 謹而信(근이신)하고 汎愛衆(범애중)하며 而親仁(이친인)하라. 行有餘力(행유여력)이어든 則而學文(즉이학문)이니라.
<해설>
효도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근본임을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공자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즉 작은 개인과 집안에서 큰 나라와 온 세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효도를 점차 사회로 확장시킨 것이 윗사람을 공경함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섬기는 상관이나 군주에 순종하는 어질음이 되는 것이다.
(같이 읽으면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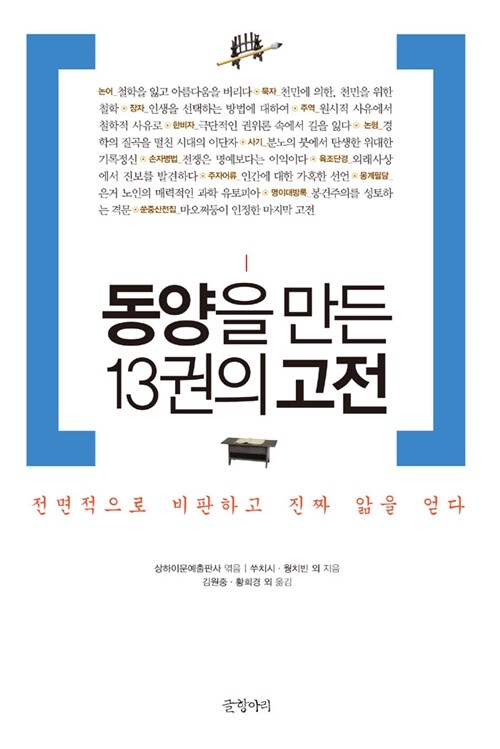
동양을 만든 13권의 고전 - 쑤치시,웡치빈 (황희경,김원중 옮김, 글항아리)
........................................................................................................................
1.7 자하가 말하기를; 얼굴빛을 공손하고도 정중하게 하여서 현명한 이 즉 예로 이성과 감성을 조율하여 객관적 태도인 중과 모두를 아우르는 조화로운 태도인 화를 실천하는 이를 존경하고, 정성을 다해서 보모를 섬기며, 임금을 섬김에 몸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고, 또한 친구와 교류함에 있어서 자기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성실함을 실천할 수 잇으면, 비록 그 사람이 옛 성인군자들의 통치이념인 도를 배우지 못했다고 말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런 사람은 도를 배웠다고 평가할 것이다.
子夏曰(자하왈) 賢賢易色(현현역색)하며 事父母(사부모)에 能竭其力(능갈기력)하며 事君(사군)에 能致其身(능치기신)하며
與朋友交(여붕우교)에 言而有信(언이유신)이면 雖曰未學(수왈미학)이라도 吾必謂之學矣(오필위지학의)니라.
<해설>
얼굴빛을 바꾸어 현명한 이를 공손하고도 정중히 대하고, 정성을 다해서 부모를 섬기며, 있는 힘을 다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말하면 믿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태평성대를 이끈 "엣 성현들 즉 성인과 군자의 도"이고,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옛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성현들의 통치이념"이 된다. 따라서 자하는 이러한 도리를 배우지 않고도 실천하는 이는 배웠노라고 평한다고 한 것이다.
(같이 읽으면 좋은 책)

최후의 승자가 되라 - 신동준 (미다스북스)
......................................................................
1.8 공자가 이르시기를; 군자라고 할지라도 신중하지 못하여 경거망동하면, 높고 엄숙함을 잃어 신임을 잃게 되고, 도를 배워도 결국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실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정성스러움과 성실함을 기본으로 하여 실천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배울 것이 없으므로 가까이하지 말며, 잘못을 저지르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뉘우쳐서 고쳐야 한다.
子曰(자왈) 君子不重則不威(군자불중즉불위)니 學則不固(학즉불고)니 主忠信(주충신)하며 無友不如己者(무우불여기자)하고 過則勿憚改(과즉물탄개)니라.
<해설>
임금께서는 음악과 여색을 가까이하지 않고, 재물과 이익을 불리지 않았으며, 덕이 많으면 관직을 높이고, 공이 많으면 상을 후하게 하였으며, 사람을 등용하되 자기처럼 대우하고, 허물 고치기를 인색하게 하지 않아, 능히 너그럽고 능히 인자하여, 백성에게 믿음을 보이셨습니다. (상서, 중훼지고)
1.9 증자가 말하기를; 지도자가 부모의 상을 당했을 때 에절을 중시하여 애도하고, 멀리는 조상의 덕을 추모하여 공양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백성이 이에 지도자의 솔선수범함을 보고 따르게 되어 자연스럽게 후덕해진다.
曾子曰(증자왈) 愼終追遠(신종추원)이면 民德歸厚矣(민덕귀후의)리라.
1.10 자금이 자공에게 묻기를; 스승께서는 그 나라에 이르시면, 반드시 그 나라의 다스림에 대해서 듣게 되십니다. 이는 직접 물어서 들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묻지 않으셨는데도 그 나라에서 일러준 것입니까? 자공이 대답하기를; 일반적으로 말해서, 어떠한 소식이나 정보를 알게 된다는 것은 본인이 가서 묻거나 혹은 누군가 알려주는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오. 하지만 스승께서는 온화하고도 순량한 성품 공손함과 검소함 그리고 겸손함으로 그것을 얻으셨으니, 이는 옛 성인들이 도를 파악하여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고 나아가 예측하는 것과 같은 도리인 것이오. 그러므로 스승께서 아시는 것은 다른 이들이 알게 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소.
子禽問於子貢曰(자금문어자공왈) 夫子至於是邦也(부자지어시방야)에 必問其政(필문기정)하시나니 求之與(구지여)아 抑與之與(억여지여)아.
子貢曰(자공왈) 夫子(부자)는 溫良恭儉讓以得之(온량공감양이득지)시니 夫子之求之也(부자지구지야)는 其諸異乎人之求之與(기제이호인지구지여)인저.
(같이 읽으면 좋은 책)

공자 평전 - 천우이핑 (신창호 옮김, 미다스북스)
.............................................................................
1.11 공자가 이르시기를;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그의 뜻을 이어받으려고 애쓰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의 행적을 이어받으려 애쓰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3년 동안 상복을 입는 동안, 그의 뜻과 행적에 설령 허물이 있더라도 고치지 않고 계승하여 따른다면, 이것이야말로 참된 효도이다. 나아가 이런 사람은 어질음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子曰(자왈) 父在(부재)에 觀其志(관기지)요 父沒(부몰)에 觀其行(관기행)이니 三年(삼년)을 無改於父之道(무개어부지도)라야 可謂孝矣(가위효의)니라.
<해설>
공자가 이르시기를; 군자는 그 보모의 허물을 느슨히 하고 그 좋은 일을 공경한다. (예기, 방기)
아버지를 여의면 3년이고, 군주를 여의면 3년은, 백성에게 의심하지 않음을 보이는 것이다. 부모가 살아계시면 감히 그 몸을 독차지하지 않고, 감히 그 재물을 사사로이 하지 못하는 것은, 백성에게 위와 아래가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예기, 방기)
<통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그 아들의 뜻을 관찰하는 것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그 아들의 행동을 보는 것이니 삼년동안 아버지의 도를 고치지 말아야 효라 이를 수 있다.
1.12 유약이 말하기를; 예를 행한다는 것은 희로애락의 조화로움을 중시하는 것이다. 상고시대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선왕들의 도 즉, 통치이념은 바로 이 조화를 좋은 것으로 여겼으니,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조화로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지만 희로애락의 감정이 세상에 드러나는 조화로움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절도에 맞게 조절하여 표현하는 것이니, 바로 예로서 감정이 모자라거나 지나치지 않도록 절제해야 한다.
有子曰(유자왈) 禮之用(예지용)이 和爲貴(화위귀)하니 先王之道(선왕지도)는 斯爲美(사위미)라. 小大由之(소대유지)니라. 有所不行(유소불행)하니 知和而和(지화이화)요 不以禮節之(불이절지)면 亦不可行也(역불가행야)니라.
<해설>
희로애악이 드러나지 않은 것, 그것을 중이라고 일컫고, 드러나지만 모두 절도에 맞은 것, 그것을 화라고 한다. 중이라는 것은, 세상의 큰 근본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도에 닿은 것이다. 중과 화에 이르면 천지가 자리를 잡고, 만물이 자란다. (예기, 중용)
喜怒哀樂之未發(희로애락지미발)을 謂之中(위지중)이요, 發而皆中節(발이개중절)을 謂之和(위지화)이니, 中也者(중야자)는 天下之大本也(천하지대본야)요, 和也者(화야자)는 天下之達道也(천하지달도야)니라.
1.13 유약이 말하기를; 의로움(상하의 서열을 명확하게 바로잡는 것이 옳다고 여기고, 이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자세)을 바탕으로 실천하면, 말한 대로 이행하는 성실함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또한 예(조회로움을 위한 절제)를 바탕으로 행하면, 지나치게 아부한다거나 혹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지 않게 되어서 윗사람에게 공손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의로움과 예를 항상 지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지도자로 섬기게 되는 것이다.
<해설>
모가 나지만 성처를 입히지 않는 것이, 의로움이다. (예기, 빙의)
따라서 나라에 환난이 있음에 임금이 사직에 목숨을 거는 것, 그것을 일컬어 의라고 한다. 대부가 종묘에 목숨을 거는 것, 그것을 일컬어 변이라고 한다. (예기, 예운)
무엇이 의라고 일컫는가? 아버지는 자애롭고, 아들은 효도하며, 형은 착하고, 아우는 공경하며, 남편은 합당한 행동을 하고, 아내는 순종하며, 어른은 은혜를 베풀고, 어린이는 따르며, 임금은 진심으로 섬겨서 따르고, 신하는 충후해야 하니, 이 열 가지를 사람의 의라고 일컫는다. (예기, 예운)
대부가 강하면 임금이 그를 죽이는 것이, 의로움이다. (예기, 교특생)
이익을 보고도 사양하는 것이, 의로움이다. (예기, 악기)
의로움에 이르면, 곧 상하가 패역해지지 않는다. 사양함에 이름으로써, 다툼을 없애는 것이다. (예기, 제의)
<시경>[패충, 곡풍]에서 "배추를 따고 순무를 따는데, 아랫부분은 하지 마라. 도리에 맞는 말은 어겨서는 안 되니, 그대와 함께 더불어 죽으리."라고 했다. 이로써 백성을 막았지만, 백성은 오히려 의로움을 잊고 이익을 다툼으로써 그 자신을 잃었따. (예기, 방기)
어질음이라는 것은, 의로움의 근본이며 순응함의 격식이다. (예기, 예운)
어질음을 두터이 하는 이는, 의로움에 박하므로, 백성이 가까이하지만 공경하지는 않는다. 의로움을 두터이 하는 이는, 어질음에 박하므로, 백성이 공경하지만 가까이하지는 않는다. (예기, 표기)
인은 부드러움이기 때문에 백성이 가까이하지만 공경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의는 엄격하고 강함이기 때문에 백성이 공경하지만 가까이하지는 않는 것이다. 따라서 공자는 이를 통해서 부드러움과 엄격함의 조화로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니, 부드러움의 어질음이 엄격함의 의로움의 군본이 되고, 나아가 윗사람에 순응하는 틀이 되지만 부드러움의 어질음과 엄격함의 의로움은 어디까지나 따로 존재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함께 해야만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인, 의로만으로는 부족하다.
도와 덕 그리고 어질음과 의로움은, 예가 아니면 완성시킬 수 없다. (예기, 곡례상)
따라서 군자가 어질음과 의로움의 도를 살피는 데는, 예가 그 근본인 것이다. (예기, 예기)
공자는 어질음과 의로움이라는 것은 예로서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는 않은 절제와 통제를 해야 만이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공자에게 있어서 인의란 도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되지만, 예는 이들을 수식하는 형식인 것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서 공자가 말하는 예는 사람 간의 예의나 예절을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치와 직결된 국가 예악제도에 있어서의 예 즉, 오늘날의 의전이나 의식 혹은 전례까지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공자는 내용과 형식을 모두 중시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사견>
공자에게 있어 도라는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정치 이념이면서 개인의 수양 목표이다.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가 필요하며 예는 인의로써 실천된다. 오늘날은 법과 도덕이 모두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틀이지만 공자가 생각하는 국가 질서는 오로지 예로써만 유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즉 공자는 어지러운 춘추시대를 통일된 주나라로의 에법에 따르는 것이 전란을 막는 방법으로 본것이다.
이에 반해 전국시대 말기의 한비는 법으로써 강력하게 통제함으로써 통일된 왕조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것이다.
1.4 공자가 이르시기를; 군자는 배부르게 먹거나 편안하게 거처하기에 힘쓰지 않고, 벼슬에 나아가서는 온 힘을 쏟아 나랏일에 힘쓰면서 말과 명령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옛 성현들이 실천한 법도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통치에 임한다면, 진정 도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子曰(자왈) 君子食無求飽(군자식무구포)하며 居無求安(거무구안)하며 敏於事而愼於言(민어사이신어언)이요 就有道而正焉(취유도이정언)이면 可謂好學也已(가위호학야이)니라.
1.15 자공이 말하기를; 스승께서는 '소인은 가난하면 이에 오그라들고, 부유하면 이에 교만해진다. 오그라들면 이에 도둑질하고, 교만하면 이에 무도해진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하지만 아첨함이 없고, 부유하지만 교만함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공자가 이르시기를; 괜찮다. 하지만 안회처럼 가난해도 도를 배우는 것을 즐기는 안빈낙도를 실천하고, 부유하지만 예로 자신의 생활을 절제하기를 좋아하는 이만 못하다.
자공이 말하기를; <시경>에 이르기를 '옥돌로 끊고 줄을 쓰는 듯, 끌로 쪼고 가는 듯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경>의 구절이 스승께서 말씀하시는 삼가여 부단히 노력하고 실천함을 일컫는 것입니까?
공자가 이르시기를; 자공아, 비로소 함께 <시경>을 말할 수 있겠구나. 온고지신이라고 했거늘, 옛 지식을 알려주었더니, 너는 그 지식을 연상으로 새로운 것으로 응용할 줄 아는구나.
<참고>
詩經(시경) 衛風(위풍) 제1편 淇奧三章(기옥 3장)
瞻彼淇奧(첨피기욱)혼대 綠竹猗猗(녹죽의의)로다 有匪君子(유비군자)여 如切如磋(여절여차)하며 如琢如磨(여탁여마)로다 瑟兮僴兮(슬혜한혜)며 赫兮喧兮(혁혜훤혜)니 有匪君子(유비군자)여 終不可諼兮(종불가훤혜)로다.
저 기수의 물굽이를 바라보건대, 푸른 대가 야들야들하도다. 아름다운 광채가 나는 군자여, 끊어놓은 듯 닦아놓은 듯하며 쪼아놓은 듯 갈아놓은 듯하도다. 엄밀하고 굳세며 빛나고 나타나니, 아름다운 광채가 나는 군자여, 마침내 가히 잊지 못하리로다.
瞻彼淇奧(첨피기욱)혼대 綠竹靑靑(녹죽청청)이로다 有匪君子(유비군자)여 充耳琇瑩(충이수영)이며 會弁如星(회변여성)이로다 瑟兮僴兮(슬혜한혜)며 赫兮喧兮(혁혜훤혜)니 有匪君子(유비군자)여 終不可諼兮(종불가훤혜)로다.
저 기수의 물굽이를 바라보건대 푸른 대가 푸르고 푸르도다. 아름다운 광채가 나는 군자여, 귀막이가 옥돌이며 고깔에 붙인 것이 별 같도다. 엄밀하고 굳세며 빛나고 나타나니, 아름다운 광채가 나는 군자여, 마침내 가히 잊지 못하리로다.
瞻彼淇奧(첨피기욱)혼대 綠竹如簀(녹죽여책)이로다 有匪君子(유비군자)여 如金如錫(여금여석)이며 如圭如璧(여규여벽)이로다 寬兮綽兮(관혜작혜)하니 猗重較兮(의중각혜)로다 善戱謔兮(선희학혜)하니 不爲虐兮(불위학혜)로다.
저 기수의 물굽이를 바라보건대 푸른 대가 빽빽하도다. 아름다운 광채가 나는 군자여, 쇠 같기도 하고 쇠줄 같기도 하며 홀 같기도 하며 구슬 같기도 하도다. 너그러우며 넉넉하니 아아 중각이로다. 희롱도 잘하고 농담도 잘하니 포학한 짓은 아니하도다.
<大學(대학) 전 3장 (傳三章)>
詩云: "邦畿千里, 惟民所止."
시에 말하길 "나라의 기내 땅 천리여, 백성들이 머물러 사는 곳이구나"라고 하였다.
詩云: "緡蠻黃鳥, 止于丘隅." 子曰: "於止, 知其所止, 可以人而不如鳥乎?"
시에 말하길 "꾀꼴하는 꾀꼬리는 언덕 구석에 머무르네."라고 하였는데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머무름에 있어 (새도) 자지가 머무를 곳을 아는 것이니 사람이 새만 같지 못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다.
詩云: "穆穆文王, 於緝熙敬止." 爲人君, 止於仁; 爲人臣, 止於敬; 爲人子, 止於孝; 爲人父, 止於慈; 與國人交, 止於信.
시에 말하길 "거룩하신 문왕이여, 아아! 계승하여 밝히고 공경하여 머무르셨다."라고 하니 군주가 되어서는 인(仁)에 머무르고, 신하가 되어서는 공경에 머무르고, 자식이 되어서는 효도에 머무르고, 부모가 되어서는 자애에 머무르고, 나라 사람들과 함께 교류할 때는 믿음에 머무르셨다.
詩云(시운), 瞻彼淇奧(첨피기욱)혼대 綠竹猗猗(녹죽의의)로다 有匪君子(유비군자)여 如切如磋(여절여차)하며 如琢如磨(여탁여마)로다 瑟兮僴兮(슬혜한혜)며 赫兮喧兮(혁혜훤혜)니 有匪君子(유비군자)여 終不可諼兮(종불가훤혜)로다. 如切如磋者(여절여차자)는, 道學也(도학야)요, 如琢如磨者(여탁여마자)는, 自脩也(자수야)요, 瑟兮僩兮者(슬혜한혜자)는, 恂慄也(준률야)요, 赫兮喧兮者(혁혜훤혜자)는, 威儀也(위의야)요, 有斐君子(유비군자), 終不可諠兮者(종불가훤혜자)는, 道盛德至善(도성도지선)을, 民之不能忘也(민지불능망야)니라.
시에 말하기를 '저 기수의 물굽이를 바라보니, 푸른 대나무가 아름답고 무성하구나. 문채(文彩) 있는 군자여! 자른 듯하고 간 듯하며, 쪼아 놓은 듯하고 간 듯하구나! 엄밀하고 굳세며, 빛나고 드러나니, 문채 있는 군자여! 끝내 잊을 수 없도다!”라고 하였으니, ‘자른 듯하고 간 듯하다.’ 한 것은 〈군자의〉 배움을 〈비유하여〉 말한 것이고, ‘쪼아 놓은 듯하고 간 듯하다.’ 한 것은 〈군자가〉 스스로 닦음을 〈비유하여 말한〉 것이고, ‘엄밀하고 굳세다.’ 한 것은 〈군자가 스스로 실수할까〉 두려워함을 〈말한〉 것이고, ‘빛나고 드러난다.’ 한 것은 〈군자의〉 경외하여 본받을 만함을 〈말한〉 것이고, ‘문채 있는 군자를 끝내 잊을 수 없구나!’ 한 것은 〈그 군자의〉 성대한 덕과 지극한 선을 백성들이 잊을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詩云: "於戲前王不忘." 君子賢其賢而親其親, 小人樂其樂而利其利, 此以沒世不忘也.
시경에 말하길 "아아! 이전의 왕을 잊지 못한다"라고 하였으니 군자는 그 훌륭함을 훌륭히 여기고 그 친함을 친하게 여기며 소인은 그 즐겁게 해줌을 즐거워하고 그 이롭게 해줌을 이로워하니 이 때문에 세상을 떠나도 잊지 못한다.
1.16 공자가 이르시기를; 참된 지도자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힘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허물을 고치는 데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며, 자신을 도와서 그 뜻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찾아내는 데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子曰(자왈) 不患人之不己知(불환인지불기지)요 患其不能也(환기불능야)니라.
..................................
제2장 위정
2.1 공자가 이르시기를; 지도자가 덕(성인들이 행한 강함과 부드러움의 통치법을 조화롭게 실천하려는 절개와 지조)으로 다스리면, 마치 북극성 주변에 수많은 별이 위치하듯이 주변의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 그를 지지하고 따르게 된다.
子曰(자왈) 爲政以德(위정이덕)이 譬如北辰(비여북신)이 居其所(거기소)어든 而衆星(이중성)이 共之(공지)니라.
<해설>
고요가 말했다. 아! 행함에는 또한 아홉가지 덕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덕이 있으면, 이에 가리고 가려 행했다고 말합니다. 우가 말했다. 어떤 것입니까? 고도가 말했다. 관대하면서도 엄격하고, 온유하면서도 확고히 서며, 정중하면서도 함께 하고, 다스리면서도 공경하며, 길들이면서도 강인하고, 정직하면서도 부드러우며, 질박하면서도 청렴하고, 강직하면서도 정성스러우며, 굳세면서도 의로운 것이니, 항상 그러함을 밝히면, 길합니다. 날마다 세 가지 덕을 널리 펴고, 아침저녁으로 삼가 밝히면 가문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여섯 가지 덕을 엄격하게 떨치고 공경하며, 명확하게 분간하면,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합해 거두어 널리 베풀어서, 아홉 가지 덕을 모두 섬기면, 뛰어난 인재가 관직에 있게 되어, 모든 관료가 기준으로 삼고 따를 것입니다. 모든 관료가 때에 맞춰, 오행을 따르면, 모든 공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상서, 고요모)
따라서 덕이란 성인들이 행한 강함과 부드러움의 통치법을 조화롭게 실천하려는 절조 즉 절개와 지조를 뜻한다.
세 가지 덕이라 함은, 첫 번째는 정직함을 말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강직함으로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유함으로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니, 평화롭고 안락하면 정직함으로 하고, 굳어서 따르지 않으면 강직함으로 다스리며, 화해하여 따르면 유함으로 다스리고, 성정이 가란앉아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강직함으로 다스리며, 식견이 높으면 유함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상서, 주서)
<정리>
구덕 = 평천하
1. 관이율 - 관대하면서도 엄격함
2. 유이립 - 온유하면서도 확고히 섬
3. 원이공 - 정중하면서도 함께 함
4. 치이경 - 다스리면서도 공경함
5. 요이의 - 길들이면서도 강인함
6. 직이온 - 정직하면서도 부드러움
7. 간이렴 - 질박하면서도 청렴함
8. 강이실 - 강직하면서도 정성스러움
9. 강이의 - 굳세면서도 의로움
삼덕 = 제가
2. 유이립
6. 직이온
8. 강이실
육덕 = 치국
1. 관이율
3. 원이공
4. 치이경
5. 요이의
7. 간이렴
9. 강이의
2.2 공자가 이르시기를; <시경> 삼백 편의 의미를 <시경>의 한 구절로 개괄하고자 한다. 그러고는 이르시기를; <시경>의 한 구절인 '지도자의 올바른 통치이념을 그리워함에 사악함이 없다는 것이다'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子曰(자왈) 詩三百(시삼백)이 一言以幣之(일언이폐지)하니 曰(왈) 思無邪(사무사)라.
<해설>
詩經(시경) 魯頌(노송) 駉篇(경편)
駉駉牡馬(경경모마) 살찌고 커다른 숫말
在坰之野(재경지야) 아득한 들판에서 논다
薄言駉者(박언경자) 살찌고 큰 말은
有驈有皇(유율유황) 쌍창워라와 황부루이며
有驪有黃(유려유황) 가라말과 누런 말
以車彭彭(이거팽팽) 힘찬 소리로 수레를 끈다
思無疆(사무강) 끝없이 달리는
思馬斯臧(사마사장) 정말 좋은 말이로다
駉駉牡馬(경경모마) 살찌고 커다란 숫말
在坰之野(재경지야) 아득한 들판에서 논다
薄言駉者(박언경자) 살찌고 큰 말은
有騅有駓(유추유비) 오추마와 공골말이며
有騂有騏(유성유기) 절따말과 청부루
以車伾伾(이거비비) 힘차게 수레를 끈다
思無期(사무기) 한정없이 달리는
思馬斯才(사마사재) 정말 재주 있는 말이로다
駉駉牡馬(경경모마) 살찌고 커다란 수말
在坰之野(재경지야) 아득한 들판에서 논다
薄言駉者(박언경자) 살찌고 큰 말은
有驒有駱(유탄유낙) 돈짝무늬 총이말고 가리온이며
有駵有雒(유류유락) 월다말과 갈기 흰 검정말
以車繹繹(이거역역) 수레 끌고 잘도 잘린다
思無斁(사무두) 싫증 안내고 달리는
思馬斯作(사마사작) 정말 활발한 말이로다
駉駉牡馬(경경모마) 살찌고 커다란 숫말
在坰之野(재경지야) 아득한 들판에서 논다
薄言駉者(박언경자) 살찌고 큰 말은
有駰有騢(유인유하) 은총이와 유부루이며
有驔有魚(유담유어) 정강이 흰 말과 눈언저리 흰 말
以車祛祛(이거거거) 굳세게 수레를 끈다
思無邪(사무사) 사념없이 달리는
思馬斯徂(사마사조) 정말 아름다운 말이로다
늠름하고 튼실한 수컷 말이, 국경 근처의 들에 있네
늠름하고 튼실한 수컷 말들에는, 흰털이 섞인 거무스름한 말, 붉고 흰빛의 털어 섞여 있는 말, 정강이가 흰 말, 두 눈이 흰 말이 있으니, 그럼으로써 수레가 달리는 모습이 씩씩하네.
백금의 통치이념을 그리워함에 사악함이 없으니, 말들은 이렇듯 나아감만을 생각하네.
2.3
...........................................................................................................................................................................................................................
안성재 (安性栽)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인천대학교 공자학원 원장(前)
인천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소장(前)
한국수사학회 교육이사(現)
한국중어중문학회 총무이사(前)
건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문학사
중국 북경(北京)대학교 중국어언문학과 문학석사
중국 북경(北京)대학교 중국어언문학과 문학박사
....................................................

논어 그 오해와 진실 - 안성재 (어문학사)

노자의 다르지만 같은 길 - 안성재 (어문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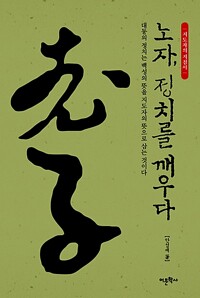
노자 정치를 깨우다 - 안성재 (어문학사)
........................................................................
'IV. 고전 인문 > 1. 동양 - 고전 인문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용 (한길사) (0) | 2023.05.10 |
|---|---|
| 한비자 (신동준 옮김, 인간사랑) (0) | 2023.04.24 |
| 사기 열전 1 - 사마천 (신동준 옮김, 올재클래식) (1) | 2023.03.03 |
| 손자병법 (화산의 온통 손자병법) - 화산 (이인호 옮김, 뿌리와 이파리) (0) | 2023.03.03 |
| 동양을 만든 13권의 고전 - 쑤치시, 웡치빈 (황희경, 김원중 옮김, 글항아리) (1) | 2023.02.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