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마천 - 사기 열전 (기원전 91년)
1. 백이열전
공자는 <논어, 공야장>에서 "백이와 숙제는 과거의 원한을 생각지 않았으니 이로써 세상을 원망하는 일이 드물었다."
공자는 <논어, 술이편>에서 "이들은 인을 구해 얻었는데, 또 무엇을 원망하겠는가?"
子曰 伯夷叔齊不念舊惡 怨是用希
子曰 求仁而得仁 又何怨 飯疏食飮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不義而富 且貴 於我如浮雲
백이와 숙제가 무왕의 말고삐를 잡고 간하기를,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치르지 않은 채 곧바로 전쟁을 일으키려 하니 이를 효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신하 된 자로써 군주를 시해하려 하니 이를 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라고 했다.
채미가(采薇歌)
저 서산에 올라 고사리나 듣어 먹고살지 登彼西山兮 采其薇矣 (등피서산혜 채기미의)
폭력으로 폭력을 바꾸고도 잘못을 모르네 以暴易暴兮 不知其罪矣 (이포역포혜 부지기비의)
신농, 순임금, 우왕 때는 홀연히 지나갔지 神農虞夏忽焉沒兮 (신농우하홀언몰혜)
우린 장차 어디로 돌아가야 좋단 말인가 我安適歸矣 (아안적귀의)
아! 이제 죽음뿐, 우리 운명도 다했구나 吁嗟徂兮 命之衰矣 (우차조혜 명지쇠의)
마침내 이들은 수양산에서 굶어 죽고 말았다. 이로써 보면 백이, 숙제는 과연 세상을 원망한 것인가 원망하지 않은 것인가?
시사비사是邪非邪 - 과연 천도는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노자는 <도덕경> 79장에서
"천도는 사사롭게 가까이하는 바가 없는 천도무친이고, 늘 선인과 함께한다."
天道無親 常與善人 (천도무친 상여선인)
그렇다면 백이와 숙제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백이와 숙제는 인을 쌓고 행실을 깨끗이 했는데도 굶어 죽었다. 또 공자는 70명의 제자 가운데 오직 안연만이 학문을 좋아한다고 칭찬했으나 안연 역시 늘 가난해 술지게미와 쌀겨조차 배불리 먹지 못하고 끝내 요절하고 말았다. 하늘이 선인에게 복을 내려준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러날 수 있는가? 춘추시대 말기 도척은 날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그 간을 회 쳐서 먹었다. 포악무도한 짓을 자행하며 수천 명의 무리를 모아 천하를 횡행했지만 끝내 천수를 다 누리고 죽었다. 이는 도대체 그의 어떤 덕행에 따른 것인가?
근래의 사례를 보면 하는 일이 정도를 벗어나고, 법령이 금하는 일을 일삼는데도 편히 즐기며 그 부귀가 대대로 이어지는 자가 있다. 반면 걸을 때도 땅을 가려서 딛고, 말할 때도 때를 기다려 하고, 길을 갈 때도 옆길로 가지 않고, 일을 할 때도 공정하지 않으면 분발하지 않는데도 재앙을 만나는 자가 부지기수로 많다. 나는 이를 매우 당혹스럽게 생각한다. 만일 이것이 이른바 '천도'라면, 그것은 과연 옿은 것인가, 아니면 그른 것인가?
부기천리附驥千里 - 천리마의 꼬리에 붙어 1000리를 가다
공자는 <논어, 위령공>편에서
"도가 같지 않으면, 함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
子曰 道不同, 不相爲謀 (도부동, 불상위모)
이는 사람이 각자 자신의 뜻에 따라 일을 행한다는 뜻이다. 공자는 <논어, 술이>에서 말했다.
"만약 부를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비록 말채찍을 잡는 마부가 될지라도 나 또한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구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좇을 것이다."
子曰 富而可求也 雖執鞭之士 吾亦爲之 如不可求 從吾所好
(자왈 부이가구야 수집편지사 오역위지 여불가구 종오소호)
또 <논어, 자한>에서 이같이 말하기도 했다.
"추운 계절이 된 연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는 시들지 않고 푸르게 남아 있는 것을 안다."
歲寒然後 知松柏之後彫 (세한연후 지송백지후조)
세상이 혼탁해졌을 때 비로소 청렴한 자가 드러나게 마련이다. 부귀를 두고 어찌하여 세인은 그토록 중시하고, 청렴한 자는 그토록 경시하는 것일까?
공자는 <논어, 위령공>에서 말했다.
"군자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는 것을 혐오한다."
子曰 君子疾沒世而名不稱焉 (자왈 군자질몰세이명불칭언)
한문제때 활약한 가의賈誼는 <붕조부鵬鳥賦>에서 이같이 말했다.
"탐욕스런 자는 재물을 추구하다 목숨을 잃고, 절의를 중시하는 자는 이름을 얻기 위해 목숨을 바친다. 과시하기 좋아하는 자는 권세를 추구하다 목숨을 잃고, 먹고살기 힘든 서민은 그날그날 살기 위해 이익에 매달린다."
貪夫徇財(탐부순재), 烈士徇名(열사순명), 夸子死權(과자사권), 衆庶馮生(중서빙생)
이런 격언이 있다.
"같은 종류의 빛은 서로 비춰 주고, 같은 종류의 사물은 서로 구한다."
또 이런 격언도 있다.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범을 따른다. 성인이 일어나 세상을 밝고 맑게 다스리자 만물도 지니고 있는 지극한 이치를 훤히 드러낸다."
백이와 숙제가 비록 현인이기는 했으나 공자의 칭찬 이후 그 명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안연이 비록 학문에 독실하기는 했으나 천리마의 꼬리에 붙어 1000리를 가는 것처럼 공자의 칭찬 히우 그 덕행이 더욱 뚜렷해졌다. 바위나 동굴 속에 숨어 사는 은자는 때를 보아 나아가거나 물러나는 행동을 한다. 이런 사람들의 명성에 파묻혀 세상에 알려지지 않으니, 실로 슬프구나! 시골에 묻혀 살면서 덕행을 닦아 명성을 떨치려는 자가 청운의 뜻을 가진 선비를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후세에 그 이름을 남길 수 있겠는가?
.....................................................

사기 열전 - 사마천 (신동준 옮김, 위즈덤하우스)
....................................................................................
(같이 읽으면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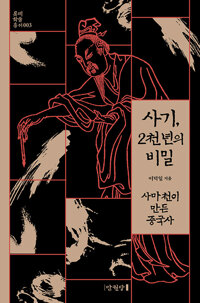
사기, 2천년의 비밀 - 이덕일 (만권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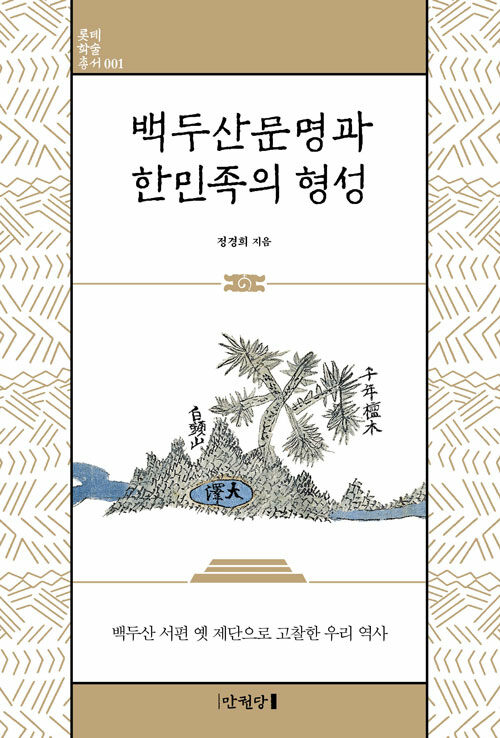
백두산문명과 한민족의 형성 - 정경희 (만권당)

한단고기 - 임승국 (정신세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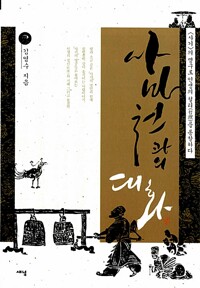
사마천과의 대화 - 김영수 (새녘출판사)
...........................................................................
<참고>
후세에 그 이름을 남겨서 무엇을 할 것인가.
백이와 숙제가 수양산에서 굶어 죽은 것이 원망의 문제인가. 누구에 대한 원망인가?
인과 효로 전쟁을 막는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이다. 춘추시대의 전쟁과 전국시대의 전쟁은 전혀 다르다. 그렇지만 아무리 춘추시대 이전이라고 해도 전쟁의 원인과 방법의 문제를 논해야 할 곳에서 인의와 충효를 찾는 것, 그것이 본질적 오류이다. 그러니 원망하는 개인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
세상에 부귀하게 살고 천비하게 사는 것이 사회 질서의 탓이지 하늘의 탓이 아니다. 사회 계급과 경제 질서를 인정한 이상 사회, 경제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지, 착한 사람, 악한 사람으로 분류해서 부귀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악한 사람이 잘사는것은 당대의 법과 국가의 해결능력의 문제이다. 그런 악한을 징벌하지 않고 천수를 누릴 만큼 오랫동안 방치한 것은 국가와 관료의 무능이다.
사마의는 역사의 발전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대의 사고와 생활방식으로 모든 기준을 삼고 있다. 그 당대의 시대와 생활상은 반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사는 시대의 기준으로 역사를 평가할 뿐이다. 고대 초기 국가와 이미 국가로 완성되고 있는 한나라의 생활상과 사고방식이 다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 시대에 비친 인간의 심성을 기준으로 역사를 논하는 것이 객관적이다.
사마천의 사기에 대한 평가에서 문장의 아름다움과 사마천의 사평을 들고 있다.
자신의 짧은 소견은 후대가 다시 평가를 내려야 한다. 단지 사기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이해하면 될 뿐, 사기가 아주 위대한 사서인양 추앙할 필요가 있을까. 또한 고고학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 사서라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사기열전은 오늘날의 위인전 소설이다. 사기에 기술된 것 또한 전대의 이야기에 꾸밈을 더한 것이다. 단지 세상엔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좋은 사례로 각자의 인생을 탐구하며 순간의 선택이 어떠했는지 자신의 생각을 입혀서 수신에 도움이 되는 좋은 귀감으로 삼을 수 있다.
세상은 악으로 가득차 있다는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각자의 몫이다.
<홍익인간, 재세이화>
............................................................................................................................................................................................................................
사마 천(司馬遷, 기원전 145년경 - 기원전 86년경)
중국 전한(前漢) 시대의 역사가이다.
산시 성 용문(龍門)(현재 위남시 한청시)에서 태어났다. 자는 자장(子長)이며, 아버지인 사마담의 관직이었던 태사령(太史令) 벼슬을 물려받아 복무하였다. 태사공(太史公)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후에 이릉 사건에 연루되었다. 이릉 장군이 흉노와의 전쟁에서 중과부적으로 진 사건에서 이릉을 변호하다 무제의 노여움을 사서 궁형을 받게 된 것이었다. 사마천은 《사기》의 저자로서 동양 최고의 역사가의 한 명으로 꼽히어 중국 '역사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진다. 실제 사마천의 사기는 역사를 사가가 해석한 글로 존중받는다.
..........................................

사기 - 사마천 (김원중 옮김, 민음사)

사기 - 사마천 (신동준 옮김, 위즈덤하우스)

사기 - 사마천 (김영수 옮김, 알마)
..................................................................
'IV. 고전 인문 > 1. 동양 - 고전 인문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비자 (신동준 옮김, 인간사랑) (0) | 2023.04.24 |
|---|---|
| 논어 - 공자 (안성재, 어문학사) (2) | 2023.03.27 |
| 손자병법 (화산의 온통 손자병법) - 화산 (이인호 옮김, 뿌리와 이파리) (0) | 2023.03.03 |
| 동양을 만든 13권의 고전 - 쑤치시, 웡치빈 (황희경, 김원중 옮김, 글항아리) (1) | 2023.02.05 |
| 도덕경 - 노자 (이석명 옮김, 올재클래식) (1) | 2023.02.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