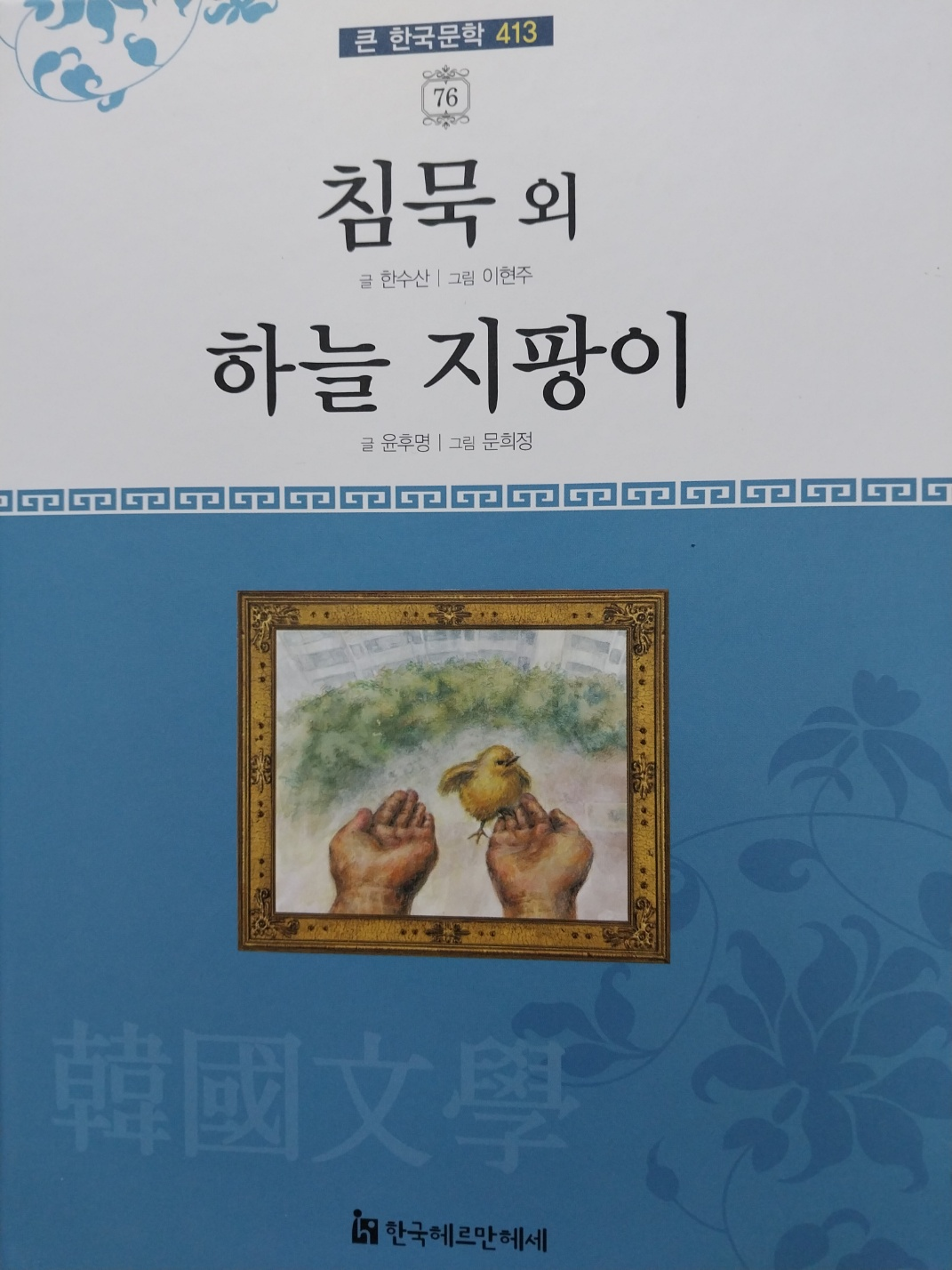
큰한국문학 413 (76권)
목차
한수산
침묵
미지의 새
윤후명
하늘 지팡이
송기원
월행
.......................................
한수산 - 침묵 (1977년)
모래를 날리며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는 일제히 강변 쪽으로 돌아섰다. 가슴 깊숙이 머리를 처박았다. 길 밑으로는 철책이 쳐져 있었고 그 밑으로 드문드문 푸른빛이 보이는 잔디들이 먼지를 뒤집어쓴 채 덮여 있었다.
바람은 여전히 불어와 우리들의 머리칼을 날리고 옷깃을 펄럭이게 했다.
강물 위에서는 햇빛이 잘디잘게 부서져 나가고 있었다.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가느다랗게 눈을 뜨면서 우리는 서로의 얼굴에서 번들거리는 음모를, 터질 듯한 기대를, 그리고 숨길 수 없이 도사리고 있는 나들이에 대한 불안을 보았다.
그러한 여러 가지 기분이 복합되어 만들어 내는 감정의 밑바닥에는 습기 낀 충동들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발바닥이며 겨드랑 혹은 배꼽 근처를 작은 벌레가 스멀스멀 기어다니느 것같이 우리들을 못 견디게 만들었다. 온몸의 땀구멍 하나하나가 조여 오는 것 같았다. (p.9-11)
8동 건물을 바라보자니 우리들이 너무 높이 올라왔으므로 병아리들은 멀리멀리 날아가 버릴 것만 같았다. 다시 밑을 내려다보니 이제 병아리들이 날아가 버림으로써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하나 둘 셋 하면 날리기다."
우리는 서로 입을 모아, 발바닥이 허공에 떠 있는 듯한 무서움을 이기기 위해 큰 소리로 외쳤다.
"하나 둘 셋."
몇 개의 돌멩이처럼 병아리는 허공으로 던져졌다. 우리는 아래층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이젠 올라올 때와는 달랐다. 우리는 제가끔 달리고 있었다. 걸어 올라오던 사람들은 앞으로 고꾸라질 듯한 자세로 달려 내려오는 우리들을 보자 걸음을 멈추곤 했는데 그렇게 서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부딪혀 시장 바구니가 구르는 소리가 뒤쪽에서 울렸다.
"무슨 짓들이야! 저런저런....애들도 극성은."
밑으로 내려온 우리들은 숨을 헐떡거리며 병아리가 떨어졌을 시멘트 바닥을 뒤지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는 병아리를 우리는 쉽게 찾아냈다.
"이건 벌써 죽었다. 날개에 칠을 한 건 누구 거니?"
"야, 이건 머리가 깨졌는데. 목을 시꺼멓게 칠을 한 건 누구 거야?"
아직도 가쁜 숨을 쉬느라 어깨를 들썩거리며 우리는 저마다 실망에 가득 차서 중얼거렸다. 잠시 전까지 우리들의 손아귀에서 따스하게 꼬물거리던 병아리들은 하나같이 길게 기지개를 켜거나 혹은 허공으로 뛰어오르려고 했던 것처럼 다리를 곧게 뻗고 죽어 있었다.
너무나 빨리 끝나 버린 경기에의 실망을 숨가쁘게 헐떡이며 토해 내고 있을 때 누군가가 놀라움에 넘쳐서 소리쳤다.
"살았다, 살았어. 이것 봐. 움직인다."
우리는 우르르 그쪽으로 달려갔다. 발목에 칠을 한 6호 아이의 것이었다. 우리는 가장 오래 살아남았음으로 해서 갈채를 받아야 할 그 우승자의 몸짓을 빙 둘러쌌다. 그러곤 발가락 마디마디가 길게 펼쳐졌다. 그의 입이 커다랗게 찢어질 듯 열리다가 한순간에 멎더니 움찔하는 몸부림과 함께 조금 다물어졌다. 그리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그때까지 참았던 숨을 길게 토해 내며 우리들이 허리를 펴기 시작했을 때였다.
"피다."
하는 기느다란 외침이 누구에게선지 새어 나왔다. 찢어져라 벌어진 병아리의 그 작은 입에서 흘러나온 피가 뾰족한 혓바닥을 적시며 주둥이에서 맺혔다. 우리는 고개를 들었다.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10호 아이가 말했다.
"너무 높이 올라갔었나 봐."
"그래. 옥상은 너무 높아. 다 죽어 버렸잖아."
"7층쯤에서 했어야 하는걸."
"아냐, 5층에서 했어야 돼. 어제처럼."
"내일 다시 하자."
"그래, 내일은 2층에서 날리자. 여러 번 하게."
게임의 결과에 대해 아쉬워하며 우리는 손을 비볐다. 그것은 저금통을 찢어서까지 해치운 우리의 수고에 비해 너무나도 간단하게 일찍 끝나 버렸던 것이다. 그때였다. 우리들의 뒤에서 주춤거리고 서 있던 3호집 아이가 우리들과는 전연 다른 정확하고도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다.
"난 그만두겠어."
3호 아이는 두 손을 주머니에 찌르고 있었다. 우리는 이 반역자를 바라보고 그러고 나서 그가 우리들 사이의 단 하나 게집애라는 사실에 안도의 숨을 내뿜었다.
"좋아. 관둬."
"야, 게집앤 꺼져 버려. 너 같은 건 끼워 주지도 않아."
병아리가 안겨 준 실망에 증오까지를 처발라서 우리는 3호집 아이게게 던지기 시작했다. 입술을 쫑긋거리던 계집애는 그러나 우리의 박해와는 무관한 얼굴로 가만히 주머니에 찔렀던 손을 빼내었다. 거기엔 황금빛 털을 한 병아리가 갑자기 환한 곳으로 나오자 눈이 부신 듯 고개를 흔들며 쥐어져 있었다. 그녀의 이 예기치 않았던 반란에 우리는 할 말을 잃고 서 있었다.
"난 이걸 기를 테다. 우리 집에는 새장이 있거든. 우리 아빠가 사 온 거야."
계집애는 종알거리곤 우리들 앞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발딱 세우고 걸어나갔다. 우리는 게집애의 뒷모습을 따라 고개를 돌려 갔다. 불어오는 저녁 바람에 머리칼을 나폴거리는 게집애의 어깨에는 저녁 햇살이 깃털처럼 얹혀 있었다. 우리들의 머리 위로 한 무더기의 흙덩이가 떨어져 내리듯 비둘기 떼가 날아 올라갔다.
그때였다. 누가 먼저였는지 모른다. 우리는 눈빛을 번들거리며 계집애를 향해 뛰어갔고 그녀의 머리채를 낚아챘다. 우리들은 계집애의 팔을 비틀어 잡았고 그 손에서 병아리를 빼앗으려고 했다. 계집애는 몸이 나뒹구는 것과 함께 손에서 떨어져 나간 병아리는 뒤뚱거리며 몸을 일으키더니 그 작은 날개를 하늘 높이 쳐들며 뛰어 달아나기 시작했다. 우리들에게는 이제 계집애가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는 새로운 사냥감을 보았고 그 두뚱거리며 달아나는 병아리를 쫓아서 달려갔다.
계집애가 악을 쓰며 울어 대는 울음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우리는 다만 이제는 누구도 가지지 못한 그 노오란 한 덩이의 움직이는 텔에게 갑자기 온갖 적의를 번득이며 누가 먼저일 것도 없이 발길질을 쏟아 붓기 시작했다.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이미 배가 터져 버린 한 마리의 병아리를 향해 우리는 끊임없이 발길질을 게속하고 있었다. (p.38-43)
<작품 이해>
<침묵은 아파트 단지에 갇혀 살아가는 어린이들의 이야기이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아스팔트가 깔리면서 놀이 공간을 잃어버린 아이들은 병아리 장수에게서 병아리를 하나씩 사서 키우기로 한다. 그러다 병아리들은 하나씩 죽어 가고 두 마리만 남았을 때 아이들은 어느 병아리가 멀리 나는가 내기를 한다. 아파트 5층에서 두 마리의 병아리를 날려 보내지만 병아리들은 죽고 만다. 아이들은 다시 병아리를 사서 아파트 옥상에서 날려보내나 역시 병아리들은 떨어져 죽는다. 그러나 3호집 아이만 병아리를 떨어뜨리지 않고 기르겠다고 하자 아이들은 그 아이를 넘어뜨리고 병아리를 밟아 죽인다. 작가는 병아리를 죽이는 아이들의 잔인한 행동을 통해 황폐화된 생활방식과 물질문명의 집단 사회가 생명력과 사랑을 어떻게 파괴시키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p.161)
............................................................................................................................................................................................................................
한수산(韓水山, 1946년 11월 13일 - )
대한민국의 소설가이다

강원도 인제군 내설악에서 출생하였고, 춘천고등학교와 경희대학교 영문과를 나왔다. 197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사월의 끝〉이 당선되어 등단하였고, 1973년 장편 《해빙기(解氷期)의 아침》이 《한국일보》에 입선하였다. 주요 작품으로 《부초》,《유민》(流民),《밤의 찬가》,《욕망의 거리》 등이 있다. 산문시와 같은 부드러운 문체를 통하여 시간과 생명과의 상관관계 및 생명의 가치에 대한 탐구를 보여주는 작가로 평가되고 있다.
....................................

부초 - 한수산 (민음사)

사월의 끝 - 한수산 (책세상)

타인의 얼굴 - 한수산 (창비)

이별없는 아침 - 한수산 (중앙일보사)

가을꽃 겨울나무 - 한수산 (중알일보사)
..................................................................
'VII. 아동, 청소년 > 1. 한국 문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우리들의 장례식 - 박범신 (한국헤르만헤세) (0) | 2023.07.24 |
|---|---|
| 미지의 새 - 한수산 (한국헤르만헤세) (0) | 2023.07.21 |
| 암사지도 - 서기원 (한국헤르만헤세) (0) | 2023.07.19 |
| 목마른 뿌리 - 김소진 (한국헤르만헤세) (0) | 2023.06.25 |
| 동백꽃 누님 - 이청준 (다림) (0) | 2023.06.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