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비 20세기 한국소설 6
목차
이태준
달밤
까마귀
복덕방
패강랭(浿江冷)
농군
해방 전후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방란장 주인
성탄제
최노인전 초록
춘보
이메일 해설 - 배성규, 심진경
낱말풀이
.................................................
이태준 - 달밤 (1933년)
성북동으로 이사 나와서 한 대엿새 되었을까. 그날 밤 나는 보던 신문을 머리맡에 밀어던지고 누워 새삼스럽게,
"여기도 정말 시골이로군!"
하였다.
무어 바깥이 컴컴한 걸 처음 보고 시냇물 소리와 쏴 하는 솔바람 소리를 처음 들어서가 아니라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이날 저녁에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말 몇 마디 사귀지 않아서 곧 못난이란 것이 드러났다. 이 못난이는 성북동의 산들보다, 물들보다, 조그만 지름길들보다, 더 나에게 성북동이 시골이란 느낌을 풍겨주었다.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을 리야 없겠지만 대처에서는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세를 하지 못하고, 시골에선 아무리 못난이라도 마음 놓고 나와 다니는 때문인지, 못난이는 시골에만 있는 것처럼 흔히 시골에서 잘 눈에 뜨인다. 그리고 또 흔히 그는 태고 때 사람처럼 그 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런 눈을 가지고, 자기 동리에 처음 들어서는 손에게 가장 순박한 시골의 정취를 돋아주는 것이다. (p.13-14)
우리 집에서는 그까짓 반편과 무얼 대꾸를 해가지고 그러느냐 하되, 나는 그와 지껄이기가 좋았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열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고, 그와는 아무리 오래 지껄이어도 힘이 들지 않고, 또 아무리 오래 지껄이고 나도 웃음밖에는 남는 것이 없어 기분이 거뜬해지는 것도 좋았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중만 아니면 한참씩 그의 말을 받아주었다.
어떤 날은 서로 말이 막히기도 했다. 대답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고 막히었다. 그러난 그는 늘 나보다 빠르게 이야깃거리를 잘 찾아냈다. 오뉴월인데도 "꿩고기를 잘 먹느냐?"고도 묻고 "소와 말과 싸움을 붙이면 어느 것이 이기겠느냐?"는 둥, 아무튼 그가 얘깃거리를 취재하는 방면은 기상천회로 여간 범위가 넓지 않은 데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다. 하루는 나는 "평생소원이 무엇이냐?고 그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그까짓 것쯤 얼른 대답하기는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면서 평생소원은 자기도 원배달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남이 혼자 배달하기 힘들어서 한 이십 부 떼어주는 것을 배달하고 월급이라고 원배달에게서 한 삼 원 받는 터이라, 월급을 이십여 원을 받고 신문사 옷을 입고 방울을 차고 다니는 원배달이 제일 부럽노라하였다. 그리고 방울만 차면 자기도 뒤어다니며 빨리 돌릴 뿐 아니라 그 은행소에 다니는 집 개도 조금도 무서울 것이 없겠노라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럴 것 없이 아주 신문사 사장쯤 되었으면 원배달도 바랄 것 없고 그 은행소에 다니는 집 개도 상관할 바 없지 않겠느냐? 한즉 그는 뚱그레지는 눈알을 한참 굴리며 생각하더니 "딴은 그렇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경난이 없어 거기까지는 바랄 생각도 못하였다고 무릎을 치듯 가슴을 쳤다.
그러나 신문 사장은 이내 잊어버리고 원배달만 마음에 박혔던 듯, 하루는 바깥마당에서부터 무어라고 떠들어대며 들어왔다.
"이선생님? 이선생님 겝쇼? 아, 저도 내일부턴 원배달이올시다. 오늘 밤만 자면입쇼..."
한다. 자세히 물어보니 성북동이 따로 한 구역이 되었는데, 자기가 맡게 되었으니까 내일은 배달복을 입고 방울을 막 떨렁거리며 올 테니 보라고 한다. 그리고 "사람이란 게 그러게 무어든지 끝을 바라고 붙들어야 한다"고 나에게 일러주면서 신이 나서 돌아갔다.
우리도 그가 원배달이 된 것이 좋은 친구가 큰 출세나 하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진실로 즐거웠다. 어서 내일 저녁에 그가 배달복을 입고 방울을 차고 와서 쭐렁거리는 것을 보리라 하였다.
그러나 이튿날 그는 오지 않았다. 밤이 늦도록 신문도 그도 오지 않았다. 그다음 날도 신문도 그도 오지 않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야, 이날은 해도 지기 전인데 방울소리가 요란스럽게 우리 집으로 뛰어 들었다.
"어디 보자!"
하고 나는 방에서 뛰어나갔다.
그러나 웬일일까, 정말 배달복에 방울을 차고 신문을 들고 들어서는 사람은 황수건이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이다.
"왜 전엣 사람은 어디 가고 당신이오?"
물으니 그는,
"제가 성북동을 맡았습니다."
한다.
"그럼, 전엣 사람은 어디를 맡았소?"
하니 그는 픽 웃으며,
"그까짓 반편을 어딜 맡깁니까? 배달부로 쓸랴다가 똑똑지가 못하니깐 안 쓰고 말았나봅니다."
한다.
"그럼 보조 배달도 떨어졌소?"
하니,
"그럼요, 여기가 따루 한 구역이 된걸이오."
하면서 방울을 울리며 나갔다.
이렇게 되었으니 황수건이가 우리 집에 올 길은 없어지고 말았다.
나도 가끔 문안엔 다니지만 그의 집은 내가 다니는 길 옆은 아닌 듯 길가에서도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가까운 친구를 먼 곳에 보낸 것처럼, 아니 친구가 큰 사업에나 실패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못 만나는 섭섭뿐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다. 그 당자와 함께 세상의 야박함이 원망스럽기도 하였다. (p.17-19)
그날 나는 그에게 돈 삼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학교 앞에 가서 뻐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오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그는 삼 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굽쇼."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다.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른하지 않았다.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밑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단 것이다. 저희끼리 금슬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벙긋거리며 첫마디로,
"선생님 잡수라고 사왔습죠."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나가 매를 말리고 포돗값을 물어주었다. 포돗값을 물어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보며 먹었다.
어제다. 문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깁을 깐 듯하다.
그런데 포도원께를 올라오노라니까 누가 맑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께....와 나....미다까 다메이...끼....까...(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를 부르며 큰길이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수건인가?"
하고 아는 체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휙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그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퍽퍽 빨면서 지나갔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 (p.24-26)
<중앙> 1호 (1933.11)
<달밤> (한성도서 1934)
.......................................................................................................................................................................................................................................
이태준(李泰俊 본명: 이규태, 李奎泰, 1904년 11월 4일 ~ 불명)
일제령 조선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소설가이다.
아버지 이문교는 개화파 지식인으로서 함경남도 덕원감리서(德源監理署)에 근무한 지방관원이었는데, 당시 한말의 개혁파의 운동에 가담하였던 듯 수구파에 밀려 블라디보스톡 등지로 망명하다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이태준은 어려서부터 어렵게 수학하였다.
1920년 휘문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 당시 그 학교의 교원이었던 이병기(李秉岐)의 지도를 받아 고전문학의 교양을 쌓았다. 그런데 학교의 불합리한 운영에 불만을 품고 동맹휴학을 주도한 결과 퇴교를 당하였다. 1926년 일본 도쿄에 있는 조오치대학[上智大學] 문과에서 수학하다 중퇴하고 귀국하였다.
1929년에 개벽사(開闢社) 기자로 일하였고, 이화여자전문학교 강사, 조선중앙일보 학예부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1933년 친목단체인 구인회(九人會)를 이효석(李孝石)·김기림(金起林)·정지용(鄭芝溶)·유치진(柳致眞) 등과 결성하였다.
이어 순수문예지 『문장(文章)』(1939.2∼1941.4.)을 주재하여 문제작품을 발표하는 한편, 역량 있는 신인들을 발굴하여 문단에 크게 기여하였다. 단편소설 「오몽녀(五夢女)」(1925)를 『시대일보(時代日報)』에 발표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하였다.
또, 「아무일도 없소」(東光, 1931.7.)·「불우선생(不遇先生)」(三千里, 1932.4.)·「꽃나무는 심어놓고」(新東亞, 1933.3.)·「달밤」(中央, 1933.11.)·「손거부(孫巨富)」(新東亞, 1935.11.)·「가마귀」(朝光, 1936.1.)·「복덕방(福德房)」(朝光, 1937.3.)·「패강냉(浿江冷)」(三千里文學, 1938.1.)·「농군(農軍)」(文章, 1939.7.)·「밤길」(文章, 1940·5·6·7합병호)·「무연(無緣)」(春秋, 1942.6.)·「돌다리」(國民文學, 1943.1.) 등이 있다.
그리고 「해방전후(解放前後)」(文學, 1946.8.) 등 일제강점기 민족의 과거와 현실적 고통을 비교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품을 썼으며, 그의 간결하면서도 호소력 있는 묘사적 문장은 독자의 호응을 크게 받았다. 그가 취택한 인물들은 가난하고, 무력하지만 우리의 전통적 삶의식을 잘 드러내며 인간미가 풍기는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다.
초기작품 「아무일도 없소」에는 신출기자의 취재에 의하여, 3·1운동 당시 대동단(大同團)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망명한 애국지사의 딸이 생계가 어려워 창녀가 되었고, 그 사실에 충격을 받은 지사의 아내가 자결한다는 내용이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비극적 사태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당시대의 세속적인 삶의 궤도는 잘도 돌아간다는 반어적 인식이 제기된다. 이러한 민족의식의 주제는 상당히 많은 편수에 이르고, 장편 「사상(思想)의 월야(月夜)」(1946)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른 한편, 소외된 인물들의 현실적 고난과 그 인물의 내면세계의 순수무구함을 드러내어 인간애의 의식을 촉구하는 주옥 같은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수필집 『무서록(無序錄)』(1944)과 문장론 『문장강화(文章講話)』(1946) 등도 그의 탁월한 문학적 저서로서 크게 공헌한 책들이다. 광복 후 1946년에 월북하였다.
...................................................

문장강화 - 이태준 (창비)

무서록 - 이태준 (깊은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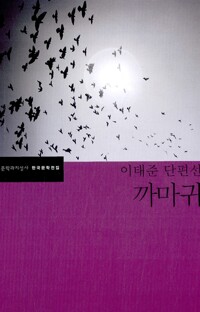
까마귀 - 이태준 (문학과지성사)

남행열차 - 이태준 (태학사)

달밤 - 이태준 (사피엔스21)
..........................................................................
'I. 한국 문학 > 2. 소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봄, 봄 - 김유정 (문학과지성사) (0) | 2023.03.16 |
|---|---|
| 갯마을 - 오영수 (창비) (2) | 2023.03.15 |
| 별 - 황순원 (창비) (0) | 2023.03.12 |
| 학 - 황순원 (문이당) (1) | 2023.03.12 |
| 사평역 - 임철우 (창비) (1) | 2023.03.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