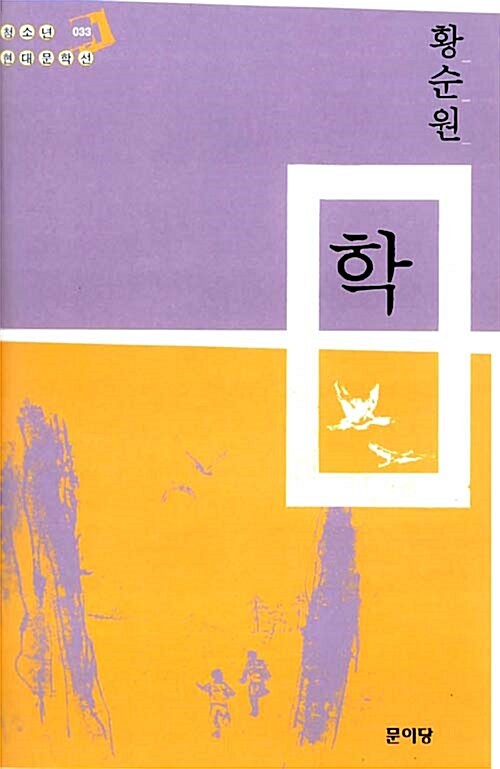
문이당 청소년 현대문학선 33
목차
학
필묵 장수
잃어버린 사람들
너와 나만의 시간
내 고향 사람들
그래도 우리끼리는
차라리 내 목을
나무와 돌, 그리고
땅울림
마지막 잔
...............................................
황순원 - 학 (1953년)
3.8 접경의 이 북쪽 마을은 드높이 개인 가을 하늘 아래 한껏 고즈넉했다.
주인없는 집 봉당에 흰 박통만이 흰 박통을 의지하고 굴러있었다. 어쩌다 만나는 늙은이는 담뱃대부터 뒤로 돌렸다.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멀찌감치서 미리 길을 비켰다. 모두 겁에 질린 얼굴들이었다. 동네 전체로는 이번 동란에 깨어진 자국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어쩐지 자기가 어려서 자란 옛 마을은 아닌 성싶었다.
뒷산 밤나무 기슭에서 성삼은 발걸음을 멈추었다. 거기 한 나무에 기어올랐다. 귓속 멀리서, 요놈의 자식들이 또 남의 밤나무에 올라가는구나, 하는 혹부리 할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 혹부리 할아버지도 그새 세상을 떠났는가. 몇 사람 만난 동네 늙은이 가운데 뵈지 않았다.
성삼은 밤나무를 안은 채 잠시 푸른 가을 하늘을 치어다보았다. 흔들지도 않은 밤나뭇가지에서 남은 밤송이가 저 혼자 아람이 벌어져 떨어져 내렸다.
임시 치안대 사무소로 쓰고 있는 집 앞에 이르니, 웬 청년 하나가 포승에 꽁꽁 묶이어 있다.
이 마을에서 처음 보다시피 하는 젊은이라, 가까이 가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깜짝 놀랐다. 바로 어려서 단짝 동무였던 덕재가 아니냐.
천태에서 같이 온 치안대원에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다. 농민동맹 부위원장을 지낸 놈인데 지금 자기 집에 잠복해 있는 걸 붙들어 왔다는 것이다.
성삼은 거기 봉당 위에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덕재를 청단까지 호송하기로 되었다. 치안대원 청년 하나가 데리고 가기로 했다.
성삼이 다 탄 담배꽁초에서 새로 담뱃불을 댕겨 가지고 일어섰다.
"이 자식은 내가 데리고 가지요."
덕재는 한결같이 외면한 채 성삼이 쪽은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동구 밖을 벗어났다.
성삼은 연거푸 담배만 피웠다. 담배 맛은 몰랐다. 그저 연기만 기껏 빨았다 내뿜었다. 그러다가 문득 덕재 녀석도 담배 생각이 나려니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려서 어른들 몰래 담 모퉁이에서 호박잎 담배를 나눠 피우던 생각이 났다. 그러나 오늘 이깟 놈에게 담배를 권하다니 될 말이냐. (P.7-9)
성삼은 와락 저도 모를 화가 치밀어 고함을 질렀다.
"이 자식아, 그동안 사람을 멫이나 죽였냐?"
그제야 덕재가 힐끗 이쪽을 바라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거둔다.
"이 자식아, 사람 멫이나 죽여어?"
덕재가 다시 고개를 이리로 돌린다. 그리고는 성삼을 쏘아본다. 그 눈이 점점 빛을 더해 가며 제법 수염발 잡힌 입 언저리가 실룩거리더니, "그래 너는 사람을 그렇게 죽여 봤니?"
이 자식이! 그러면서도 성삼의 가슴 한복판이 환해짐을 느낀다. 막혔던 무엇이 풀려 내리는 것만 같다. 그러나, "농민동맹 부위원장쯤 지낸 놈이 왜 피하지 않았어? 필시 무슨 사명을 띠구 잠복해 있는거지?"
덕재는 말이 없다.
"바른대로 말해라. 무슨 사명을 띠구 숨어 있었냐?"
그냥 덕재는 잠잠히 걷기만 한다. 역시 이 자식 속이 꿀리는 모양이구나. 이런 때 낯짝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외면한 채 다시는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성삼은 허리에 찬 권총을 잡으며, "변명은 소용없다. 영락없이 넌 총살감이니까. 그저 여기서 바른대로 말이나 해봐라."
덕재는 그냥 외면한 채, "변명은 하려고도 않는다. 내가 제일 빈농의 자식인 데다가 근농이라고 해서 농민동맹 부위원장이 됐던 게 죽을죄라면 하는 수 없는 거고, 나는 예나 지금이나 땅 파먹는 재주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고는 잠시 사이를 두어, "지금 집에 아버지가 앓아누었다. 벌써 한 반년 된다."
덕재 아버지는 홀아비로 덕재 하나만 데리고 늙어 가는 빈농이었다. 7년 전에 벌써 허리가 굽고 검버섯이 돋은 얼굴이었다.
"장간 안 들었냐?"
잠시 후에, "들었다."
"누와?"
"꼬맹이와."
아니 꼬맹이와? 거 재미있다. 하늘 높은 줄은 모르고 땅 넓은 줄만 알아, 키는 작고 똥똥하기만 한 꼬맹이. 무던히 새침데기였다. 그것이 얄미워 덕재와 자기는 번번이 놀려서 울려 주곤 했다. 그 꼬맹이한테 덕재가 장가를 들었다는 것이다.
"그래 애가 멫이나 되나?"
"올가을에 첫애를 낳는대나."
성삼은 그만 저도 모르게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겨우 참았다. 제 입으로 애가 몇이나 되느냐 묻고서도 올가을에 첫애를 낳게 됐다는 말을 듣고는 우스워 못 견디겠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작은 몸에 큰 배를 한 아름 안고 있을 꼬맹이. 그러나 이런 때 그런 일로 웃거나 농담을 할 처지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며, "하여튼 네가 피하지 않고 남아 있는 건 수상하지 않아?"
"나도 피하려고 했었어. 이번에 이남서 쳐들어오믄 사내란 사낸 모조리 잡아 죽인다고 열일곱에서 마흔 살까지의 남자는 강제로 북으로 이동하게 됐었어. 할 수 없이 나도 아버질 업고라도 피난 갈까 했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 된다는 거야. 농사꾼이 다 지어 놓은 농살 내버려 두고 어딜 간단 말이냐고. 그래 나만 믿고 농사일로 늙으신 아버지의 마지막 눈이나마 내 손으로 감겨 드려야겠고, 사실 우리같이 땅이나 파먹는 것이 피난 간댔자 별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 유월에는 성삼이 편에서 피난을 갔었다. 밤에 몰래 아버지 더러 피난 갈 이야기를 했다. 그때 성삼이 아버지도 같은 말을 했다. 농사꾼이 농사일을 늘어놓고 어디로 피난 간단 말이야. 성삼이 혼자서 피난을 갔다. 남쪽 어느 낯선 거리와 촌락을 헤매 다니면서 언제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건 늙은 부모와 어린 처자에게 맡기고 나온 농사일이었다. 다행이 그때나 이제나 자기네 식구들은 몸성히 있다. (P.10-12)
고개를 다 내려온 곳에서 성삼은 주춤 발걸음을 멈추었다.
저쪽 벌 한가운데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고 서 있는 듯 보이는 것은 틀림없는 학 떼였다. 소위 3.8선 완충 지대가 되었던 이곳. 사람이 살지 않았던 동안에도 이들 학들만은 전대로 살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날 성삼과 덕재가 아직 열두어 살쯤 났을 때 일이었다. 어른들 몰래 둘이서 올가미를 놓아 여기 학 한 마리를 잡은 일이 있었다. 단정학이었다. 새끼로 날개까지 얽어 매놓고는 매일같이 둘이서 나와 학의 목을 쓸어안는다, 등에 올라탄다, 야단을 했다. 그러한 어느 날이었다. 동네 어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서울서 누가 학을 쏘러 왔다는 것이다. 무슨 표본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총독부의 허가까지 맡아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그길로 둘이는 벌로 내달렸다. 이제는 어른들한테 들켜 꾸지람 듣는 것 같은 건 문제가 아니었다. 그저 자기네 학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잡풀 새를 기어 학 발목의 올가미를 풀고 날개의 새끼를 끌렀다. 그런데 학은 잘 걷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동안 얽매여 시달린 탓이리라. 둘이 학을 마주 안아 공중에 투쳤다. 별안간 총소리가 들렸다. 학이 두서너 번 날갯짓을 하다가 그래도 내려왔다. 맞았구나. 그러나 다음 순간, 바로 옆 풀숲에서 펄럭 단정학 한 마리가 날개를 펴자 땅에 내려앉았던 자기네 학도 긴 목을 뽑아 한번 울음을 울더니 그대로 공중에 날아올라, 두 소년의 머리 위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저쪽 멀리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다. 두 소년은 언제까지나 자기네 학이 사라진 푸른 하늘에서 눈을 뗄 줄을 몰랐다.
"얘, 우리 학 사냥이나 한번 하고 가자."
성삼이 불쑥 이런 말을 했다.
덕재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는데, "내 이걸로 올가밀 만들어 놓을게,, 너 학을 몰아오너라."
포승줄을 풀어 쥐더니, 어느새 성삼은 잡풀 새로 기는 걸음을 쳤다.
대번 덕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걷혔다. 좀 전에, 너는 총살감이라던 말이 퍼뜩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제 성삼이 기어가는 쪽 어디서 총알이 날아오리라.
저만치서 상삼이 홱 고개를 돌렸다.
"어이, 왜 멍추같이 게 서 있는 게야? 어서 학이나 몰아오너라!"
그제야 덕재도 무엇을 깨달은 듯 잡풀 새를 기기 시작했다.
때마침 단정학 두세 마리가 높푸른 가을 하늘에 큰 날개를 펴고 유유히 날고 있었다. (P.13-14)
..............................................................................................................................................................................................................................
황순원(黃順元, 1915년 3월 26일 ~ 2000년 9월 14일)
대한민국의 시인이자 소설가이다. 본관은 제안(齊安)이고 자(字)는 만강(晩岡)이다
황순원은 1915년 3월 26일 평안남도 대동군 재경면 빙장리에서 아버지 황찬영(黃贊永)와 어머니 장찬붕(張贊朋)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3.1운동 때 평양 숭덕학교 교사로 재직 중에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평양 시내에 배포한 일로 옥살이를 했다. 한때 일제 경찰이 뿌린 서슬을 피하여 평안남도 강동군에서 잠시 유아기를 보낸 적이 있는데, 1921년 당시 6세 때 가족 전체가 평양으로 이사하고, 1923년 만 8세 때 숭덕소학교에 입학한다. 유복한 환경에서 예체능 교육까지 따로 받으며 자라났다. 1929년에는 정주에 있는 오산중학교에 입학한다. 그곳에서 교장 출신인 남강 이승훈을 만나게 된다.
1930년부터 동요와 시를 발표하여 등단하였다. 1931년 7월 《동광(東光)》에 실은 〈나의 꿈〉이 등단작이다. 이후 숭실중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고, 중학교 시절 거듭 시를 발표하다가 1934년 졸업하고 일본 도쿄로 건너가 와세다 제2고등학원에 입학한다. 이해랑, 김동원 등과 함께 극예술 연구단체 《동경학생예술좌》를 창립하였고, 이 단체 이름으로 27편의 시가 실린 첫 시집 《放歌》를 간행했다. 1936년 와세다 제2고등학원을 졸업하고 와세다 대학교 문학부 영문과에 입학한다. 그 해 5월에 두 번째 시집 《骨董品》을 냈다. 이후 시를 더 이상 쓰지 않고 문학 편력이 소설로 넘어간다. 그 첫 작품은 1937년 7월 《創作》 제3집에 발표한 〈거리의 副詞〉이다. 이듬해 10월에 〈돼지系〉를 발표하고, 이 두 작품을 비롯해서 창작 연대가 확실치 않은 다른 11편의 단편을 함께 묶어 그로부터 3년 뒤인 1940년에 《황순원 단편집》(나중에 이 책을 늪』라는 제목으로 고쳐 펴낸다)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그 후에도 단편소설을 주로 쓰며 활동하다가 1942년 이후에는 일본의 한글 말살정책으로 고향인 빙장리에 숨어 지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작품을 발표하지 않은 채 여러 단편을 썼다. 8.15 광복 이후 황순원은 평양으로 돌아가지만 북조선이 공산화되면서 지주 계급으로 몰리자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이듬해 월남했다.
월남 후 서울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재직한 황순원은 지속적으로 단편소설을 발표했고, 1953년에는 장편 작가로서 그를 인정받게 한 장편 소설 《카인의 후예》를 발표한다. 1957년에는 경희대학교 국문과 조교수로 전임하여 생활이 안정되면서 김광섭, 주요섭, 조병화 등 동료 문인들과 함께 더 많은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는 1985년 발표한 산문집 《말과 삶과 자유》를 발표할 때까지 왕성한 창작열을 불태우며 많은 작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000년 타계할 때까지 소설은 더 이상 쓰지 않았으나 간간이 시작품을 발표하며 말년을 보냈다. 아들 황동규는 시인이자 영문학자로 활동하고 있다. 황순원의 단편소설 《소나기》는 현재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으며, 소년의 순수한 사랑을 부각시킨 내용의 뮤지컬로도 제작이 되기도 하였다.
2000년 9월 14일에 노환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자택에서 별세했다(향년 86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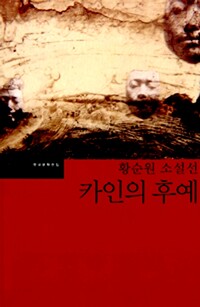
카인의 후예 - 황순원 (문학과지성사)

독짓는 늙은이 - 황순원 (문학과지성사)

별 - 황순원 (민음사)

나무들 비탈에서다 - 황순원 (문학사상사)

소나기 - 황순원 (다림 한빛문고)
........................................................................
'I. 한국 문학 > 2. 소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달밤 - 이태준 (창비) (0) | 2023.03.13 |
|---|---|
| 별 - 황순원 (창비) (0) | 2023.03.12 |
| 사평역 - 임철우 (창비) (1) | 2023.03.10 |
| 수난이대 - 하근찬 (창비) (2) | 2023.03.08 |
| 자전거 도둑 - 김소진 (강) (1) | 2023.03.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