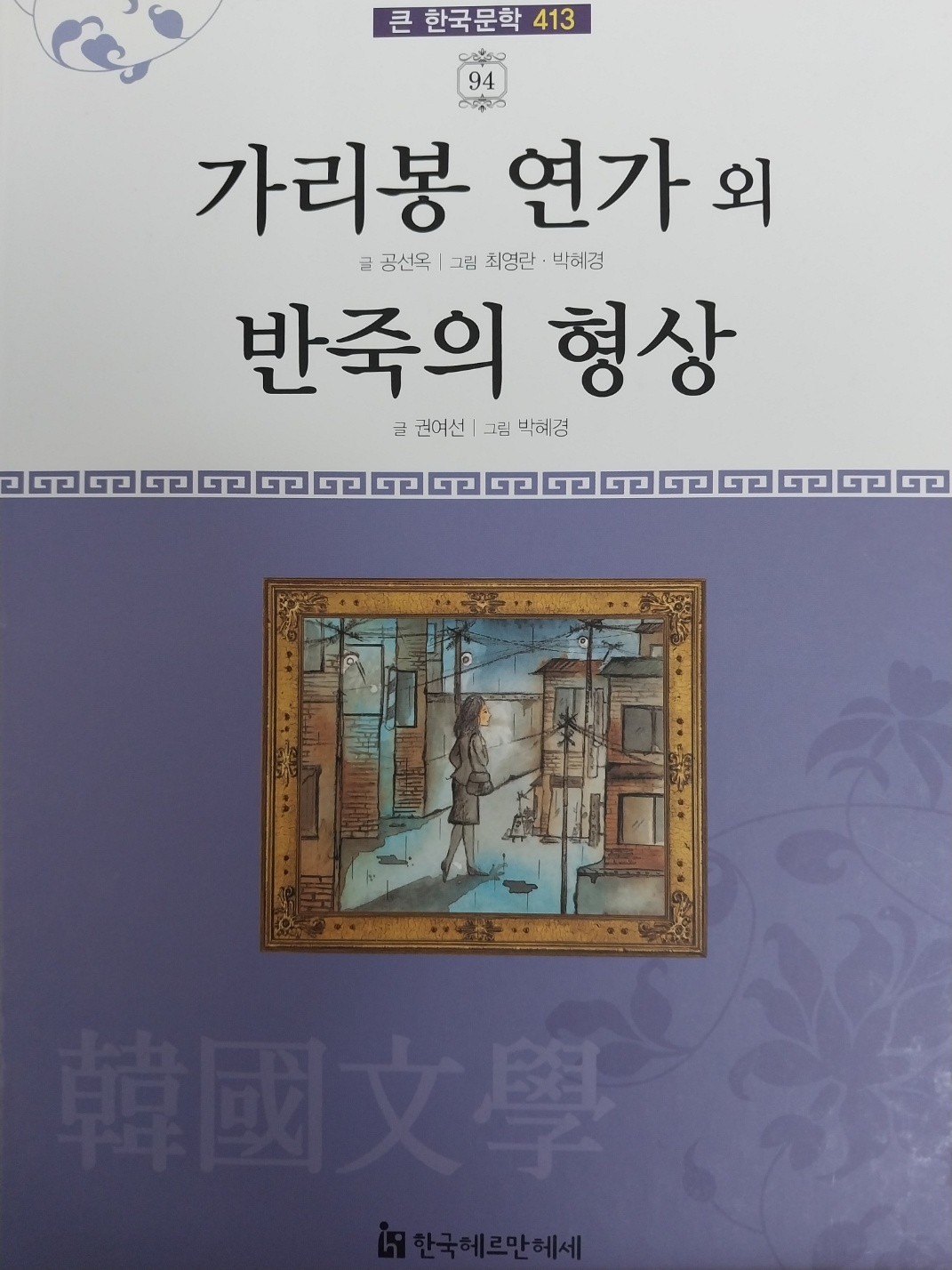
큰 한국문학 413 (94권)
목차
공선옥
가리봉 연가
남쪽 바다 푸른 나라
권여선
반죽의 형상
............................................
권여선 - 반죽의 형상 (2007년)
N에게 말은 안 했지만,
올해에도 나는 여름휴가가 시작되기 전부터 긴 휴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것을 과연 휴가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다. 휴가의 예감은 결투의 예감처럼 끔찍하고 달콤하다. 모욕에 결투로 응하는 풍습은 사라졌지만 그 깨끗한 변제에 대한 향수는 인류의 정신속에 면면히 남아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결투는 모욕을 청산하는 가장 명쾌한 방식이다. 결투에는 상대를 몇 대 패 주겠다거나 보상금 몇 푼 받아 내겠다는 식의 유치한 계산 찌꺼기가 없다. 나를 모욕한 자를 죽이거나 모욕당한 나 스스로 죽는 것만큼 모욕을 완전 연소시키는 방식이 또 있을까. 모욕이란 그런 것이다. 상대를 죽이거나 내가 죽거나. 칼이 둘 중 하나의 생명을 끊음으로써 모욕 관계를 끊는다. 그런 의미에서 내 휴가 또한 과거의 모욕에 대한 뒤늦은 결투 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날 아침 문득 골똘해져 수십 년 전 어떤 친구가 자신에게 했던 말이나 행위에서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발견하고 불현듯 떨치고 일어나 결투의 편지를 써 보내는 늙은 신사처럼 내 결투 신청에도 다소 우스꽝스러운 대목이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하지만 모욕이 즉각 교환되지 못하고 시간의 회로 속에서 길을 잃는 수도 있으니 아무리 늦어도 절박한 때가 적절한 때이다. 결투란 모욕이 가해진 시점이 아니라 모욕을 느낀 시점에서 신청되는 것이니. (p.121-122)
N과 나는 그곳 군데군데 듣어진 비닐 소파에 앉아 말없이 담배를 피웠다. N의 지갑과 내 지갑이 비록 윤곽은 따로지만 한 갑의 담배와 하나의 식판처럼 그 내용물은 공동의 것이듯 우리의 만족감도 한 반죽 속에 있는 두 형상이었다. (p.126)
나는 사직서를 내고 남보다 이른 여름휴가를 시작했다. 이것을 과연 휴가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휴가는 더 긴 지속을 위한 잠깐의 휴지로서 차와 해변과 휴양림이 있는, 최소한 만화나 추리 소설 베스트 목록과 조식을 제공하는 시내 호텔 리스트가 있는 삶의 쉼표 같은 것이다. 그에 비해 내 휴가는 마침표 뒤에 오는 말없음표처럼 대책 없는 것이다. 휴가를 위해 사직을 불사하는 것은 제 뿔의 세기를 알아보고자 거대한 나무둥치에 뿔을 박고 고사하는 코뿔소처럼 어리석은 욕망이지만 어리석은지 아닌지는 당사자인 코뿔소에게 조금도 중요하지가 않다. 뿔을 박는 행위만이 코뿔소에게는 절대적인 생존 능력의 측정인 것이다. 자신이 어떤 모욕을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없는지 생사를 걸고 증명하는 점에서 결투 또한 그렇다. 고작 4년의 경력과 8년의 우정을 걸었을 뿐이지만 나는 내 휴가가 여행보다는 실종 같은 것이기를 바란다.
내가 휴가를 끝내고 N을 다시 만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N의 편에서는 건망증 때문에, 내 편에서는...내 편에서는 우연히라도 N을 만나길 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N의 소식을 묻거나 전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마저 없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N은 내게 무심했고 나는 N을 경멸했지만 우리의 관계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다. 어느 순간 갈라졌고 나뉜 가지처럼 N과 나는 서로를 닮지 않으려 애썼다. 가끔 나는 N과의 오랜 관계에 대해 내가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곤 했다. 문제는 내 쪽에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투를 위한 손수건은 던져졌다. 나는 산란기 연어처럼 모욕이 발아하던 그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p.133-134)
다음 날도 N은 여학생 휴게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N을 보지 못하는 열흘 내내 나는 아파트 슈퍼나 장터에서 온갖 찬거리를 사들여 개미처럼 부지런히 음식을 만들었고 식구들의 눈을 피해 밤이면 식빵에 두툼하게 버터와 딸기 잼을 바르고 그 위에 아카시아 꿀을 뿌려 먹었다. 한 조작씩 먹다 보면 결국 식빵 한 봉지를 다 먹어 버리곤 했다.
개강 후 만난 N은 놀랍게도 가시같이 말라 있었다. N은 열흘 동안 세 자리 수의 그 버스를 타고 내가 사는 아파트를 지나 한강을 건너 강변에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돌아오곤 했다고 했다. 나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열흘 내내 같은 번호의 버스를 탔지만 우리는 늘 반대 방향으로만 달리고 있었다. N과 나는 낮술을 마시러 갔다. 그날 술집 뒷자리에 앉은 남학생이 조심성 없이 내뻗은 팔꿈치에 나는 머리를 살짝 얻어맞았다.
"왜 때리니? 나쁜 놈아. 왜 때리니? 나쁜 놈아."
뒷자리 남학생이 어리둥절한 채로 사과했지만 N은 꼬챙이처럼 계속 소리쳤다. 고의도 아니었고 세게 얻어맞은 것도 아니라고 내가 달랬지만 N은 목을 놓아 울었다.
"너 아프잖아. 너 아프잖아."
나는 N이 왜 우는지도 모른 채 따라 울었다. 걱정 마 N. 난 하나도 아프지 않아. 하나도 아프지 않아. 조금 살이 쪘을 뿐이야. 나는 울면서 파전을 먹었다. N은 젓가락도 들지 않았다. 나는 파전을 다 먹고 비릿한 오뎅 국물과 깍두기를 먹었다. '모든' 안주, 그렇다, 세상의 모든 안주를 다 먹어 치울 기세로 내가 주점 탁자 위의 접시를 말끔히 비운 그날부터였을 것이다. 한 덩어리의 반죽으로 두 형상을 빚을 때 하나의 형상을 작게 만들면 다른 형상이 커지듯 N의 거식증이 심해질수록 내 대식증도 심해졌다. 어느 날 N이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뾰족하게 기른 핏빛 손톱으로 내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했다.
"심하다!"
그때 손수건을 던졌어야 했다. 뒷자리의 남학생처럼 부주의하게 내 몸을 건드린 데 대해서가 아니라 세 자리 수의 그 버스를 타고 강변으로 가 수제비처럼 나를 조금씩 떼어 내 강으로 던진 열흘에 대해서, 너 아프잖아 너 아프잖아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목놓아 울던 최후의 애도에 대해서. (p.144-145)
결투용 검처럼 열 손톱이 화려하고 날카롭게 벼려지면 나는 노선 끝이 갈고리 모양으로 휜 세 자리 수의 그 버스를 타고 강변으로 갈 것이다. 강변에서 힘든 결투를 끝내고 해 질 녘 피에 젖은 한 꾸러미의 기름 덩어리를 버스의 갈고리에 걸고 돌아올 것이다. N은 내게 무심했고 나는 N을 경멸했지만 정말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다. 거식과 대식처럼 무심과 경멸은 나와 N, N과 나 사이의 방어막이었다. 나는 칼자국처럼 내 옆구리에 새겨진 세 음절의 모욕을 까맣게 잊을 것이다. 그리고 당당히 존재의 뒤편에서 걸어나와 세상이 요구하는 가볍고 깡마른 형상 위에 사뿐히 올라타고 새롭고 어여쁜 열 손톱을 박아 넣으러 떠날 것이다.
그것을 N강박이라고 부르겠다. 이제 그만 잘 가 N.
"뭐 해? 점심 먹으러 가자."
점심이란 말에 목젖이 땅기고 양쪽 침샘께가 뻐근해졌다. 식후에 먹을 간유구를 챙긴 N이 자연스럽게 내 팔짱을 끼었다. 분홍빛 팽이를 엎어 놓은 듯한 육중한 내 상체의 옆구리 쪽 계단식 이랑에 N은 팔걸이인 양 손목을 착 얹었다.
N에게 말은 안 했지만,
매년 여름휴가가 시작되기 전부터 나는 긴 휴가를 계획하곤 했다. 그것을 과연 휴가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다. 휴가의 예감은 결투의 예감처럼 끔찍하고 달콤하다. 아니, 내가 이미 N에게 휴가에 대해서 말을 했던가. 벌써 했는지도 모르겠고 미처 못했는지도 모르겠다. 결투의 편지 따위야 즉각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다. 편지가 덜 씌어졌거나 아직 부쳐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결투에의 달콤한 의지는 인류의 정신에 칼자국처럼 선명히 남아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어쨌든 N의 태도를 눈여겨볼 일이다. N의 건망증은 때로 장점이기도 하다. (p.149-150)
....................................
<작품 이해>
<반죽의 형상>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지나간 시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주인공 '나'는 긴 여름휴가를 계획하면서 오랜 친구인 N과의 관계를 청산하려고 한다. 대학 때 친구인 N과 나는 매일 아침 여학생 휴게실에서 만나 점심을 함께 먹고 저녁에 술을 마시며 한 시절을 공유한다. 졸업 후에도 같은 회사에서 붙어 다니던 두 사람. 하지만 둘의 관게에 균열이 생기고 N의 무심함에 나는 경멸을 느끼게 된다. 나는 N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 회사에 사표를 내고 긴 휴가를 계획하고 나만의 식탁을 차린다. N의 빈자리를 채우듯 끊임없이 음식물을 섭취하는 나. 한 덩어리의 반죽으로 두 형상을 빚듯 N의 거식증이 심해질수록 나의 대식증은 심해져 간다. 일상 속에서 불현듯 떠오르는 N의 충혈된 눈. 나는 N과의 관게를 끊고 떠나기 위해 매년 긴 휴가를 계획하곤 한다. (p.155)
..............................................................................................................................................................................................................................
권여선 (權汝宣 1965 - )
대한민국 소설가. 본명은 권희선

경북 안동시 출신이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인하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

분홍 리본의 시절 - 권여선 (창비 2007)

사랑을 믿다 - 권여선 (문학사상사)

안녕 주정뱅이 - 권여선 (창비)

아직 멀었다는 말 - 권여선 (문학동네)

레몬 - 권여선 (창비)

비자 나무 숲 - 권여선 (문학과지성사)

레가토 - 권여선 (창비)

푸르른 틈새 - 권여선 (문학동네)
........................................................
'VII. 아동, 청소년 > 1. 한국 문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우리시대의 소설가 - 조성기 (한국헤르만헤세) (1) | 2023.06.13 |
|---|---|
| 겨울의 환 - 김채원 (한국헤르만헤세) (1) | 2023.06.12 |
| 남쪽 바다 푸른 나라 - 공선옥 (한국헤르만헤세) (0) | 2023.06.09 |
| 가리봉 연가 - 공선옥 (한국헤르만헤세) (1) | 2023.06.08 |
| 어두운 기억의 저편 - 이균영 (한국헤르만헤세) (0) | 2023.06.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