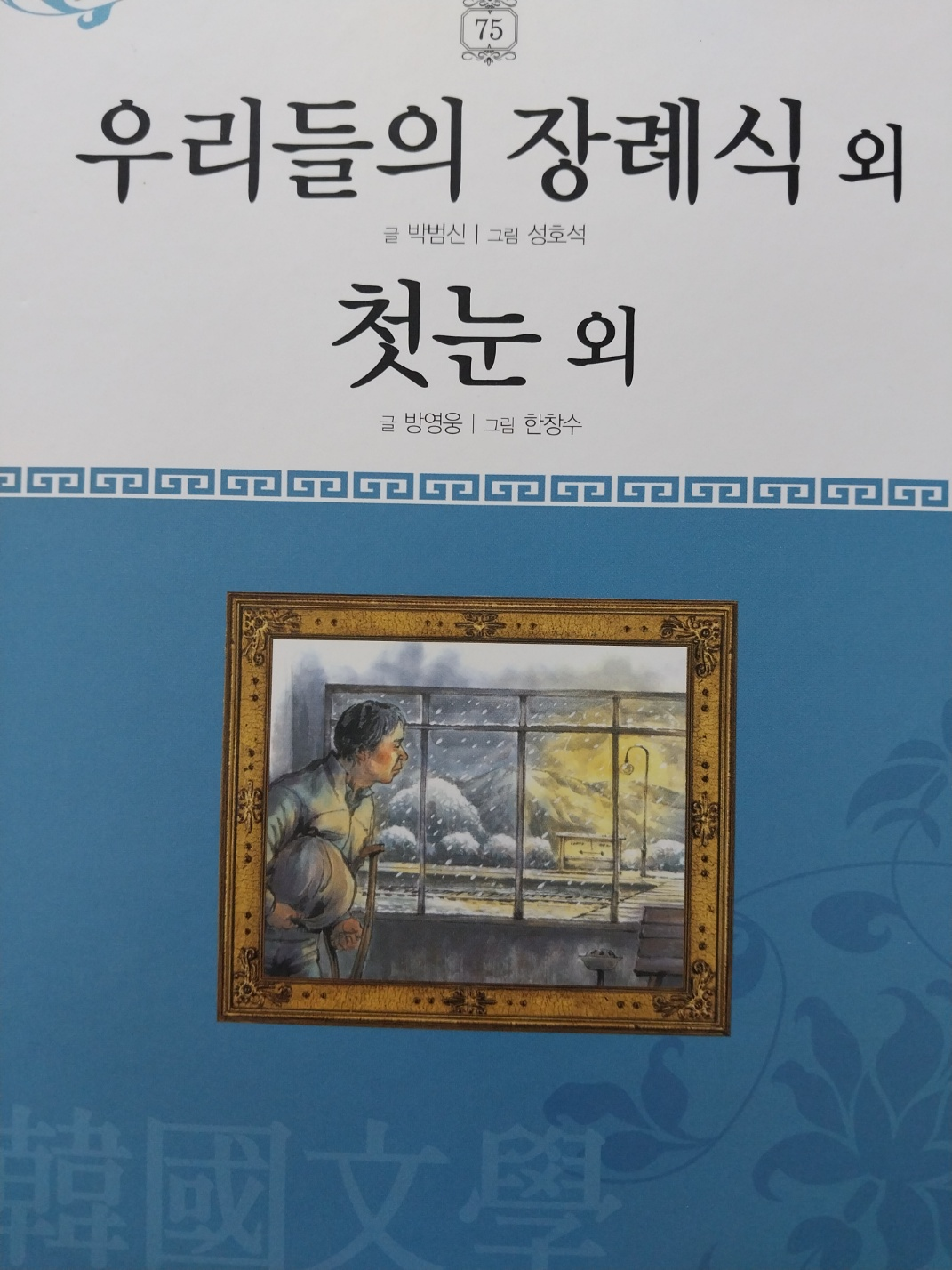
큰한국문학 413 (75권)
목차
박범신
우리들의 장례식
토끼와 잠수함
방영웅
첫눈
노새
..........................
방영웅 - 첫눈 (1972년)
"눈이 오는구나. 저게 첫눈이지?"
옛날 직업이 이발소 깎사였던 철순이는 유리문을 통하여 바깥을 내다보고 혼자 중얼거린다. 어느 사이 바깥이 그렇게 어두워졌는지 거리의 불빛이 환했다. 그 환한 불빛 속에서 희끗희끗하게 휘날리고 있는 눈발이 보인다. 그것들은 그렇게 휘날리다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녹아 없어지나 보았다.
"웬 놈의 사람이 그렇게 많지?"
꼬마 작부 미스 윤은 대폿집들이 양쪽으로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이쪽 골목이 참 한산하다는 듯이 한숨을 쉬어 대며 골목 어귀를 통하여 큰 거리를 내다보고 불평 비슷하게 중얼거린다. 눈발이 내리든지 말든지 그까짓 것은 관심이 없고, 서울엔 웬 놈의 사람들이 저렇게 많으냐 말이다. 뭐 해 처먹으러 몽땅 서울로 올라왔어? 서울만 살 수 있다데? 응 그래서....? 나두 그건 알 수 있어. 그럼 우리 집에두 좀 놀러와 줘야지. 좀 놀러와 다오. 왜 이렇게 손님이 없어. 꼬마 작부 미스 윤은 방금 미장원에 다녀온 제 머리가 무색한지 자꾸만 그것을 만져 대고 있다.
"사람이 많으면 어떻구 적으면 어때. 넌 걱정두 많다."
팔짱을 끼고 앉아 무슨 생각에 잠겨 있던 병숙이는 미스 윤에게 핀잔을 주고는 다시 연탄불이 들어 있는 드럼통의 아래쪽을 발로 툭툭 차 대며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른다. (p.89-90)
강원도댁은 지금도 시부모들이 살아 계시고 아이들이 둘이나 있다. 친정은 평창 읍내에 있고, 또 그의 시집도 그 이웃에 있었다. 그러나 4.19가 일어나던 그 이듬해 그의 시집은 화전을 하기 위하여 휴전선 근방의 어느 깊은 산골로 들어갔던 것이다. 땅은 마음대로 가꿀 수가 있었다. 그것을 가꾸는 데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직도 강원도댁의 시보모들은 오십 안팎의 나이여서 그곳에서 버티고 있으나 강원도댁의 남편은 너무 과로한 때문에 골병이 들어 삼 년 전에 죽어 버렸던 것이다.
사람이 이렇게 살기 어려운 데가 있을까? 강원도댁이 그것을 알았던 것은 화전을 시작하고 나서였다. 거기서 제일 가까운 읍내는 사십 리였다. 그것도 평지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눈이라도 쌓이는 겨울철이면 사람의 왕래가 딱 끊어지고 만다. 거기서 나는 것은 강냉이, 고구마, 수수, 메밀 이런 것들이었다. 그래도 강원도댁이 평창읍에서 살 때는 쌀밥을 먹고 살았다. 그러나 그곳에서 살고 있는 화전민들은 그것들을 쌀과 바꾸기 전에는 어림도 없었다.
쌀밥이 좋다. 화전민들이라고 그것을 모를 리 있을까? 아니 화전민이기 때문에 쌀밥이 더 먹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일 년 동안 지어 놓은 잡곡들을 읍내에 내다 팔 때는 똥값이었다. 예를 들어 강냉이나 고구마를 한 가마 정도 시장으로 내온다고 하자. 그것으로 바꿀 수 있는 쌀은 한 말 정도였다. 그러나 그 한 말의 쌀을 먹기 위하여 한 가마씩이나 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산길을 사오십 리 걸어야 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바보짓이었다. 왜 이 산골로 들어왔어? 정말 쌀밥이 먹고 싶다면 서울 가서 지게꾼이나 리어카꾼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 그들이 그 황무지로 들어갔던 것은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도시나 농촌에서 아무리 기를 쓰고 살아 봐도 그 생활의 터전이 잡히지 않더란 말이다. 골병이 들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땅을 까고 심어보자, 그리고 마음 놓고 배를 채워 보자 -.
그러나 그곳은 여러 말 할 것 없이 살 곳이 못 되었다. 그곳에서 살고 있는 스무 가호가 채 못 되는 화전민들은 해마다 한 집씩 두 집씩 어디로 떠나가는 것이다. 그들 자신이 갈아 놓았던 땅과 살던 집채를 누구에게 단돈 몇 푼을 받고 넘겨주려 하여도 작자가 나서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버려두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짐승은 아니다. 빌어를 먹더라도 부잣집 문간으로 들어가자.
강원도댁은 남편이 살았을 때부터 그곳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땅은 마음대로 가꿀 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었다. 일 년 내내 죽을 둥 살 둥 하여 농사를 지어 보면 그들이 배를 채울 수 있는 양식은 되었다. 쌀밥이나 그 이외의 잡것을 행여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망발이지만 -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땅이 얼마나 장한 땅이냐? 강원도댁의 시보무들이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있겠다는 것은 정말 그것 하나를 믿고서였다. 골병이 들어 죽어도 좋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땅에서 살겠다. 너희들이나 나가라...
그러나 사람이란 그런 것 하나만 믿고 살 수는 없나 보았다. 아이들도 쌀밥이 먹고 싶다고 늘 입버릇처럼 중얼거렸지만 강원도댁 역시 마찬가지였다. 일 년 내내 가꾼 옥수수나 고구마를 내다 팔아 쌀밥을 먹어 보는 것보다는 도시로 나가 식모살이를 하는 것이 얼마나 잘하는 일일까? 강원도댁은 남편이 살았을 때에도 얼마나 그것을 원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의 남편은 젊은 여편네가 행여 어떻게 될까 봐 그것을 영영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죽던 날 저녁에야 그것을 허락했다. (p.92-94)
(같이 읽으면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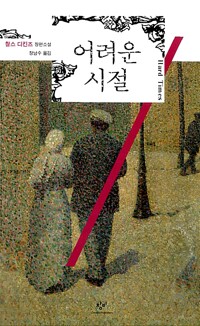
어려운 시절 - 찰스 디킨스 (장남수 옮김, 창비)
............................................................................
<작품 이해>
<첫눈>은 서울 어느 술집에서 하룻밤 사이에 벌어지는 한바탕의 도둑 동을 그리고 있다. 과부인 강원도댁은 이곳에서 주방일을 하며 때로는 매춘도 한다. 고향인 강원도 산골의 화전민 마을에는 시부모와 아이들이 있다. 손님이 유난히 없던 날 온 세 명의 젊은 손님들은 매상을 실컷 올려 주지만 다음 날 아침 술집에 있던 것들을 몽땅 훔쳐 달아난다. 이런 소동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댁은 여전히 아이들을 서울로 데려올 궁리를 한다. (p.176)
.........................................................................................................................................................................................................................................
방영웅(方榮雄, 1942년 7월 20일 ~2022년 8월 31일)
대한민국의 소설가

충청남도 예산군 출생으로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67년 고향 예산을 무대로 한 장편소설 《분례기》(糞禮記)를 《창작과비평》에 연재하면서 문단에 데뷔했다. 박복한 여인 '똥례'를 주인공으로 한 이 소설은 토속적이고 해학적인 작품 경향을 드러내는 데뷔작이면서 그의 대표작이기도 하다.
그의 작품은 치밀한 묘사력과 회화적인 구성력, 객관적인 필치로 한때는 허무주의적 경향을 띠었으나, 나중에는 주변 소시민의 일상생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부조리한 세태를 고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1969년 한국창작문학상을 수상했다. 주요 작품에 단편 〈바람〉, 〈첫눈〉, 〈무등산〉, 중편 《배우과 관객》, 《봄강》, 《문패와 가방》, 장편 《창공에 부는 바람》 등이 있으며, 창작집 《살아가는 이야기》를 간행하였다
.........................................

첫눈 - 방영웅 (창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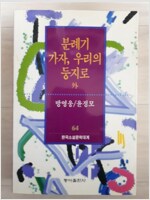
분례기 - 방영웅 (두산동아)

분례기 - 방영웅 (창비)
.........................................
'VII. 아동, 청소년 > 1. 한국 문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초정리 편지 -배유안 (창비) (0) | 2024.04.05 |
|---|---|
| 앞산도 첩첩하고 - 한승원 (한국헤르만헤세) (0) | 2023.07.26 |
| 토끼와 잠수함 - 박범신 (한국헤르만헤세) (0) | 2023.07.25 |
| 우리들의 장례식 - 박범신 (한국헤르만헤세) (0) | 2023.07.24 |
| 미지의 새 - 한수산 (한국헤르만헤세) (0) | 2023.07.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