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쓰메 소세키 소설 전집 3
나쓰메 소세키 - 풀베개 (1906년)
산길을 오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이지(理智)만을 따지면 타인과 충돌한다. 타인에게만 마음을 쓰면 자신의 발목을 잡힌다. 자신의 의지만 주장하면 옹색해진다. 여하튼 인간 세상은 살기 힘들다.
살기 힘든 것이 심해지면 살기 편한 곳으로 옮겨 가고 싶어진다. 어디로 옮겨 가도 살기 힘들다는 깨달았을 때 시가 태어나고 그림이 생겨난다.
인간세상을 만든 것은 신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다. 역시 가까운 이웃들과 오가는 보통 사람들이다. 보통 사람들이 만든 인간 세상이 살기 힘들다고 해서 옮겨 갈 나라는 없을 것이다. 있다면 사람도 아닌 사람의 나라일 뿐이다. 사람도 아닌 사람의 나라는 인간 세상보다 더욱 살기 힘들 것이다.
옮겨 갈 수도 없는 세상이 살기 힘들다면, 살기 힘든 곳을 어느 정도 편하게 만들어 짧은 순간만이라도 짧은 목숨이 살기 좋게 해야 한다. 이에 시인이라는 천직이 생기고, 화가라는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예술을 하는 모든 이는 인간 세상을 느긋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까닭에 소중하다.
살기 힘든 세상에서 살기 힘들게 하는 근심을 없애고, 살기 힘든 세계를 눈앞에 묘사하는 것이 시고 그림이다. 또는 음악이고 조각이다. 자세히 말하자면 묘사하지 않아도 좋다. 그저 직접 보기만 하면 거기에서 시도 생기고 노래도 솟아난다. 착상을 종이에 옮겨놓지 않아도 옥이나 금속이 스치는 소리는 가슴속에서 일어난다. 이젤을 향해 색을 칠하지 않아도 오색의 찬란함은 스스로 심안에 비친다. 그저 자신이 사는 세상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고 혼탁한 속세를 마음의 카메라에 맑고 밝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된다. 이런 까닭에 무성의 시인에게는 시 한 구절 없고 무색의 화가에게는 아주 작은 그림 하나 없어도 이렇게 인간 세상을 깨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번뇌를 해탈하는 점에서, 이렇게 청정한 세계에 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이 특별하고 유일한 천지를 세울 수 있는 점에서, 사리사욕의 굴레를 없앤다는 점에서 부잣집 자식보다도, 군주보다도, 속계의 모든 총아보다도 행복하다.
이 세상에 살게 된 지 20년이 되어서야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임을 알았다. 25년이 되어서야 명암이 표리인 것처럼 해가 드는 곳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생긴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른이 된 오늘날에는 이렇게 생각한다. 기쁨이 깊을 때 근심 또한 깊고, 즐거움이 클수록 괴로움도 크다. 이를 분리하려고 하면 살아갈 수가 없다. 치워버리려고 하면 생활이 되지 않는다. 돈은 중요하다. 중요한 것이 늘어나면 잠자는 동안에도 걱정하게 될 것이다. 사랑은 기쁘다. 기쁜 사랑이 쌓이면 사랑을 하지 않던 옛날이 오히려 그리워질 것이다. 각료의 어깨는 수백만 명의 다리를 지탱하고 있다. 등에는 무거운 천하가 업혀 있다. 맛있는 것도 먹지 못하면 분하다. 조금 먹으면 성에 차지 않는다. 마음껏 먹으면 그다음이 불쾌하다. (p.15-17)
홀연 발밑에서 종달새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골짜기를 내려다보았으나 어디서 우는지 자취도 보이지 않는다. 그저 울음소리만 또렷하게 들려올 뿐이다. 쉬지도 않고 부지런히 울고 있다. 사방 수십 리의 공기가 온통 벼룩에 물려 더 이상 배겨내지 못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 그 새가 우는 소리에는 잠깐의 여유도 없다. 화창한 봄날을 울며 보내고 울며 지새고 또 울며 지내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어디까지고 올라가고 언제까지고 올라간다. 종달새는 틀림없이 구름 속에서 죽을 것이다. 게속해서 올라간 끝에 구름속으로 흘러들어 떠돌다가 형체는 사라져 보이지 않고 그저 울음소리만이 하늘 속에 남는 것인지도 모른다.
바위 모서리를 에리하게 돌아, 맹인이라면 곤두박질치며 떨어질 만한 곳을 오른쪽으로 아슬아슬하게 꺾어 옆을 내려다보니 온통 유채꽃이다. 종달새가 저곳으로 떨어지는 걸까, 하고 생각했다. 아니, 그 황금 들판에서 날아오른 것일까, 하고 생각했다. 그다음에는 떨어지는 종달새와 날아오르는 종달새가 열십자로 엇갈리는 걸까, 하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떨어질 때도 날아오를 때도 또 열십자로 엇갈릴 때도 힘차게 계속 울어댈 것이라고 생각했다.
봄에는 졸린다. 고양이는 쥐 잡는 것을 잊고, 사람은 빚이 있다는 걸 잊는다. 때로는 자신의 혼이 있는 곳초차 잊고 당황한다. 다만 멀리 유채꽃을 바라보았을 때는 눈이 번쩍 뜨인다. 종달새 소리를 들었을 때 혼이 있는 곳이 분명해진다. 종달새는 입으로 우는 것이 아니라 혼 전체로 운다. 혼의 활동이 소리로 나타난 것 중에서 그토록 힘찬 것은 없다. 아아, 유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유쾌해지는 것이 시다.
문득 셸리의 시 <종달새에게>가 떠올라 암송하고 있는 구절만 입속으로 외어보았으나 기억하고 있는 건 두세 구절에 지나지 않았다.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없는 것을 갖고 싶어 하네
진지한 웃음이라 해도
거기에 고통 있느니
가장 감미로운 노래에는 가장 슬픈 생각이 깃들어 있음을 알라.
We look before and after,
And pine for what is not:
Our sincerest laughter
With some pain is fraught;
Our sweetest songs are those that tell of saddest thought. (p.18-19)
(같이 읽으면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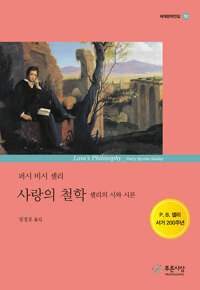
사랑의 철학 - 셸리 (정정호 옮김, 푸른 사상)
<참고>
퍼시 비시 셸리(Percy Bysshe Shelley, 영국 1792~1822)
종달새에게 (To a Sky-Lark, 1820년)
Hail to thee, blithe Spirit! 반갑구나, 너 쾌활한 정령이여!
Bird thou never wert, 너 새는 아니리라,
That from Heaven, or near it, 하늘과 그 근방에서
Pourest thy full heart 가슴 넘쳐흐르는 감정을
In profuse strains of unpremeditated art. 타고난 솜씨의 노랫가락으로 쏟아 내는 너는.
Higher still and higher 지상으로부터 더욱더 높게
From the earth thou springest 너는 솟구쳐 올라가니
Like a cloud of fire; 불처럼 솟아오르는 한 점의 구름이랄까.
The blue deep thou wingest, 너는 창공에서 비상하니
And singing still dost soar, and soaring ever singest. 항상 노래하며 날아오르고 항상 날아오르며 노래하는구나.
In the golden lightning 진 해의
Of the sunken sun, 금빛 찬란한 광휘 속에서
O'er which clouds are bright'ning. 구름은 반짝이고
Thou dost float and run; 너는 그곳에 떠서 달리는구나,
Like an unbodied joy whose race is just begun. 치닫기 시작한 환희의 혼처럼 지칠 줄 모르고.
The pale purple even 너 날아가는 주위에선
Melts around thy flight; 연보랏빛 저녁 녹아 가고,
Like a star of Heaven, 대낮의
In the broad daylight 하늘의 별처럼
Thou art unseen, but yet I hear thy shrill delight, 너 보이지 않으나 귀 찢는 네 환희 들리는구나.
Keen as are the arrows 그 환희는 새벽별의 광망(光芒),
Of that silver sphere, 비너스의 화살처럼 날카롭구나.
Whose intense lamp narrows 허나 그 은빛 천체의 강렬한 등불도
In the white dawn clear 훤하게 동트는 맑은 하늘에서는 가물거리며
Until we hardly see—we feel that it is there. 거의 보이지 않고-오직 거기 있다는 것을 느낄 뿐.
All the earth and air 온 대지와 하늘에
With thy voice is loud, 네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니
As, when night is bare, 마치 밤 하늘은 맑은데
From one lonely cloud 외로운 한 점의 구름에서
The moon rains out her beams, and Heaven is overflowed. 달빛 쏟아져 하늘에 넘쳐 흐르듯.
What thou art we know not 너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모른다.
What is most like thee? 무엇이 가장 너 같다고 할까?
From rainbow clouds there flow not 무지개 구름에서도
Drops so bright to see 네게서 쏟아지는 음률의 비만큼
As from thy presence showers a rain of melody. 보기에 찬란한 빗방울은 흘러내리지 않는구나.
Like a Poet hidden 예컨대 너는 휘황한 상념의 광휘 속에서 숨어 보이지 않는
In the light of thought, 시인이랄까.
Singing hymns unbidden, 자발적으로 찬가 불러
Till the world is wrought 온 세상 마침내 가락 맞추어
To sympathy with hopes and fears it heeded not: 못 느꼈던 희망과 공포를 공감케 하는.
Like a high-born maiden 예컨대 너는 궁전 같은 고루(高樓)에 있는,
In a palace-tower, 고귀한 가문의 아가씨랄까.
Soothing her love-laden 홀로 있는 시간에
Soul in secret hour 온 방 넘쳐흐르는
With music sweet as love, which overflows her bower: 사랑처럼 달콤한 음악으로써 사랑으로 수심 찬 마음 달래는.
Like a glow-worm golden 예컨대 너는 이슬 맺힌 골짜기의
In a dell of dew, 금빛 찬란한 개똥벌레랄까.
Scattering unbeholden 보는 이 없는데
Its aereal hue 영묘한 빛깔 뿌려대는.
Among the flowers and grass, which screen it from the view! 그러나 그 빛깔은 꽃과 풀에 보이지 않는구나!
Like a rose embowered 예컨대 너는 푸른 제 잎들을
In its own green leaves, 암자로 하여 들어앉은 장미꽃이랄까?
By warm winds deflowered, 훈풍에 향내 빼앗기나
Till the scent it gives 그것이 내는 너무도 달콤한 향내로
Makes faint with too much sweet those heavy-winged thieves: 날개 무거워진 저 도둑, 바람의 넋을 잃게 하는.
Sound of vernal showers 젖어서 반짝이는 풀,
On the twinkling grass, 비 맞아 깨어난 꽃들,
Rain-awakened flowers, 이들 위에 내리는 봄비 소리,
All that ever was 즐겁고 맑고 싱싱했던
Joyous, and clear, and fresh, thy music doth surpass: 모든 것도 네 음악 따르지는 못하는구나
Teach us, Sprite or Bird, 우리에게 가르쳐다오, 정령인지 새인지 모르는 자여,
What sweet thoughts are thine: 어떤 감미로운 상념이 네 것인가를.
I have never hear 사랑의 예찬이나 술의 예찬도
Praise of love or wine 그처럼 신성한 황홀을
That panted forth a flood of rapture so divine. 숨차게 쏟아 내는 것 듣지 못했구나.
Chorus Hymeneal, 축혼(祝婚)의 합창
Or triumphal chant, 혹은 개선의 노래도
Matched with thine would be all 네 노래에 비기면
But an empty vaunt, 어딘지 모르게 비어 있는
A thing wherein we feel there is some hidden want. 공허한 허풍일 뿐이리라.
What objects are the fountains 네 행복한 가락의 원천은
Of thy happy strain? 어떤 것들일까?
What fields, or waves, or mountains? 그 어떤 벌들, 바다들, 산들일까?
What shapes of sky or plain? 그 어떤 모양의 하늘이나 들판일까?
What love of thine own kind? what ignorance of pain? 네 동류(同類)에 대한 그 어떤 사랑, 고통 모르는 그 어떤 상태일까?
With thy clear keen joyance 네 맑고 날카로운 환희와 함께
Languor cannot be: 시름은 있을 수 없으니
Shadow of annoyance 괴로움의 그림자도 네 근처엔
Never came near thee: 오지 못한다.
Thou lovest—but ne'er knew love's sad satiety. 너 사랑한다- 허나 사랑의 슬픈 권태는 결코 모르고
Waking or asleep, 자나 깨나 너는 생각하리라,
Thou of death must deem 죽음에 대하여,
Things more true and deep 우리들 인간이 상상하는 것보다
Than we mortals dream, 더욱 진실하고 깊은 것을.
Or how could thy notes flow in such a crystal stream? 아니면 네 가락이 어찌 청징(淸澄)한 샘이 되어 흘러 나오랴?
We look before and after, 우리는 앞뒤를 바라보며
And pine for what is not: 지금 없는 것을 그리워하는 법.
Our sincerest laughter 진심의 웃음에도
With some pain is fraught; 어떤 괴로움은 차 있고
Our sweetest songs are those that tell of saddest thought. 가장 감미로운 노래는 가장 슬픈 생각을 전하는 노래.
Yet if we could scorn 미움과 자존심의 공포를
Hate, and pride, and fear; 우리가 만약 비웃을 수 있다면,
If we were things born 우리가 만약 숙명적으로
Not to shed a tear, 눈물 안 흘리는 존재라면
I know not how thy joy we ever should come near. 우리가 어찌 네 기쁨의 근처에 갈 수 있으랴.
Better than all measures 즐거운 소리의
Of delightful sound, 모든 음악보다
Better than all treasures 책에서 발견되는
That in books are found, 모든 보배보다
Thy skill to poet were, thou scorner of the ground! 시인에게는 네 노래 솜씨 더 좋으리라, 너 땅을 멸시하는 자여!
Teach me half the gladness 네 머리가 알고 있을
That thy brain must know, 기쁨의 절반만이라도 가르쳐다오,
Such harmonious madness 그러면 해화(諧和)의 신운(神韻)이
From my lips would flow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리라
The World should listen then - as I am listening now 그때는 세상도 들으리니 - 지금 나 네 노래 듣고 있듯
.....................................................................................................................................................................................
시인에게 시림은 따르기 마련인 것인지도 모르지만, 저 종달새 소리를 듣는 마음에는 티끌만 한 고통도 없다. 유채꽃을 봐도 그저 기뻐 마음이 설렐 뿐이다. 민들레도 그대로고, 벚꽃도....벚꽃은 어느덧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산속에 들어와 자연의 풍물을 접하면,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재미있다. 재미만 있을 뿐 별다른 괴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는 일이라면 다리가 아프고 맛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괴로움이 없는 것은 왜일까. 그저 이 경치를 한 폭의 그림으로 보고 한 편의 시로 읽기 때문이다. 그림이고 시인 이상 땅을 얻어 개척할 마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철도를 놓아 한몫 잡자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 그저 이 경치가, 요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벌충해 주는 것도 아닌 이 경치가 경치만으로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있으니 고생도, 걱정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연의 힘은 소중하다. 우리의 성정을 순간적으로 도야하여 순수한 시경에 들게 하는 것은 자연이다.
사랑은 아름다울 것이고 효도도 아름다울 것이며 충군애국도 훌륭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그 일에 당면하면 이해의 회오리바람에 휩쓸려 아름다운 일에도, 훌륭한 일에도 눈이 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신도 시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알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는 제삼자의 위치에 서야 한다. 제삼자의 위치에 서야 연극을 봐도 재미있다. 소설을 읽어도 재미있다. 자신의 이해는 문제 삼지 않는다. 보거나 읽는 동안만은 시인이다. (p.20-21)
(같이 읽으면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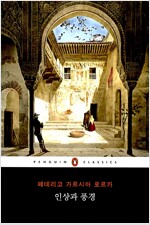
인상과 풍경 - 로르카 (엄지영 옮김, 펭귄클래식)
..............................................................................
괴로워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떠들어대기도 하고 울어대기도 하는 것은 인간 세상에 으레 있는 일이다. 나도 30년간 줄곧 그렇게 해와서 이제 아주 신물이 난다. 신물이 나는데도 또 연극이나 소설로 같은 자극을 되풀이해서는 큰일이다. 내가 바라는 시는 그런 세속적인 인정을 고무하는 것이 아니다. 속된 생각을 버리고 잠시라도 속세를 떠난 마음이 될 수 있는 시다. 아무리 걸작이라도 인정을 벗어난 연극은 없고, 시비를 초월한 소설은 드물 것이다. 어디까지나 속세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그것들의 특색이다. 특히 서양의 시는 인간사가 근본이 되기 때문에 이른바 순수한 시가도 그 지경을 해탈할 줄 모른다. 어디까지나 동정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자유라든가 속세의 상점에 있는 것만으로 일을 처리한다. 아무리 시적이라 해도 땅 위를 뛰어다니고 돈 계산을 잊어버릴 틈이 없다. 셸리가 종달새 소리를 듣고 탄식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기쁘게도 동양의 시가에는 그것을 해탈한 것이 있다.
동쪽 울타리 아래서 국화를 꺾다 보니,
한가로이 남산이 들어오네
採菊東籬下(채국동리하)
悠然見南山(유연견남산)
홀로 그윽한 대숲에 앉아
거문고 타다 다시 길게 휘파람 부네
깊은 숲이라 남들은 알지 못하고
밝은 달만 찾아와 서로를 비추네
獨坐幽篁裡(독좌유황리)
彈琴復長嘯(탄금부장소)
深林人不知(심림인부지)
明月來相照(명월내상조) (p.21-22)
<참고>
도연명 (陶淵明, 365년 ~ 427년)
飮酒(음주) 5
結廬在人境(결려재인경) 변두리에 오두막 짓고 사니
而無車馬喧(이무거마훤) 날 찾는 시끄러운 수레 소리 하나 없네
問君何能爾(문군하능이) 그대에게 묻노니 어찌 이럴 수 있는가
心遠地自偏(심원지자편) 마음이 욕심에서 멀어지니 사는 곳도 외지다네
採菊東籬下(채국동리하) 동쪽 울타리 아래 국화꽃 따며
悠然見南山(유연견남산) 유유히 남산을 바라보네
山氣日夕佳(산기일석가) 산기운은 저녁 햇빛에 더욱 아름답고
飛鳥相與還(비조상여환) 나는 새도 더불어 둥지로 돌아오네
此間有眞意(차간유진의) : 이런 속에 참다운 삶의 뜻이 있으니
欲辨已忘言(욕변이망언) : 말하려해도 이미 할 말을 잊었다네
.......................................................................................................
왕유(王維;699-761)
竹里館(죽리관)
獨坐幽篁裡(독좌유황리) 홀로 그윽한 대숲에 앉아서
彈琴復長嘯(탄금부장소) 거문고 뜯고 다시 길게 휘파람 분다.
深林人不知(심림인부지) 깊은 숲이라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明月來相照(명월내상조) 밝은 달이 찾아와 비춰준다.
...........................................................................................
(같이 읽으면 좋은 책)

도연명 전집 - 도연명 (이치수 옮김, 문학과지성사)

신역 왕유 - 왕유 (진기환 옮김, 명문당)
....................................................................
20세기에 수면이 필요하다면, 20세기에 세속을 떠난 이 시의 정취는 소중하다. 애석하게도 오늘날 시를 짓는 사람도, 시를 읽는 사람도 다들 서양인에게 물들어버려 굳이 한가한 조각배를 띄워 이 도원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없는 듯하다. 나는 원래 시인이 직업이 아니니 왕유나 도연명의 경지를 요즘 세상에 널리 알릴 마음은 전혀 없다. 그저 나에게는 이런 감흥이 연회보다도 무도회보다도 약이 되는 것 같다. <파우스트>보다도 <햄릿>보다도 고맙게 여겨진다. 이렇게 홀로 화구 상자와 접이식 삼각의자를 메고 봄의 산길을 어슬렁어슬렁 걷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도연명과 왕유의 시경을 자연에서 직접 흡수하여 잠시라도 비인정(非人情, 의리나 인정 따위에 얽매이지 않는 일)의 천지를 소요하고 싶은 것이다. 일종의 취흥이다.
물론 인간의 한 분자이니 아무리 좋아도 비인정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도연명도 내내 남산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고, 왕유도 기꺼이 대숲에서 모기장을 치지 않고 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들 역시 남은 국화는 꽃집에 팔았을 것이고, 남은 죽순은 채소 가게에 넘겼을 것이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다. 종달새와 유채꽃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산속에서 노숙할 만큼 비인정이 심하지는 않다. 이런 곳에서도 사람을 만난다. 옷 뒷자락을 띠 안으로 집어넣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사람이나 붉은 속치마를 입은 처자, 때로는 사람보다 얼굴이 긴 말까지 만난다. 백만 그루의 노송나무에 둘러싸이고 해면을 넘어 수십 미터 높이의 공기를 마시거나 뱉거나 해도 사람 냄새는 좀처럼 빠지지 않는다. 그건 고사하고 산을 넘어 머물 오늘 밤의 숙소는 나코이의 온천정이다.
다만 사물은 보기에 따라 뭐든지 될 수 있다. (P.23-24)
(같이 읽으면 좋은 책)

파우스트 - 괴테 (정서웅 옮김, 민음사)

햄릿 - 셰익스피어 (최종철 옮김)
...................................................................................
쌀겨처럼 보인 빗방울은 점차 굵고 길어져 지금은 한 줄기마다 바람에 휩싸이는 모습까지 눈에 들어온다. 하오리는 진작 다 젖었고 속옷에 스며든 물이 몸의 온기로 미지근하게 느껴진다. 불쾌한 느낌이어서 모자를 푹 눌러쓰고 성큼성큼 걷는다.
흐릿한 먹빛 세계를, 몇 개의 은색 화살이 비스듬히 달리는 가운데 흠뻑 젖은 채 마냥 걸어가는 나를, 나 아닌 사람의 모습이라 생각하면 시가 되기도 하고 하이쿠가 되기도 한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완전히 잊고 순수 객관에 눈을 줄 때 비로소 나는 그림 속의 인물로서 자연의 경치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다만 내리는 비가 괴롭고 내딛는 발이 피곤하다고 마음을 쓰는 순간, 나는 이미 시 속의 사람도 아니고 그림 속의 사람도 아니다. 여전히 시정의 풋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구름이나 연기가 하늘을 날아가는 정취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꽃이 지고 새가 우는 흥취도 마음에 일지 않는다. 혼자 쓸쓸하게 봄날의 산을 걷는 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더욱 알 수 없다. 처음에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걸었다. 나중에는 그저 발등만 쳐다보고 걸었다. 종국에는 어깨를 움츠리고 쭈뼛쭈뼛 걸었다. 비는 눈에 보이는 모든 나뭇가지들을 흔들며 사방에서 외로운 길손에게 들이쳤다. 비인정이 좀 지나친 것 같다. (P.27)
(같이 읽으면 좋은 책)

하이쿠와 우키요에, 그리고 에도 시절 - 마쓰오 바쇼, 요사 부손, 고바야시 잇사 (김향 옮김, 다빈치)
............................................................................................................................................................
봄바람이여, 이젠의 귓가에 말방울 소리 (p.33)
<참고>
히로세 이젠 ( 広瀬惟然, 1648 - 1771)
에도 시대의 하이쿠 작가
(같이 읽으면 좋은 책)

봄에는 와카를 가을에는 하이쿠를 기억하다 - 한국일어일문학회 (글로세움)
.........................................................................................................................
마부의 노래, 스즈카 고개 넘으니 봄비
마부의 노래여, 백발도 물들이지 못하고 저무는 봄 (p.34)
<참고>
마사오카 시키(正岡 子規, 1867년 10월 14일 ~ 1902년 9월 19일)
일본의 시인, 일본 국어학 연구가이다.
(같이 읽으면 좋은 책)

모노가타리에서 하이쿠까지 - 한국일어일문학회 (글로세움)
................................................................................................
꽃필 무렵을 넘어, 고귀한 말에 탄 신부 (p.36)
거울 앞에 설 때만 자신의 머리가 하얗게 센 것을 한탄하는 이는 행복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다. 손을 꼽아보고서야 5년의 세월이 바퀴 구드릇 빠르게 흘렀음을 깨닫는 할멈은 오히려 신선에 가까운 인가일 것이다. (p.37)
가을이 되면 그대도 억새꽃에 맺힌 이슬처럼 덧없이 사라져버릴 것만 같습니다. (p.38)
(같이 읽으면 좋은 책)

만요슈 선집 - 사이토 모키치 (김수희 옮김, AK(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
죽영불계진부동(竹影拂階塵不動) (p.43)
(같이 읽으면 좋은 책)

채근담 - 홍자성 (안대회 옮김, 민음사)
죽영불계진부동 (竹影拂階塵不動)
월천담저수무흔 (月穿潭底水無痕)
대나무 그림자 섬돌을 쓸어도 먼지 하나 일지 않는다
달빛이 연못 밑을 뚫어도 물 위에 흔적조차 없다
......................................................................................
두려운 것도 그저 두려운 것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면 시가 된다. 무서운 것도 자신을 떠나 그저 단독으로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림이 된다. 실연이 예술의 제재가 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실연의 고통을 잊고 그 부드러운 면이나 동정이 깃드는 면, 수심 어린 면, 한 발 더 나아가 말하자면 실연의 고통 그 자체가 흘러넘치는 면을 단지 객관적으로 눈앞에 더올리는 데서 문학과 미술의 재료가 된다. 이 세상에 있지도 않은 실연을 창조하여 스스로 억지로 번민하고 쾌락을 탐하는 자가 있다. 보통 사람은 이를 평하여 어리석다고 하고 미친 짓이라고 한다. 하지만 스스로 불행의 윤곽을 그리고 기꺼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풍경을 그려 넣고 자신만의 별세계에서 기뻐하는 것과 그 예술적 입각점을 얻은 점에서는 완전히 같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서 세상의 허다한 예술가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보다 어리석다. 미치광이다. 우리는 도보 여행을 하는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힘들다, 힘들다, 고 불평을 늘어놓지만 다른 사람에게 예전에 했던 여행을 자랑할 때는 불평스러운 것은 조금도 보여주지 않는다. 재미있었던 일, 유쾌했던 일은 물론이고 옛날 불평했던 일까지 재잘거리며 득의양양한 표정을 짓는다. 이는 굳이 스스로를 속이거나 남을 속이려는 마음에석 아니다.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보통 사람의 마음이고 지난 여행을 이야기할 때는 이미 시인의 태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네모난 세계에서 상식이라는 이름이 붙은 한 모서리를 마멸하여 세모 속에 사는 이를 예술가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그렇기에 자연이건 사람의 일이건 속인들이 난감해하며 가까이하지 않으려는 데서 예술가는 무수한 임랑(琳琅, 아름다운 구슬)을 보고 최상의 보로(寶璐, 아름다운 구슬)를 안다. 이를 속되게 일러 미화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은 미화도 뭐도 아니다. 찬란한 광채는 아주 옛날부터 현상 세계에 실재하고 있다. 다만 눈그늘에서 꽃이 난무하는 환각이 보이는 것처럼 번뇌로 인해 깨달음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속세의 규범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우리를 압박하는 일이 순간순간 간절하기 때문에, 터너가 기차를 그릴 때까지는 기차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고, 오쿄가 유령을 그릴 때까지는 유령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고 지나친 것이다. (p.47-48)
(같이 읽으면 좋은 책)

초사 - 굴원 (권용호 옮김, 글항아리)
..............................................................
어떻게 하면 시적인 입각점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자신의 느낌 자체를 자기 앞에 놓고 그 느낌에서 한발 물러나, 있는 그대로 차분하게 남처럼 이를 검사할 여지만 만들면 되는 일이다. 시인이란 자신의 시체를 자신이 해부하고 그 병세를 천하에 발표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든지 닥치는 대로 열일곱 자로 정리해보는 것이다. 열일곱 자는 시형으로서는 가장 간편하기에 세수를 할 때도 뒷간에 있을 때도 전차에 탔을 때도 쉽게 만들 수 있다. 열일곱 자가 쉽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간단히 시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시인이 된다는 것은 일종의 깨달음이니 간편하다고 해서 모멸할 필요는 없다. 간편하면 할수록 공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존중할 만한 일일 것이다. (p.49)
(같이 읽으면 좋은 책)

하이쿠 열일곱자로 된 시 - 요사 부손 (최충희 옮김, 박이정)
....................................................................................................
해당화에 맺힌 이슬을 떨어뜨리네, 미치광이
꽃 그림자, 몽롱한 여자 그림자인가
정일품, 여자로 변신했나 으스름달 (P.50)
봄밤의 별 떨어져, 한밤중의 비녀이런가
봄밤의 구름에 적시누나, 감고 난 풀어진 머리
봄이여, 오늘밤 노래하는 모습
해당화의 정령이 나타나는 달밤이런가
노랫소리, 그때그때 달빛 아래 봄을 여기저기로
생각을 멈추고, 깊어가는 봄밤 혼자이런가 (p.51)
사람이 가진 것 중에 눈동자보다 좋은 것이 없다 (p.63)
(같이 읽으면 좋은 책)

신완역 한글 맹자 - 맹자 (차주환 옮김, 명문당)
離婁章句 上 (이루장구 상)
孟子曰, 存乎人者는 莫良於眸子니라 眸子不能掩其惡하나니 胸中이 正則眸子瞭焉하고 胸中이 不正則眸子眊焉이니라
맹자왈, 존호인자 막량어모자 모자불능엄기악 흉중 정즉모자료언 흉중 부정즉모자모언
聽其言也요 觀其眸子면 人焉廋哉리오.
청기언야 관기모자 인언수재
<맹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람의 심중의 선악을 살펴 알게 해주는 것으로는 그 사람의 눈동자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눈동자는 그 주인공의 심중에 들어 있는 악을 엄폐하지 못한다. 마음속이 올바르면 그 사람의 눈동자가 맑다. 마음속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눈동자가 흐리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눈동자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심중의 선악을 어찌 감춰 내랴! 감춰 내지 못한다.">
........................................................................
"이곳과 도시 중에서 어디가 좋습니까?"
"같죠, 뭐."
"이렇게 조용한 데가 오히려 마음 편하지요?"
"마음 편한 것도 불편한 것도, 세상일이라는 게 다 마음먹기 달린거 아닌가요? 벼룩 나라가 싫어졌다고 모기 나라로 가봐야 별수 없겠지요.'
"벼룩도 모기도 없는 나라로 가면 되지 않나요?"
"그런 나라가 있다면 어디 한 번 보여주세요. 보여줘봐요." (p.69)
거울이라는 물건은 평평하게 생겨먹어 사람의 얼굴을 원만하게 비춰주지 않으면 명분이 서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거울을 걸어두고 그것을 보라고 강요한다면, 강요하는 사람은 서툰 사진사와 마찬가지로 들여다보는 사람의 용모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허영심을 꺾는 것이 수양의 한 방편일지 모르지만, 일부러 원래 모습보다 못한 얼굴을 보여주고 이것이 당신이라며 모욕할 것까지는 없을 것이다. 지금 내가 어쩔 수 없이 국 참고 마주하고 있는 거울은 확실히 조금 전부터 나를 모욕하고 있다. 오른쪽을 보면 얼굴 전체가 코가 된다. 왼쪽을 내밀면 입이 귀밑까지 찢어진다. 올려다보면 두꺼비를 정면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평평하게 찌부러지고, 살짝 허리를 굽히면 후쿠로쿠주가 점지해준 아이처럼 머리가 불룩하게 올라간다. 적어도 이 거울을 보는 동안에는 혼자 여러 가지 요괴를 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얼굴이 예술적으로 비치지 않는 것은 일단 참는다고 해도 거울의 구조나 색조, 은종이가 벗겨져 광선이 그대로 통과하는 상황을 종합해서 생각하면 이 거울 자체가 더없이 추물이다. 교양 없는 사람으로부터 욕을 얻어먹을 때 욕을 먹는 것 자체는 아무렇지 않지만, 그 교양 없는 사람 면전에서 일상생활을 해야 한다면 누구나 불쾌할 것이다. (p.74)
공허한 집을 공허하게 지나는 봄바람이 빠져나가는 것은, 맞이하는 사람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거부하는 자에 대한 앙갚음도 아니다. 스스로 왔다가 스스로 사라지는 공평한 우주의 마음이다. 손바닥으로 턱을 괴고 있는 내 마음도 내가 묵고 있는 방처럼 공허하니 봄바람은 부르지 않아도 사양치 않고 빠져나갈 것이다.
밟는 것이 땅이라고 생각하니 갈라지지나 않을까 걱정도 된다.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 하늘이라는 것을 알기에 번개가 관자놀이에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움도 생긴다. 남과 다투지 않으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속세가 재촉하기 때문에 번뇌의 고통을 면치 못한다. 동서가 있는 천지에 살며 이해(利害)의 밧줄을 매야 하는 몸에는 사실 연애는 부질없는 짓이다. 눈에 보이는 부(富)는 흙이다. 잡는 명(名)과 빼앗는 예(譽)는, 교활한 벌이 달콤하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침을 남겨두고 가는 꿀 같은 것이리라. 이른바 즐거움은 사물에 집착하는 데서 생기기 때문에 온갖 고통을 포함한다. 다만 시인과 화객이 있어 어디까지나 이해득실이 대립하는 이 세계의 정화를 음미하고 철두철미하게 맑은 것을 안다. 안개를 반찬으로 삼고 이슬을 마시며 조석의 풍광을 품평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후회하지 않는다. 그들의 즐거움은 사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다. 동화하여 그 사물이 되는 것이다. 온전히 그 사물이 되었을 때 나를 수립할 여지는 망망한 대지를 다 뒤져도 발견할 수 없다. 무의미한 것을 자유롭게 내던지고 해진 갓 안에 한없이 상쾌한 여름 바람을 담는다. 쓸데없이 이런 처지를 생각해내는 것은 구태여 돈 냄새에 찌든 시정의 속물을 위협하여 기꺼이 우월감을 가지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저 그사이 복음을 펴서 인연이 있는 중생을 손짓하여 부를 뿐이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시의 세계나 그림의 세게도 누구에게나 갖춰져 있는 길이다. 모든 손가락을 꼽아 나이를 헤아리며 백발에 신음하는 무리라 하더라도 평생을 돌아보고 지나온 내력의 파동을 순간적으로 점검할 때, 한때 더럽혀진 몸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와 자신을 잊고 박수의 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으리라. 그럴 수 없다면 사는 보람이 없는 남자다.
하지만 한 가지 일에 들어맞고 한 가지 사물로 화하는 것만이 시인의 감흥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떤 때는 한 피의 꽃이 되고, 어떤 때는 한 쌍의 나비가 되고, 어떤 때는 워즈워스처럼 한 무더기의 수선화가 되어 마음을 비바람 속에 교란시키는 일도 있겠지만, 뭔지도 모르는 사방의 풍광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자신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명료하게 의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은 천지의 밝게 빛나는 대기를 접한다고 말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현 없는 거문고를 마음으로 듣는다고 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알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무한한 지역을 배회하며 아득한 곳을 방황한다고 형용할지도 모른다. 뭐라고 하든 다 그 사람의 자유다. 열대산 목재로 만든 책상에 기대어 있는 나의 멍한 심리 상태가 바로 그것이다.
나는 확실히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또 확실히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다. 내 의식의 무대에 뚜렷한 색채를 띠고 움직이는 것이 없으니 나는 어떤 사물에 동화했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고 있다. 세상 안에서도 움직이지 않고 세상 밖에서도 움직이지 않는다.그냥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꽃에 움직이지도 않고 새에 움직이지도 않으며 인간에 대해 움직이지도 않고 그저 황홀하게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굳이 설명하라면 내 마음은 오직 봄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온갖 봄의 빛깔, 봄의 바람, 봄의 사물, 봄의 소리를 다져 넣어 굳혀 영약을 만들고 그것을 봉래산의 영묘한 물에 녹여 도원의 햇빛으로 증발시킨 정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공으로 스며들어 마음이 지각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포화되고 말았다고 말하고 싶다. 보통의 동화에는 자극이 있다. 자극이 있어야 유쾌할 것이다. 나의 동화는, 무엇과 동화했는지 분명하지 않으니 추호의 자극도 없다. 자극이 없으니 오묘하고 형용하기 어려운 즐거움이 있다.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 건성으로 물결을 일으키는 경박하고 소란스러운 정취와는 다르다.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깊은 곳을 대륙에서 대륙까지 움직이고 있는 깊고 드넓은 바다인 창해의 모습이라 형용할 수 있다. 그저 그 정도로 활력이 없을 따름이다. 하지만 오히려 거기에 행복이 있다. 위대한 활력의 발현에는 이 활력이 언젠가 다하고 말 것이라는 걱정이 깃들어 있다. 평소의 모습에는 그런 걱정이 따르지 않는다. 평소부터 아련한 내 마음의 지금 상태는, 나의 격렬한 힘이 소진되지 않을까 하는 근심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평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평범한 마음의 경지도 벗어나 있다. 아련하다는 것은 단지 포착하기 힘들다는 의미일 뿐, 너무 약하다는 염려는 담고 있지 않다. 충융(和氣日冲融, 온화하고 기분이 풀려 누그러진 모습)이라든가 담탕(春風正澹蕩, 평온하고 차분한 모습)이라는 시인의 말은 이 경지를 가장 절실하고도 충분히 말한 것이리라. (p.86-89)
(같이 읽으면 좋은 책)

이백 시선 - 이백 (이원섭 옮김, 현암사)
李白(이백) - 相逢行(상봉행)
1.
相逢紅塵內(상봉홍진내) 붉은 먼지 낀 길에서 만나
高揖黃金鞭(고읍황금편) 황금 채찍 높이 들어 인사하노라
萬戶垂楊裏(만호수양리) 수양버들 사이 수많은 집들 중에
君家阿那邊(군가아나변) 그대 집은 어디에 있는가
2.
朝騎五花馬(조기오화마) 아침에 오화마(五花馬) 타고서
謁帝出銀臺(알제출은대) 천자를 알현하고 은대문(銀臺門)을 나선다
秀色誰家子(수색수가자) 빼어난 모습, 뉘 집 자제인지
雲車珠箔開(운거주박개) 구름 수레에 구슬 발 열리니
金鞭遙指點(금편요지점) 금 채찍으로 먼 곳을 가리킨다
玉勒近遲迴(옥륵근지회) 옥 굴레를 당겨 유유히 말을 돌리네
夾轂相借問(협곡상차문) 수레를 맞붙이고 말을 건네 보는데
疑從天上來(의종천상래) 하늘에서 내려온 듯 하여라
蹙入靑綺門(축입청기문) 머뭇거리며 청기문(靑綺門)으로 들어섰으니
當歌共銜杯(당가공함배) 응당 노래하고 술잔도 돌려야지
銜杯映歌扇(함배영가선) 머금은 술잔이 노래 부채에 어리니
似月雲中見(사월운중견) 마치 구름 사이로 달이 비치는 듯
相見不得親(상견부득친) 서로 만나 사귀지 못할 바엔
不如不相見(불여부상견) 만나지 않으니 만 못하지
相見情已深(상견정이심) 서로 만나 정이 깊어지고 나면
未語可知心(미어가지심) 말이 없어도 마음을 알 수 있으니
胡爲守空閨(호위수공규) 어이 빈 방을 지켜가며
孤眠愁錦衾(고면수금금) 비단 이불에 수심 안고 홀로 잠이 들리오
錦衾與羅幃(금금여라위) 비단 이불과 비단 휘장
纏綿會有時(전면회유시) 얽어질 때 정녕 있으리니
春風正澹蕩(춘풍정담탕) 봄바람은 정녕 부드럽기만 한데
暮雨來何遲(모우래하지) 저녁 비는 어이 그리 더딘지
願因三靑鳥(원인삼청조) 원컨대, 삼청조(三靑鳥)가
更報長相思(갱보장상사) 그리운 마음 다시 전해 주기를
光景不待人(광경불대인)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
須臾髮成絲(수유발성사) 잠깐 사이에 검은 머리 하얀 실로 변한다네
當年失行樂(당년실행락) 좋은 시절 즐거움을 다 놓치고서
老去徒傷悲(노거도상비) 늙은 뒤에 슬퍼해야 소용없으리
持此道密意(지차도밀의) 이러한 은밀한 이치를 마음에 지니고
無令曠佳期(무령광가기) 좋은 시절을 헛되게 하지 마라
..............................................................................................
안타깝게도 셋슈, 부손 등이 애써 그려낸 일종의 기품 있는 정취는 너무나 단순하고 또 너무나 단조롭다. 필력이라는 점에서 보자면 도저히 이들 대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지금 내가 그려보려는 마음은 좀 더 복잡하다. 복잡한 만큼 아무래도 한 장의 그림 안에 그 느낌을 담기는 어려울 것 같다. (p.91)
(같이 읽으면 좋은 책)

바쇼의 하이쿠 기행 - 마쓰오 바쇼 (김정례 옮김, 바다출판사)
...................................................................................................
다만 어떤 정경을 시 안으로 가져가 드넓고 의지할 데 없는 그 모습을 묘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이미 이를 포착한 이상 레싱의 주장에 따르지 않더라도 시로서 성공하는 것이다. 호메로스가 어떻든 베르길리우스가 어떻든 상관없다. 만약 시가 일종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데 적합하다면, 이 분위기는 시간의 제한을 받아 순차적으로 진척되는 사건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단순히 공간적인 회화의 요건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언어로 그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p.92-93)
(같이 읽으면 좋은 책)

일리아스, 오딧세이아 - 호메로스 (천병희 옮김, 숲)

아이네이스 - 베르길리우스 (김남우 옮김, 열린책들)
......................................................................................
그저 들어갈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백낙천의 '온천수활세응지(溫泉水滑洗凝脂)', 즉 '온천물 매끄러워 엉긴 기름 같은 살결 씻어주네'라는 구절뿐이다. 온천이라는 말을 들으면 반드시 그 구절에 나타나 있는 유쾌한 기분이 든다. 또 이런 기분을 낼 수 없는 온천은 온천으로서 전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이상적인 온천이고 그밖에는 달리 주문할 것이 전혀 없다.
물속으로 쓰윽 들어가 가슴 언저리까지 몸을 담근다. 어디서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지는 모르지만, 평소에도 욕조 가장자리를 깔끔하게 넘쳐 흐른다. 봄의 돌은 마를 틈도 없이 젖어 따뜻하니 밟는 발의 느낌이 안온하여 기분 좋다. 비는 어둠을 틈타 가만히 봄을 적실 만큼 조용히 내리지만, 처마 끝에 달린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는 점차 잦아져 똑똑 하고 귓가에 들려온다. 자욱한 김은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온통 들어찬 빈틈이라도 생기면 조그만 옹이구멍도 마다하지 않고 빠져나가려는 기색이다. (p.99-100)
(같이 읽으면 좋은 책)

백거이 시선 - 백거이 (정호준 옮김, 지만지)
백거이(白居易, 772 - 846)
長恨歌(장한가)
漢皇重色思傾國(한황중색사경국) 한나라 황제 미를 좋아하여 절세 미녀를 생각하였으나
御宇多年求不得(어우다년구부득) 천하를 다스린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얻지 못 하였네
楊家有女初長成(양가유녀초장성) 양씨 집안에 딸이 있어 이제 막 장성하였으나
養在深閨人未識(양재심규인미식) 깊은 규방에 있어 사람들은 몰랐다네
天生麗質難自棄(천생려질난자기) 하늘이 낳은 아름다움 스스로 버리기 어려워
一朝選在君王側(일조선재군왕측) 하루아침에 뽑히어 임금을 모시게 되었네
回眸一笑百媚生(회모일소백미생) 눈동자 굴리며 한번 웃음에 온갖 교태 생겨나
六宮粉黛無顔色(육궁분대무안색) 육궁의 화장한 미녀들 안색이 무안하네
春寒賜浴華淸池(춘한사욕화청지) 봄날이 쌀쌀하면 화청지에서 목욕하고
溫泉水滑洗凝脂(온천수골세응지) 온천물 매끄러워 기름 낀 살을 씻어주네
侍兒扶起嬌無力(시아부기교무력) 시녀들이 부축하여 일으키니 귀엽고 연약하여 힘이 없는 듯
始是新承恩澤時(시시신승은택시) 이 때가 비로소 새로 임금님 은택을 받을 때라
雲鬢花顔金步搖(운빈화안금보요) 구름 모양 머리에 꽃 같은 얼굴, 금장식 걸을 때에 흔들흔들
芙蓉帳暖度春宵(부용장난도춘소) 부용휘장 따뜻한데 봄밤을 보낸다네
春宵苦短日高起(춘소고단일고기) 봄밤은 너무 짧고 해는 높이 솟아오르고
從此君王不早朝(종차군왕부조조) 이 때부터 임금님은 일찍 조회도 하지 않고
承歡侍宴無閑暇(승환시연무한가) 기쁜 잔치에 한가한 때 없고
春從春游夜專夜(춘종춘유야전야) 봄이면 봄 따라 놀고 밤이면 밤새도록 놀았네
后宮佳麗三千人(후궁가려삼천인) 후궁의 미녀들 삼천 명이나 되나
三千寵愛在一身(삼천총애재일신) 삼천 미녀의 총애가 한 몸에 있네
金屋妝成嬌侍夜(금옥장성교시야) 금옥에서 화장하고 교태로 모시는 밤
玉樓宴罷醉和春(옥누연파취화춘) 옥루의 연회가 끝나니 취하여 봄날 같이 따뜻하다
姊妹弟兄皆列士(자매제형개렬사) 형제자매가 모두 벼슬을 하니
可憐光彩生門戶(가련광채생문호) 어여쁜 광채가 집안에 돈다
遂令天下父母心(수령천하부모심) 드디어는 세상의 부모들 마음이
不重生男重生女(부중생남중생녀) 아들 낳는 것보다 딸 낳는 것을 귀하게 여기게 되었네
驪宮高處入靑雲(려궁고처입청운) 여궁 높은 곳으로 푸른 구름 들고
仙樂風飄處處聞(선낙풍표처처문) 신선의 음악소리 바람 타고 곳곳에서 울리네
緩歌慢舞凝絲竹(완가만무응사죽) 느린 노래에 느린 춤이 현악기에 어울려
盡日君王看不足(진일군왕간부족) 종일토록 임금은 아무리 보아도 다시 보고 싶네
漁陽鼙鼓動地來(어양비고동지내) 어양 땅에서 반란군의 북소리 땅을 울리며 들려오니
驚破霓裳羽衣曲(경파예상우의곡) 예상우의곡도 놀라서 끊어지네
九重城闕煙塵生(구중성궐연진생) 구궁 궁궐에서 연기와 먼지 일어나니
千乘萬騎西南行(천승만기서남항) 천승만기 수레와 말 서남쪽으로 피난하네
翠華搖搖行復止(취화요요항복지) 화려한 깃발 흔들흔들 가다가 다시 서고
西出都門百餘里(서출도문백여리) 서쪽으로 도문을 나와 백여리쯤에
六軍不發無奈何(육군부발무나하) 전 군대가 임금의 말에 움직이지 아니 하니 어찌하나
宛轉蛾眉馬前死(완전아미마전사) 아름다운 양귀비도 말 앞에 찢겨죽는 것을
花鈿委地無人收(화전위지무인수) 꽃비녀를 던져도 줍는 사람 아무도 없고
翠翹金雀玉搔頭(취교금작옥소두) 취교와 금작과 옥소두 같은 비녀마저도 마찬가지네
君王掩面救不得(군왕엄면구부득) 임금이 낯을 가리고 구해보려 해도 어쩔 수 없어
回看血淚相和流(회간혈누상화류) 돌아보자 피눈물 흘러내리네
黃埃散漫風蕭索(황애산만풍소삭) 누런 흙먼지 흩어져 자욱하고 바람은 스산한데
雲棧縈紆登劍閣(운잔영우등검각) 사다리길 구불구불 지나서 등검각에 오른다
峨嵋山下少人行(아미산하소인항) 아미산 아래엔 인적도 드물고
旌旗無光日色薄(정기무광일색박) 깃발들은 빛을 잃고 햇빛도 엷어지네
蜀江水碧蜀山靑(촉강수벽촉산청) 촉 땅의 강물 파랗고 산 푸름은
聖主朝朝暮暮情(성주조조모모정) 거룩하신 임금의 아침마다 밤마다의 정이라네
行宮見月傷心色(항궁견월상심색) 임금이 행궁에서 보는 달은 상처받은 얼굴색이요
夜雨聞鈴腸斷聲(야우문령장단성) 밤비에 들리는 방울소리는 애간장 끊는 소리라네
天旋地轉回龍馭(천선지전회룡어) 하늘이 돌고 땅이 바뀌어 임금님 수레 되돌아
到此躊躇不能去(도차주저부능거) 여기에 이르러서는 머뭇머뭇 차마 떠나지 못하네
馬嵬坡下泥土中(마외파하니토중) 마외역 언덕 아래 진흙 땅 속에
不見玉顔空死處(부견옥안공사처) 양귀비의 옥 같은 얼굴은 보이지 않고 죽은 곳 쓸쓸하다
君臣相顧盡沾衣(군신상고진첨의) 임금과 신하 서로 돌아보며 모두 눈물이 옷을 적시고
東望都門信馬歸(동망도문신마귀) 동쪽으로 도문을 바라보며 말을 따라 돌아가네
歸來池苑皆依舊(귀내지원개의구) 돌아와 보니 연못과 동산 모두가 그대로고
太液芙蓉未央柳(태액부용미앙류) 태액의 부용과 미앙궁의 버드나무도 모두 그대로구나
芙蓉如面柳如眉(부용여면류여미) 부용을 보니 양귀비 얼굴, 버들을 보니 양귀비 눈썹
對此如何不淚垂(대차여하부누수) 이를 보고 어찌 눈물 아니 흘리리오
春風桃李花開日(춘풍도리화개일) 봄바람에 복숭아꽃, 오얏꽃 피는 날
秋雨梧桐葉落時(추우오동섭낙시) 가을비에 오동나무 잎 떨어지는 때라
西宮南內多秋草(서궁남내다추초) 서궁과 남내에 가을 풀이 무성하고
落葉滿階紅不掃(낙섭만계홍부소) 낙엽은 계단에 가득 쌓여 붉어도 쓸지 않네
梨園子弟白發新(이원자제백발신) 이원의 자제들도 늙어 백발이 새롭고
椒房阿監靑娥老(초방아감청아노).초방의 태감도 젊은 궁녀도 이제 다 늙었구나
夕殿螢飛思悄然(석전형비사초연) 저녁 궁궐에 반딧불 날아다니니 양귀비 생각에 처량하고
孤燈挑盡未成眠(고등도진미성면) 외로운 등불에 심지 돋워 다 타도 잡은 오지 않네
遲遲鐘鼓初長夜(지지종고초장야) 느리고 느린 종소리 긴 밤에 처음 들려오고
耿耿星河欲曙天(경경성하욕서천) 밝고 밝은 별들에 날이 새려하는구나
鴛鴦瓦冷霜華重(원앙와냉상화중) 원앙기와 차가운 곳에 서리꽃은 더욱 짙어지고
翡翠衾寒誰與共(비취금한수여공) 비취 미불 차가운 곳을 누구와 같이하나
悠悠生死別經年(유유생사별경년) 아득한 생사의 이별, 해를 넘겨도
魂魄不曾來入夢(혼백부증내입몽) 혼백은 아직도 돌아와 꿈에도 들지 않네
臨邛道士鴻都客(임공도사홍도객) 서울 나그네 임공의 도사가
能以精誠致魂魄(능이정성치혼백) 정성으로 혼백을 불러들일 수 있다네
爲感君王輾轉思(위감군왕전전사) 임금의 잠 못 드는 잠이 느꺼워
遂敎方士殷勤覓(수교방사은근멱) 마침내 방사를 시켜서 은근히 찾아보게 하였네
排空馭氣奔如電(배공어기분여전) 구름에 올라 공기를 타니 빠르기가 번개같고
升天入地求之遍(승천입지구지편) 하늘에 오르고 땅에 들며 두루두루 찾아보네
上窮碧落下黃泉(상궁벽낙하황천) 위로는 하늘 끝까지 아래로는 황천까지
兩處茫茫皆不見(양처망망개부견) 두 곳 모두 망망하여 보이지 않네
忽聞海上有仙山(홀문해상유선산) 홀연히 소리 들려오네, 바다 위에는 신선의 산이 있고
山在虛無縹緲間(산재허무표묘간) 그 산은 보이지 않는 표묘한 간에 있다네
樓閣玲瓏五雲起(누각령롱오운기) 누각은 영롱하여 오색구름 일어
其中綽約多仙子(기중작약다선자) 그 속은 아름다워 신선이 많이 살고
中有一人字太眞(중유일인자태진) 그 중에 한 사람 있으니 자는 태진인데
雪膚花貌參差是(설부화모삼차시) 눈 같이 흰 피부, 꽃 같은 고운 얼굴
金闕西廂叩玉扃(금궐서상고옥경) 대궐 서쪽 행랑에서 옥문을 두드려
轉敎小玉報雙成(전교소옥보쌍성) 여종인 소옥과 양성에게 알리니
聞道漢家天子使(문도한가천자사) 한나라 천자의 사신이라 말하는 것을 듣고
九華帳里夢魂驚(구화장리몽혼경) 구화 장막 속 깊은 곳에서 잠자던 혼이 놀라며
攬衣推枕起徘徊(남의추침기배회) 옷을 잡고 베개 밀어제치고 일어나 허둥지둥
珠箔銀屛迤邐開(주박은병이리개) 주렴 발과 은 병풍이 스르르 열리고
雲鬢半偏新睡覺(운빈반편신수각) 검은머리 반쯤 기울어 이제 막 잠이 깬 채로
花冠不整下堂來(화관부정하당내) 화관도 정제하지 못한 채로 방에서 내려오네
風吹仙袂飄飄擧(풍취선몌표표거) 바람 불어 신선의 소매 자락 나풀거려
猶似霓裳羽衣舞(유사예상우의무) 예상우의 곡으로 춤추는 듯 하네
玉容寂寞淚闌干(옥용적막누란간) 옥 같은 얼굴 고독이 깃들고 눈물 그치지 않네
梨花一枝春帶雨(이화일지춘대우) 배꽃 가지엔 봄비가 배어있어
含情凝睇謝君王(함정응제사군왕) 정을 품고 눈물을 머금어 임금께 감사하네
一別音容兩渺茫(일별음용량묘망) 한번 이별 후 이제는 아련한 임금의 음성과 얼굴
昭陽殿里恩愛絶(소양전리은애절) 소양궁 안은 임금의 은혜 끊겼지만
蓬萊宮中日月長(봉래궁중일월장) 봉래궁 안은 일월이 장구합니다
回頭下望人寰處(회두하망인환처) 고개 돌려 아래로 인간 세상을 내려보니
不見長安見塵霧(부견장안견진무) 장안은 보이지 않고 티끌과 안개만 보입니다
唯將舊物表深情(유장구물표심정) 오직 옛 정물을 가지고 깊은 정 표현하려
鈿合金釵寄將去(전합금채기장거) 전합과 금차를 부쳐 보내옵니다
釵留一股合一扇(채류일고합일선) 금차 하나 금합 하나 남기어
釵擘黃金合分鈿(채벽황금합분전) 금차는 황금을 쪼개고 금합은 뚜껑을 나누었습니다
但敎心似金鈿堅(단교심사금전견) 다만 우리의 마음 금차와 금합처럼 굳게 가져
天上人間會相見(천상인간회상견) 천상이나 이 세상에서 만나게 하소서
臨別殷勤重寄詞(림별은근중기사) 떠나려 함에 은근히 거듭 말을 부치니
詞中有誓兩心知(사중유서량심지) 말 가운에 서약이 있어 두 사람은 알 것이네
七月七日長生殿(칠월칠일장생전) 어느 칠월 칠석 날 장생전에서
夜半無人私語時(야반무인사어시) 어느 한 밤에 사람은 아무도 없어 사사로이 하던 말
在天愿作比翼鳥(재천원작비익조) 하늘에선 비익조가 되고
在地愿爲連理枝(재지원위련리지) 땅에선 연리지가 되었으면 하였네
天長地久有時盡(천장지구유시진) 천장지구하여도 다할 때가 있으련만
此恨綿綿無絶期(차한면면무절기) 이들의 한은 면면하여 끊어질 때 결코 없어리
........................................................................................................................................
이런 꿈같은, 시 같은 봄 마을에, 우는 것은 새, 떨어지는 것은 꽃잎, 솟는 것은 온천뿐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던 것은 잘못이다. 현실 세계는 산을 넘어, 바다를 건너 헤이케의 후예만이 오랫동안 살아온 외진 마을까지 다가온다. (p.121)
<트리스트럼 샌디>라는 책에는, 이 책만큼 신의 뜻에 맞게 쓰인 것은 없다고 쓰여 있다. 첫 한 구절은 어떻게든 자력으로 적는다, 나머지는 오로지 신에게 기도를 드리며 붓이 가는 대로 맡긴다. 물론 무엇을 쓸지 자신도 짐작할 수 없다. 쓰는 사람은 자신이지만, 쓰는 것은 신의 일이다. 따라서 책임은 저자에게 없다는 것이다. 나의 산책 역시 이 방식을 받아들인 무책임한 산책이다. 다만 신을 믿지 않는 것이 한ㄷ층 더 무책임할 뿐이다. 로렌스 스턴은 자신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이를 하늘에 계신 신에게 전가했다. 받아줄 신을 갖지 못한 나는 결국 이를 시궁창에 버렸다. (p.145-146)
(같이 읽으면 좋은 책)

트리스트럼 샌더의 인생과 생각이야기 - 로렌스 스턴 (김정희 옮김, 을유세계문학)
................................................................................................................................
문(밖)을 나서니 상념이 많은데
봄바람이 내 옷을 스치네
향기로운 풀은 바퀴 자리에 자라고,
인적 끊어진 길은 봄 안개에 희미하네.
지팡이를 멈추고 바라보니,
만물이 맑은 빛을 띠고 있네.
휘파람새의 순한 울음소리 들으며,
하늘하늘 지는 꽃잎을 바라보네.
들에서 멀리 (나아)가,
오래된 절 문에 시를 적네.
독한 우수로 구름 끝은 높고,
드넓은 하늘에는 짝 잃은 기러기 돌아가네.
마음은 왜 이리 그윽한지,
한없이 넓어 옳고 그름을 잊었네.
서른이 되어 나는 늙으려 하고,
봄날의 한가한 빛은 여전히 부드럽네.
소요하며 만물의 유전에 따라,
느긋하게 향기로운 꽃향기를 마주하네. (p.167-168)
기차만큼 20세기 문명을 대표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수백명이나 되는 인간을 같은 상자에 집어넣고 굉음을 내며 지나간다. 인정사정없다. 집어넣어진 인간은 모두 같은 정도의 속력으로 동일한 정거장에 멈추고 그리하여 똑같이 증기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들은 기차를 탄다고 한다. 나는 실린다고 한다. 사람들은 기차로 간다고 한다. 나는 운반된다고 한다. 기차만큼 개성을 경멸하는 것은 없다. 문명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개성을 바랃ㄹ시킨 후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 개성을 짓밟으려고 한다. 한 사람 앞에 몇 평의 지면을 주고 그 지면 안에서는 눕든 일어서든 멋대로 하라는 것이 현재의 문명이다. 동시에 이 몇 평의 주위에 철책을 치고 그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서는 안 된다고 위협하는 것이 현재의 문명이다. 몇 평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던 자가 그 철책 밖에서도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가련한 문명의 국민은 밤낮으로 그 철책을 물고 늘어지며 포효하고 있다. 문명은 개인에게 자유를 주어 호랑이처럼 사납게 날뛰게 한 뒤 다시 우리 안에 던져 넣고 천하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동물원의 호랑이가 구경꾼을 노려보며 드러누워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평화다. 우리의 쇠창살이 하나라도 빠지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된다. 제2의 프랑스 혁명은 그때 일어날 것이다. 지금 개인의 혁명은 이미 밤낮으로 일어나고 있다. 북유럽의 위인 입센은 이 혁명이 일어날 만한 상황에 대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 에증을 보여주었다. 나는 기차가 분별없이 모든 사람을 화물과 마찬가지로 알고 맹렬히 달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객차 안에 갇혀 있는 개인과, 개인의 개성에 털끝만치의 주의조차 주지 않는 이 쇠바퀴를 비교하며, 위험하다, 위험해, 하고 주의를 주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현대의 문명은 이 위험이 코를 찌를 정도로 충만해 있다. 앞을 전혀 내다볼 수 없는 상태에서 분별없이 함부로 날뛰는 기차는 위험한 표본 가운데 하나다. (p.182-183)
(같이 읽으면 좋은 책)

민중의 적 - 헨리 입센 (김석만 옮김, 범우사)
........................................................................................................................................................................................................................................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1867년 1월 11일 ~ 1916년 1월 9일)

1867년 1월 11일(음력 1월 5일)에 에도의 우시고메 바바시모요코초(오늘날 신주쿠구 기쿠이 정)에서 나쓰메 고효에 나오카쓰(夏目小兵衛直克)의 막내로 태어났다. 자식 많은 집에서 늦둥이로 태어났으므로, 어머니가 부끄럽게 여겼다. 긴노스케라는 이름은 태어난 날이 경신일(庚申日, 이날 태어난 아이는 큰 도둑이 된다는 미신이 있었다)이었으므로, 액을 막는 의미에서 긴(金)이라는 글자가 이름에 들어갔다. 세 살 때쯤 걸린 천연두 흔적은 이후에도 남았다.
당시 에도 막부가 붕괴한 이후 혼란기였고, 생가는 몰락하고 있었으므로 태어난 직후에 요쓰야(四谷)의 낡은 도구점(일설에는 야채가게)에 양자로 갔지만, 늦은 밤까지 물건 옆에서 나란히 자는 것을 지켜본 누나가 불만을 품고 곧 본가로 데리고 왔다. 이후 1세 때 부친의 친구였던 시오바라 쇼노스케(塩原昌之助)의 양자로 갔지만, 양부였던 쇼노스케의 여성 문제가 들통나는 등 가정불화가 불거지면서 7세 때 양모가 잠깐 생가로 데려왔다. 이후 양부모 이혼과 함께 9세 때 생가로 되돌아오지만, 친부와 양부 대립으로 말미암아 나쓰메가로 복적한 게 21세 때 일이다. 이러한 양부모와 관계는 이후 소설 《한눈팔기》의 소재가 되었다.
어수선한 집안 분위기 속에서 이치가야 학교(市ヶ谷学校)를 거쳐 니시키하나 소학교(錦華小学校)로 전학했다. 12세 때인 1879년에 도쿄부 제1중학 정칙과(正則科, 훗날 부립 1중, 오늘날 도쿄도립 히비야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대학 예비문 수험에 필수였던 영어 수업이 없던 것과 함께 한학과 문학에 뜻을 두었으므로 2년 뒤 중퇴했다. 1883년에 대학 예비문 수험을 위해 영어를 가르치던 영학숙 세이리쓰 학사(成立学舎)에 입학해 두각을 드러냈다.
1884년에 무사히 대학 예비문 예과에 입학했다. 당시 하숙 동료로 훗날 남만주 철도 총재가 되는 나카무라 요시코토가 있다. 1886년에 대학 예비문이 제1고등중학교로 개칭하고, 이후 맹장염 등으로 인해 예과 2급의 진급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요시코토와 함께 낙제하였다. 이후 사립학교 교사를 지냈으며, 영어실력이 우수했다.
1889년에 동창생으로 소세키에게 문학적·인간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 마사오카 시키와 처음으로 만났다. 시키가 손수 쓴 한시나 하이쿠 등을 묶은 문집 《나나쿠사슈》(七草集)가 돌고 있을 때 소세키가 그 비평을 권말에 한문으로 쓴 게 우정의 시작이었으며, 이때 처음으로 ‘소세키’라는 호를 사용했다. 소세키라는 이름은 《진서》(晉書)의 고사 ‘수석침류’(漱石枕流, 돌로 양치질하고 흐르는 물을 베개로 삼겠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억지가 강하거나 괴짜라는 것의 대표적인 예이다. 소세키는 원래 시키의 수많은 필명 가운데 하나였으나, 이후에 소세키는 시키로부터 이를 물려받았다.
1890년에 창설된 지 얼마 안된 제국대학(이후 도쿄 제국대학) 영문과에 입학하며, 이즈음에 염세주의와 신경쇠약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887년에는 큰 형 다이스케(大助)를 잃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둘째 형 에이노스케(榮之助)를 잃는다. 1891년에는 셋째 형 와사부로(和三郎)의 아내 도세(登世)가 스물다섯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1892년에는 병역을 피하기 위해 분가하였으며, 홋카이도로 적을 옮겼다. 같은 해 5월에는 도쿄 전문학교(지금의 와세다 대학)의 강사를 시작한다. 이후 시키가 대학을 중퇴하지만, 소세키는 마쓰야마의 시키의 집에서 뒤에 소세키를 직업작가의 길로 이끄는 다카하마 교시와 만나게 되었다.
1893년에 도쿄 제국대학을 졸업하고, 도쿄 고등사범학교 영어교사가 되었으나 일본인이 영문학을 가르치는 것에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잇단 가족 죽음과 함께 폐결핵, 극도의 신경쇠약 등이 나타난 게 이때다. 1895년에 도쿄에서 도망치듯 고등사범학교에서 사직하고, 스가 도라오(菅虎雄)의 주선으로 에히메현 심상 중학교로 부임한다. 마쓰야마시는 시키의 고향으로, 이 즈음에 시키와 함께 하이쿠나 작품을 남기고 있다.
1896년에는 구마모토현 제5고등학교(구마모토 대학의 전신)의 영어교사로 부임하고, 친족들의 권유로 귀족원 서기관장이던 나카네 시게카즈의 장녀 교코와 결혼하지만, 좋은 관계는 맺지 못하는 등 원만한 부부는 아니었다.
1900년 5월에 문부성에 의해 영문학 연구를 위해 영국 유학을 떠나게 된다. 메리디스나 디킨스 등을 주로 읽었다. 《긴 봄날의 소품》(永日小品)에서도 등장하는 셰익스피어 연구가 윌리엄 크레이그의 지도를 받거나, 《문학론》(文学論) 연구 등을 하지만 영문학 연구와의 위화감은 지속되어 신경쇠약은 심해졌다. 또한 동양인이라는 이유에서 인종차별을 받는 등의 초조함도 쌓여 몇 번이나 거처를 옮겼다.
1901년에 물리화학 연구를 위해 2년간 독일로 유학해 있던 화학자 이케다 기쿠나에가 베를린에서 소세키를 찾아와 잠시 동거한 것으로 인해 깊은 자극을 받고, “기쿠나에에게 받은 자극을 계기로 소세키가 과학이라는 학문을 강하게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혼자서 연구에 몰두하는 등으로 인해 주변의 일본인들에게서 “나쓰메가 미쳤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문부성에서 귀국 명령을 내린다. 1903년에 결국 일본으로 귀국하게 되었으며, 소세키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집의 맞은 편에 1984년에 쓰네마쓰 이쿠오에 의해 런던 소세키 기념관이 설립되었다.
귀국 이후 도쿄 제국대학의 강사나 메이지 대학의 강사 등을 전전하던 소세키는, 신경쇠약을 완화하기 위해 데뷔작인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를 집필하고 시키 문하의 모임에서 발표하여 호평을 얻었다. 1905년 1월에 《호토토기스》에 1회만 게재할 계획이었지만, 호평으로 속편을 집필한다. 이때부터 작가의 길을 열망하기 시작했고, 이후 〈런던탑〉이나 《도련님》 등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인기를 얻어간다. 소세키의 작품은 세속을 잊고 인생을 관조하는, 이른바 저회취미(低徊趣味, 소세키의 조어)적 요소가 강해 당시 주류였던 자연주의와 대립된 여유파로 불렸다.
1907년에 도쿄 아사히 신문의 주필이던 이케베 산잔의 초청으로 아사히 신문사에 입사해 본격적인 직업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에 직업작가로서의 첫 작품 《우미인초》의 연재를 시작하고, 집필 도중에 신경쇠약이나 위병 등으로 고생했다. 1909년에 친우였던 남만주 철도 총재 나카무라 요시코토의 초청으로 만주와 조선을 여행한다. 이 여행의 기록은 《아사히 신문》에 〈만한 이곳저곳〉(満韓ところどころ)이란 이름으로 연재되었다.
1910년 6월, 《산시로》와 《그 후》에 이은 전반기 3부작의 세 번째 작품 《문》을 집필하던 중에 위궤양으로 입원하게 된다. 같은 해 8월에는 이즈의 슈젠지로 요양을 떠난다. 그러나 거기에서 병이 악화되어 각혈을 일으키고, 위독한 상태가 된다. 이것이 바로 ‘슈젠지의 큰 병’(修善寺の大患)으로 불리는 사건이다. 이때 사경을 헤메던 것은 이후의 작품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같은 해 10월에 용태가 안정되었고, 다시 입원하였으나 이후에도 위궤양 등으로 수차례 고통을 겪는다. 1912년 12월에는 병으로 《행인》의 집필도 중단한다. 이후의 작품은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을 따라가면서, 후반기 3부작이라고 불리는 《피안이 지날 때까지》, 《행인》, 《마음》으로 연결되었다.
1915년 3월에 교토에서 놀던 중 다섯 번째의 위궤양으로 쓰러진다. 6월부터는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집필 당시의 환경을 돌아보는 내용인 《한눈팔기》의 연재를 시작하지만 1916년에는 당뇨병도 앓게 된다. 그해 1월 9일에 큰 내출혈을 일으키면서 《명암》 집필 중 향년 48세로 요절하였다.
소세키가 요절한 다음 날, 사체는 도쿄 제국대학 의학부 해부실에서 나가요 마타로에 의해 해부되었다. 이때 적출된 뇌하고 위는 기증되어, 뇌는 현재도 에탄올에 담긴 상태로 도쿄 대학 의학부에 보관되어 있다. 묘는 도쿄도 도시마구 미나미이케부쿠로의 조시가야 묘원(雑司ヶ谷霊園)이다.
..........................................

풀베개 - 소세키 (오석륜 옮김, 책세상)

풀베개 - 소세키 (조재중 옮김, 이담북스)

나쓰메 소세키 소설 전집 (현암사 14권)

런던탑 - 소세키 (김정숙 옮김, 을유문화사)

나쓰메 소세키 단편소설 전집 - 소세키 (박현석 옮김, 현인)
...................................................................................................
'II. 고전 문학 (동양) > 1. 동양 - 고전 소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마음 - 나쓰메 소세키 (송태욱 옮김, 현암사) (1) | 2023.08.31 |
|---|---|
| 설국 - 가와바타 야스나리 (장경룡 옮김, 문예출판사) (0) | 2023.06.23 |
| 무희 - 모리 오가이 (문학동네) (0) | 2023.03.24 |
| 한시치 체포록 - 오카모토 기도 (추지나 옮김, 책세상) (0) | 2023.02.27 |
| 키재기 - 하구치 이치요 (유윤한 옮김, 궁리) (0) | 2023.02.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