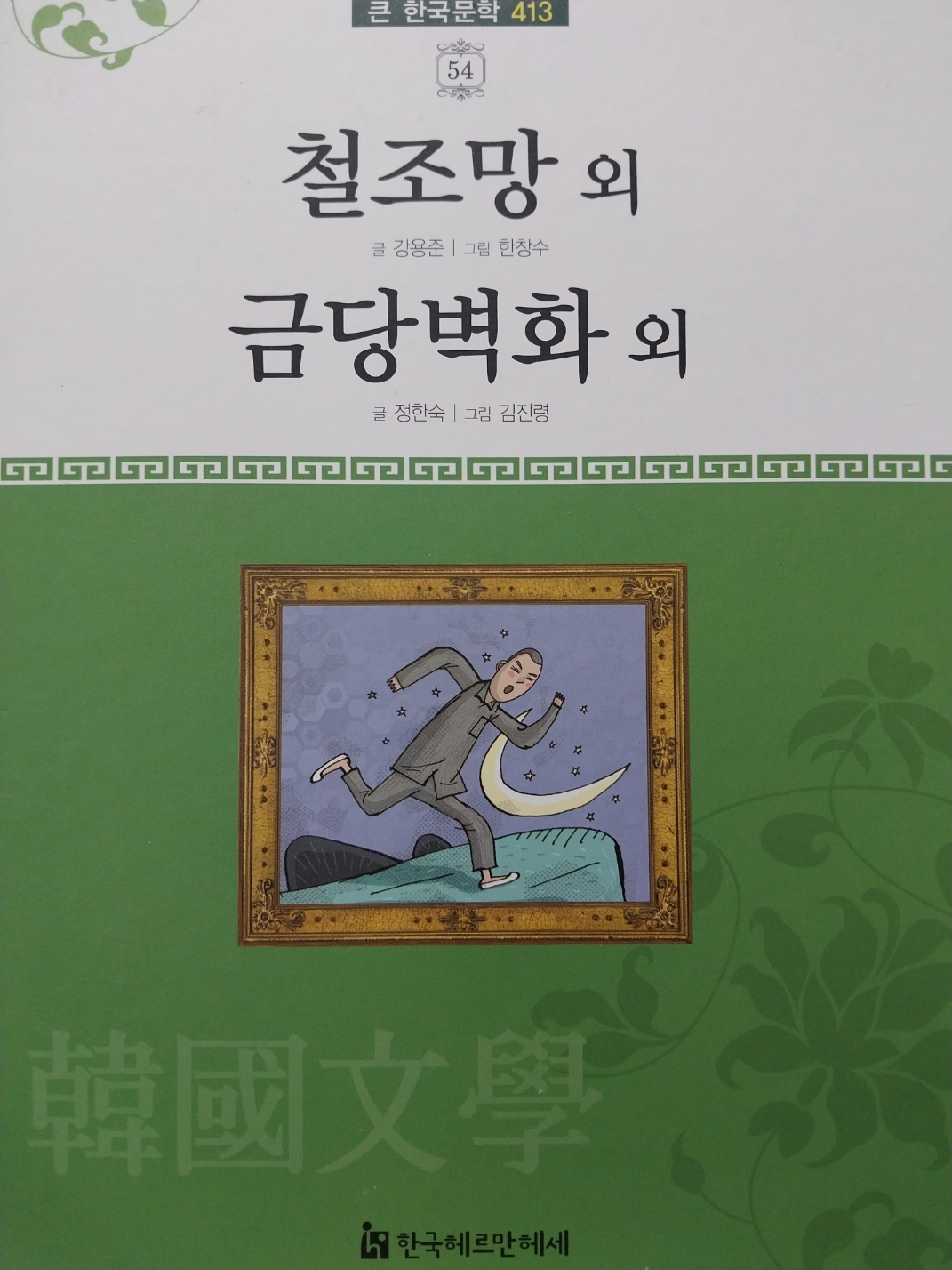
큰 한국문학 413 (54권)
목차
강용준
철조망
고향사람
정한숙
금방벽화
고가
......................................
강용준 - 철조망 (1960년)
새카만 빛깔이 부윰한 빛을 받아 몇 번인가 상하로 흔들거렸다. 그 흔들림을 인기척이 따랐다. 인기척이 끝나고 일순 무엇인가 요란한 소음이 정지됐다고 느껴지는 순간 한쪽 모퉁이가 환희 열리면서 강렬한 플래시의 사광이 확 덮쳐 왔다. 그 강렬한 사광 안쪽에서 검은 그림자가 둘 나타났다.
민수는 거의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어느새 손끝이 가느다랗게 떨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굴욕이었다.
민수는 또 개구리를 생각한다. 놈들이 내두르는 강렬한 플래시의 사광을 뒤집어써야 할 때마다 민수는 어처구니없게도 레이더망을 생각하고 도마대 위에 볼품없이 쭈그리고 앉은 개구리의 굴욕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p.9)
"최악의 경우 우리는 삶을 버린다. 그러나 우리가 흘린 피의 자국은 영원히 남아 마르지 않으리라. 성실한 인간의 가슴속에 이름없는, 그러나 참된 인간의 기록으로 새겨 길이 남으리라."
그러나그것 역시 도장된 하나의 자만심일 뿐이, 뭐 누구를 위한다는 그 인류의 숭고(?)한 사상은 애초에 없었다. (p.13)
왜 이래야만 되는가. 참으로 왜 이래야만 하는 건지 민수는 알 수가 없었다. 정말 민수는 이러고 싶지는 않았다는 생각이다. 이건 무슨 이즘의 대립도 아니었다. 양심이었다. 피 묻은 앙심이었다. 비단 **캠프만이 아니었다. 온 섬 안의 좌익 캠프는 모두가 하나 같이 설렁댔다. 걸핏하면 반동이었다. 반동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한가지로 사람들은 이유도 없이 죽어 갔던 것이다. 도무지 하릴없는 존속으로만 비치는 외부의 운으로는 상상조차 못하리라
반동의 피는 물간 재료로서는 최고급이다. 붉은색이니까 말이다. 만들어진 플래카드는 인간이 메고 다닌다. 인간의 피는 인간이 메야 제격일 테니 말이다. 그리하여 인간은 굉장한 영웅, 인민 영웅의 칭호를 획득하는 것이다. 이때 소위 정치 교양은 영웅 제작 공장으로 위세가 당당해진다. 그뿐이 아니다. 군중대회 궐기대회 그리고 독보회 그리고 또 당회 말이다. 얼마든지 있다.판에 박은 듯이 날마다 계속되는 이 회 회 회, 회의 좃고들. 그리고 그 뀅하게 동공들이 썩어 물러나서 해골 같은 몰골들. (p.23-24)
그들에게는 생리적인 갈구,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밥이라는 것,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러한 분(糞)의 원료를 목이 타게 찾고 있는 욕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p.28)
놈들의 정치 교양이란 게 별것이 못 된다. 그들은 그저 모든 것이 지겹다. 아무런 의욕도 없는 것이다. 애당초 그들은 포로라는 이름조차 잘 몰랐다. 또 포로가 될 그런 끔찍한 죄를 자기들이 저질렀는지 어쩐지조차 모른다. 그저 끌려 나왔고 그러고는 포로가 되었다. 살겠다고 그 고난의 길을 나섰다가 이국인에게 무조건 붙잡혔다. 소위 피난민이라는 사람들. 처음 그들은 자기들의 경우는 애매하다고 분해했다. 좀 슬프긴 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슬프지도 분하지도 않다. 그저 지겹고 권태롭고 그리고는 밥을 생각했다. (p.29)
소시민 근성, 인텔리 근성, 그것이 좀 더 발전하면 회색분자로 되고 심하면 반동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레테르.
하마터면 민수도 그 청년처럼 그렇게 산속에 묻혀 한 개의 산인으로서, 아니면 어느 컴컴한 지하실 속에서 혹은 어느 숨막히는 지붕 밑에서 못내 죽어 갔을지 몰랐다. 6.25만 없었던들 말이다.
실로 그건 난장판이었다. 사람들을 시뻘겋게 눈알을 홉뜨고 돌아가는 미친 개였다. 질서와 계통을 벗어난 인간 속성이란 어쩌면 개새끼만도 못했다.
어제까지도 요조숙녀이던 그 여인이 오늘 아침은 자식과 지아비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그 허허한 폐허 위에 오두마니 엎디어 목놓아 울면 어느 낯선 총검이 가랑이를 들치고 오줌을 싸고, 그 숱하게 많은 고귀한 언어들로 장식된 전쟁이란 결국은 이런 것이었다. 짓눌려 오히려 조용하게만 살아 온 민수에게 기어이 불을 질러 놓고 만 것이 이러한 전쟁이란 용어의 속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감당할 수 없는 분노를 아무렇게나 배설해 버리기에는 아직도 그에게는 분별이 남아 있었다. (p.32)
어떤 행동 그 자체가 어떤 한 생명의 전부일 수도 있을 때, 그 행동의 결과가 뜻하는 어떤 의미의 가부를 따지기 전에 그 행동의 숭고성을 인정해 줄 많나 아량을 여러분들은 가져 달라고, 그리고 이제는 이 마지막 우리들의 소망마저 깨끗이 취소하노라고. 그리하여 찢기고 지쳐 빠진 육체는 오직 권태와 피로만을 터득한 채 죽어 가노라고. (p.60)
민수는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정신이 없었다. 이 모든 행동을 무슨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해 냈는지 어쩐지 모르겠다. 그저 그래야 했을 뿐이라는 생각뿐이었다.
민수는 다시 기어갔다. 마침내 그는 마지막 콘셋까지 다다랐다. 그는 숨을 죽였다.
이제 저 철조망만 무사히 넘기면 된다. 그러면 그것으로 일은 끝난다. 그 뒤의 일은 자기로서는 관여할 바가 못 된다. 아마 무한한 시간이 열려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무한한 시간 속에 인간의 갈등은 또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래도 좋다. 그 침 뱉을 인간의 갈등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 숙명이라면 그것 역시 그런대로 내버려 두자.
내게는 단지 철조망이 있다. 철조망 앞에서는 나는 단지 초조할 따름이다.
조만간 날은 밝아 올 것이다. 반면에 놈들의 동초는 촌분의 틈도 주지 않고 서슬이 푸르러 서 있다. 무엇보다도 철조망까지의 20여 미터 거리를 놈들의 동초가 달려들기 전에 거의 기능을 상실한 지금의 육체가 달려가 철조망을 넘어 낼 것 같지도 않다. 그리하여 급기야는 놈들의 동초에게 붙잡혀 다시 놈들의 밥이 될지도 모르며 혹은 또 불의의 탈영자로 간주되어 국군 동초의 총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그대로 내버려 두자. 민수는 지금 콘셋 모퉁이에 삵괭이처럼 엎드리어 철조망을 조그맣게 노리고 있을 뿐이다. 철조망으로 뚫린 조그마한 가능을 노리며 무서운 긴장을 느낄 뿐이다. (p.75-77)
그 순간이었다. 민수는 화닥닥 일어섰다. 그리고 정신없이 달려나갔다. 철조망을 타고 올랐다. 발이 째지고 손이 찢어졌다. 피가 흘러내렸다. 정신이 없었다. 아득했다. 무엇인가 떠들썩하고 왁자지껄한 소동이 그저 아득하기만 하였다. 얼마를 타고 올랐는지 몰랐다. 갑자기 손이 파르르 떨리며 온몸에 경련이 일어 왔다. 경련이 어느 한 고비에서 발을 멈추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피시시 맥이 풀리며 민수는 그대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어둠 속에 서넛의 검은 그림자가 방금 철조망에서 굴러 떨어진 시체를 둘러싸고 웅성대고 있었다.
한 놈이 씨부렸다.
"미욱한 새끼, 제레 뛔야 베루기디 원 벨 수 있갔다구 하하하."
다음 놈이 말을 받았다.
"양놈이 털도망 하나는 잘 테 뒀디."
"참 이런 때 털도망은 희한하대니끼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둠은 여전히 깔려 있었다.
황량한 폐허처럼 여기 철조망은 그렇게 둘러져만 있는 것이었다. (p.77-78)
<작품 이해>
<철조망>은 포로수용소에서 이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속에서 인간이 느끼는 죽음의 공포를 다루고 있다. 포로수용소에서는 좌익 포로들이 천편일률적인 겅치 교양 교육을 실시하고, 좌익 이념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마구 죽이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된다. 민수와 그의 동지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쿠데타를 계획하지만 동지의 밀고로 실패로 돌아간다. 민수는 그들에게 잡혀 고문을 당한다. 보초가 쉬는 사이 그는 오직 살아야겠다는 의지 하나만으로 필사적으로 철조망을 넘으려 하지만 넘지 못하고 죽고 만다.
.........................................................................................................................................................................................................................................
강용준(姜龍俊, 1931년 11월 29일 ~ )
대한민국의 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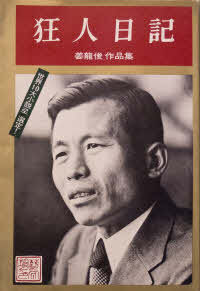
강용준(姜龍俊, 1931∼)은 황해도 안악(安岳)군 용문(龍門)면 매화(?花)리에서 부 강성직(姜聖稷)과 모 이한호(李漢湖)의 3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난 작가는 교명(敎名) 루스로 영세를 받았다. 3, 4세 때 신천(信川)읍으로 이사했다. 6세 때 부모와 헤어져 고향 안악으로 돌아와 조부 및 백부 밑에서 성당 소속의 유치원에 1년 다녔다. 다음 해 신천의 가족들도 모두 고향으로 솔가해 왔다. 성당 소속의 봉삼(奉三)초등학교에 들어갔다.
안악중학교, 안악고등학교, 진남포(鎭南浦)공업전문학교 등을 거쳐, 1950년 평양사범대학에 재학 중 한국전쟁이 발발해 그해 7월 인민군 보충병으로 징집되었다. 이후 유엔군의 포로가 되어 부산 동래, 거제도 고현리, 광주 사월산 등지에서 만 3년간 수용소 생활을 했다.
1953년 6월 18일 반공 청년 석방일에 사월산 수용소에서 철조망을 뚫고 탈출해, 이후 전남 함평군 대동면 용성리에서 약 3개월간 기식하다가 부산으로 옮겨 부두 노동 등을 하며 전전했다.
1954년 10월 2일 공병 소위(工兵少尉)로 임관해, 경북 영천 1205건설공병단 508철교중대 소대장으로 부임했다. 1958년 오용숙(吳龍淑)과 경북 영천에서 결혼했다.
1960년 7월 <사상계(思想界)> 제1회 신인문학상에 <철조망(鐵條網)>이 당선되어 문단에 데뷔,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1963년 3월 31일 강원도 홍천에서 수도사단 공병대대 중대장으로 복무 중 전역했다. 출판협회 임시직으로 잠시 근무하기도 했다.
1964년 사상계사에 입사해 1966년 퇴사했고, 이어 한국해외개발공사 공보실에 근무하다 1968년 퇴사했다. 같은 해, 장편 ≪태양(太陽)을 닮은 투혼(鬪魂)≫을 간행하고 단편 <악령(惡靈)>을 발표했다. 1969년 장편 ≪밤으로의 긴 여로(旅路)≫를 간행하고, 1970년 중편 <광인일기(狂人日記)>를 발표했다. 1971년 <광인일기>로 한국일보사 제정 제4회 한국창작문학상을 수상했다. 같은 해 장편 ≪사월산≫ 연재를 시작했다.
1972년 <광인일기>가 일본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에 ‘세계 10대 소설’로 선정되어 전면에 소개되었고, 장편 ≪흑염(黑焰)≫ 연재를 시작했다. 1973년 단편 <비가(悲歌)>를 발표하고 장편 ≪탈주자들≫을 연재했다. 1974년 창작집 ≪광인일기≫를 간행했다.
1976년 ≪밤으로의 긴 여로≫로 제1 회 반공문학상대통령상을 받았다. 1977년 창작집 ≪거도(巨盜)≫를, 1979년 장편 ≪가랑비≫를 간행했다. 1980년 장편 ≪사월산≫ ≪꼬르넷을 벗은 수녀(修女)≫를 간행하고 장편 ≪천국으로 이르는 길≫을 연재했다.
이후 15년 동안 ≪천국으로 이르는 길≫, ≪무정≫, ≪멀고 긴 날들과의 만남≫, ≪어느 수녀의 수기≫, ≪바람이여 산이여≫, ≪검은 장갑의 부루스≫, ≪낯설은 방≫, ≪파도 너머 저쪽≫, ≪탄≫, ≪광야≫ 등 다수의 장편을 상재하고, 중편집 ≪나성에서 온 사내≫와 작품집 ≪아버지≫를 간행하는 등 왕성한 창작 활동을 펼쳤다. 1988년 ≪바람이여 산이여≫로 한국문학 작가상을, 1996년에는 ≪광야≫로 한무숙 문학상을 수상했다.
........................

강용준 작품집 (지만지)

파도에 길을 묻다 - 강용준 (지성의 샘)
..................................................................
'VII. 아동, 청소년 > 1. 한국 문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금당벽화 - 정한숙 (한국헤르만헤세) (1) | 2023.05.30 |
|---|---|
| 고향 사람 - 강용준 (한국헤르만헤서) (0) | 2023.05.27 |
| 나들이 하는 그림 - 이청준 (다림) (0) | 2023.05.26 |
| 모반 - 오상원 (한국헤르만헤세) (0) | 2023.05.25 |
| 유예 - 오상원 (한국헤르만헤세) (0) | 2023.05.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