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효석 - 도시와 유령 (1928년, 조선지광)
어슴푸레한 저녁, 몇 리를 걸어도 사람의 그림자 하나 찾아볼 수 없는 무아지경인 산골짝 비탈길, 여우의 밥이 다 되어 버린 해골덩이가 똘똘 구르는 무덤 옆, 혹은 비가 축축이 뿌리는 버덩의 다 쓰러져 가는 물레방앗간, 또 혹은 몇 백 년이나 묵은 듯한 우중충한 늪가!
거기에는 흔히 도깨비나 귀신이 나타난다 한다. 그럴 것이다. 고요하고, 축축하고 우중충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칙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런 곳에서 그런 것을 본 적은 없다. 따라서 그런 것에 관하여서는 아무 지식도 가지지 못하였다. 하나 - 나는 자랑이 아니라 - 더 놀라운 유령을 보았다. 그러고 그것이 적어도 문명의 도시인 서울이니 놀랍단 말이다. 나는 그래도 문명을 자랑하는 서울에서 유령을 목격하였다. 거짓말이라구? 아니다. 거짓말도 아니고 환영도 아니었다. 세상 사람이 말하여 '유령'이라는 것을 나는 이 두 눈을 가지고 확실히 보았다.
어떻든 길게 말할 것 없이 다음 이야기를 읽으면 알 것이다. (p.144-145)
(같이 읽으면 좋은 책)

이디스 워튼 - 환상 이야기 (성소희 옮김, 레인보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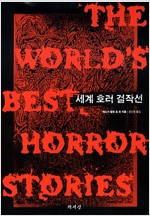
세계 호러 걸작선 - 이디스 워튼 (정진영 옮김, 책세상)
.........................................................................................
그날 저녁이다.
결국 나는 또 한번 거기를 가 보기로 작정하였다. 물론 김 서방은 뺑소니를 치고 나 혼자다. 뻔히 도깨비가 있는 줄 알면서 또 가기는 사실 속이 켕겼다. 하나 또 모든 의심을 풀어 버리고 그 진상을 알려 하니 나의 욕망은 그보다 크면 컸지 적지는 않았다. 나는 장차 닥쳐올 모험에 가슴을 벌떡이면서 발에다 용기를 주었다. (p.158)
그러나 장안의 여름밤을 아름다운 꿈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큰 실수이다. 거기에는 생활의 무거운 짐이 있다. 잔칫집 마당같이 들볶아 치는 야시에는 하루면 스물네 시간의 끊임없는 생활의 지긋지긋한 그림이 벌어져 있었다. 거기에는 낮과 다름없이 역시 부르짖음이 있고 싸움이 있고 땀이 있었다. (p.163)
군중의 숲에 싸여서 안 보이는 한 채의 자동차와 그 밑에 깔린 여인네 하나를 보았다. 바퀴 밑에는 선혈이 임리하고 그 옆에는 거지 아이 하나가 목을 놓고 울면서 쓰러져 있었다.
'자동차 안에는,'
하고 보니 아니나다를까 불량배와 기생 년들이 그득하였다.
"오라질 연놈들!"
"자동찰 타니 신이 나서 사람까지 치니."
"원 끔찍두 해라."
이런 말한마디를 주우면서 나는 어느 결에 그 자리를 밀려져 나왔었다.
"그래, 당신이 그...."
나는 되풀이하던 기억의 끝을 문뜩 돌려 이렇게 물었다.
"네, 그렇답니다. 달포 전에 그 원수의 자동차에 치여 가지구 병원엔지 무엔지를 끌구 가니 생전 저 어린것이 보구 싶어 겨딜 수 있어야지유. 그래 한 달두 채 못 돼 도루 나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놈의 다리가 또 아프기 시작해서 베길 수 있어야지유. 다리만 성하문야 그래두 돌아댕기면서 얻어먹을 수는 있지만..."
여인네는 차마 더 볼 수 없는 다리를 두 손으로 만지면서 울음에 느꼈다.
나는 그의 과거를 더 캐물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니 묻지 않아도 그의 대답은 뻔한 것이었다.
'집이 원래 가난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남편이 죽구 나니...'
비록 이런 대답은 안할지라도 그 운명이 그 운명이지 무슨 더 행복스런 과거를 찾아낼 수 있었으리요.
나의 눈에는 어느 결엔지 눈물이 그득히 고였었다. '동정은 우월감의 반쪽'일는지 아닐는지는 모른다. 하나 나는 나도 모르는 동안에 주머니 속에 든 대로의 돈을 모두 움켜서 뚝 떨어지는 눈물과 같이 그의 손에 쥐어 주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부리나케 그 자리를 뛰어나왔다.
이야기는 이만이다.
독자여 이만하면 유령의 정체를 똑똑히 알았겠지. 사실 나도 이제는 동대문이나 동관이나 종묘나 또 박 서방이 말한 빈 집터에 더 가 볼 것 없이 박 서방의 뼈 있는 말과 뜻 있는 웃음을 명백히 이해하였다.
독자여, 뭐 그래도 유령이라고? 그래 그럼 유령이라고 해두자. 그렇게 말하면 사실 유령일 것이다 - 살기는 살았어도 기실 죽어 있는 셈이니!
어떻든 유령이라고 해두고 독자여, 생각하여 보아라. 이 서울 안에 그런 유령이 얼마나 많이 늘어 가는가를!
늘어 간다고 하면 말이다. 또 되풀이하는 것 같지만 첫 페이지로 돌아가서,
어슴푸레한 저녁, 몇 리를 걸어도 사람의 그림자 하나 찾아볼 수 없는 무인지경인 산골짝 비탈길, 여우의 밥이 다 되어 버린 해골덩이가 똘똘 구르는 무덤 옆, 혹은 비가 축축이 뿌리는 버덩의 다 쓰러져 가는 물레방앗간, 또 혹은 몇 백 년이나 묵은 듯한 우중충한 늪가!
거기에 흔히 나타나는 유령이 적어도 문명의 도시인 서울에 오히려 꺼림 없이 나타나고 또 서울이 나날이 커가고 번창하여 가면 갈수록 유령도 거기에 정비례하여 점점 늘어가니 이게 무슨 뼈저린 현상이냐! 그리고 그 얼마나 비논리적, 마술적 알지 못할 사실이냐! 맹랑하고도 기막힌 일이다. 두말 할 것 없이 이런 비논리적 유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유령을 늘어 가지 못하게 하고 아니, 근본적으로 생기지 못하게 할 것인가?
현명한 독자여! 무엇을 주저하는가, 이 중하고도 큰 문제는 독자의 자각과 지혜와 힘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p.165-168)
(같이 읽으면 좋은 책)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조세희 (이성과힘)
....................................................................................
<작품 해설>
도시와 유령은 이효석이 1928년 <조광 지광>에 발표한 작품으로, 문단에 처음으로 발표한 단편 소설이자 이효석의 초기 문학 경향을 잘 알 수 있는 작품이다.
이효석의 초기 문학 작품은 의식적으로 계급 투쟁과 사회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동조를 내용을 화는 작품만을 창작하였는데, 그래서 그를 '동반자 작가'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도시와 유령은 이효석의 초기 문학적인 성향을 가장 잘 반영해 주는 대표적인 단편 소설로, 당시 시대적 상황과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독자의 각성을 촉구하는 선전, 선동적인 성격이 뚜렷이 나타나느 작품이다.
일정한 일터도 없이 뜨내기로 살며 매일 밤 동묘와 동대문 처마 밑에서 노숙을 하는 나는, 어느 날 동료 노숙자인 김 서방과 술을 한잔한 뒤 여느 날처럼 동묘의 처마 밑에서 잠을 자려고 하나 이미 노숙자들이 차 있어 동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희미한 도깨비물을 보고 혼비 백산을 하여 줄행랑을 치게 된다. 다음ㅈ날 도깨비의 정체를 확인하러 동묘 안으로 몽둥이를 들고 들어가 정체 모를 유령의 모습이 나타나자 몽둥이로 내리치려 하다가, 그 유령처럼 보였던 모습이 유령이 아니고 헐벗은 거지 모자임을 알게 된다.
그 노파는 달포 전에 어느 부자의 자동차에 치여, 다리 병신이 되어 걸어 다니는 것도 불편하여 구걸도 못하고 그곳에서 어렵게 목숨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난하고 힘없이 마치 유령처럼 되어 버린 그 모자를 진짜 유령으로 착각한 나는, 부끄러운 마음에 주머니 속에 있던 돈을 모두 털어 주고 그곳을 바져나오며 프롤레타리아의 기수처럼, 운동원처럼 독자들에게 도시에서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회의 책임과 문제를 외쳐 대는 것으로 이야기를 맺고 있는 것이 이 작품의 주요 내용이다.
이효석은 이 작품을 통해 사회에서 버림받은 불쌍한 거지 모자의 밑바닥 인생을 유령의 모습에 대비하여 충격적으로 묘사하고 제시하여, 가난의 문제를 독자들에게 강하게 각인시키고 나아가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항하여 부조리를 통렬히 비판하며, 프롤레타리아 운동에 독자들의 각성과 참여를 강조하는 당시 자신의 이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p.169-170)
....................................................................................................................................................................................................................................................

도시와 유령 - 이효석 (애플북스)

도시와 유령 - 이효석 (푸른생각)

메밀꽃 필 무렵 - 이효석 (문학과지성사)

메밀꽃 필 무렵 - 이효석 (새움)
..........................................................
'I. 한국 문학 > 2. 소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 조세희 (이성과 힘) (0) | 2024.07.05 |
|---|---|
| 통도사 가는 길 - 조성기 (민음사) (1) | 2024.03.09 |
| 장마 - 윤홍길 (민음사) (1) | 2023.12.29 |
| 수라도 - 김정한 (창비) (0) | 2023.09.22 |
| 모래톱 이야기 - 김정한 (창비) (0) | 2023.09.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