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빛문고
오영수 - 요람기 (1967년)
기차도 전기도 없었다.
라디오도 영화도 몰랐다.
그래도 소년은 고장 아이들과 함께 마냥 즐겁기만 했다.
봄이면 뻐꾸기 울음과 함께 진달래가 지천으로 피고, 가을이면 단풍과 감이 풍성하게 익는, 물 맑고 바람 시원한 산골 마을이었다.
먼 산골짜기에 얼룩얼룩 눈이 녹기 시작하고 흙바람이 불어 오면, 양지 쪽에 몰려 앉아 해바라기를 하던 고장의 아이들은 들로 뛰쳐나가 불놀이를 시작했다.
잔디가 고운 개울둑이나 논밭 두렁에 불을 놓는 것을 아이들은 '들불놀이'라고 했다.
겨우내 움츠리고 무료에 지친 아이들에게, 아직도 바람끝이 매운 이른 봄, 이 들불놀이만큼 신명나는 장난도 없었다.
바람이 없는 날, 불꽃은 잘 보이지 않으면서도 마치 흡수지가 물을 빨듯 꺼멓게 번져 가는 언덕이나, 큰 먹구렁이가 굼실굼실 기어가듯 타 들어가는 논밭 두렁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아지랑이는 온통 현기증이 나도록 하늘로만 피어올랐다.
이런 날일수록 산에는 안개가 짙고, 산발치 초가집 삭정이 울타리에는 빨래가 유난히도 희었다.
불 탄 두렁에는 유독 살진 쑥이 뽀오얗게 돋았고 쑥을 캐는 가시내들은 불 탄 두렁으로만 옹기종기 모여들었다. (p.49-50)
(같이 읽으면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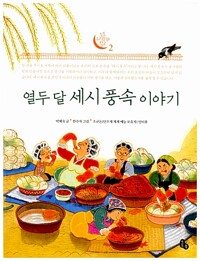
열두 달 세시 풍속 이야기 - 박혜숙 (토토북)
..........................................................................
벼포기에 물방울이 맺히고 모깃불에 타는 향긋한 풀 냄새에 쫓기듯 반딧불이 날았다.
"누야?"
"응!"
"박꽃은 왜 밤에만 피지?"
"낮에는 부끄러워서 그렇대!"
"와, 머가 부끄러워?"
"건 나도 몰라!"
"...."
"누야?"
"응!"
"별똥 참말 맛나나?"
"그렇대!"
"묵어 봤나?"
"아니!"
"우리 집에 별똥 하나 떨어지면 좋겠제?"
"별똥은 이런 집에는 안 떨어진대!"
"와?"
"몰라, 먼 먼 산 너머 아무도 못 가는 그런 데만 떨어진대!"
(...)
소년은 누나 옆에서 누워 별똥을 헤면서, 어른이 되면 별똥을 주우러 갈 다짐을 하다가 잠이 들곤 했다. (p.66-68)
콩이 누렁누렁 익으면 고장 아이들은 '콩서리'를 잘 해 먹었다.
마른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지피고 콩가지를 꺾어다 올려 놓으면 콩은 피이 피 - 김을 뿜고 익는다.
가지에서 콩꼬투리가 떨어져 까뭇까뭇해지면 불을 헤집고 콩을 주워 까 먹는다. 참 구수하고 달큰하다.
한동안 이렇게 콩서리를 먹고 나면 입 가장은 꼭 굴뚝족제비같이 까많게 돼 가지고 서로 바라보면서 웃어 댔다.
초가을 무렵부터 밤밭골에는 콩서리 연기가 모락 모락 피어오르지 않는 날이 별로 없었다.
혹 마을 어른들이 지나다가도 '이놈들 한 밭에서만 너무 많이 꺾지 마라!'할 뿐 별루 나무라지는 않았다. 그것은 어른 자시들도 아이 때는 밀서리, 콩서리를 하고 컸기 때문이었다. (p.68-69)
높새가 불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기를 쓰고 연을 날렸다. 이 고장에서는 유독 연날리기가 심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연을 무척 좋아했고 많이 날렸다.
한 말로 연이라지만 연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
가오리연, 문어연, 솔개연, 방구연 - 방구연에는 홍연과 상주연이 있다.
홍연은 종이에 물을 들인 붉은 연이고, 상주연은 흰 종이 그대로 발라 만든 연이다.
연의 재미는 역시 연싸움에 있었다. 당사에다 아교를 먹여 유리 가루를 묻힌 것을 '사'라고 했다. 사가 잘 먹은 실에는 손을 베기가 일쑤였다. 이렇게 사를 먹인 실을 자새가 두툼하게 감고 홍연을 높직이 바람에 태워 가지고 싸움에 나설 때는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 같은 기세였다.
이런 것은 주로 어른들의 연이고 아이들은 꽁지가 긴 가오리연이나 솔개연이 고작이었다. 멀리서 싸움 연이 거만하게, 또는 위풍이 당당하게 싸움을 걸어 오면 아이들은 재빨리 연을 감아 버리거나 달아나 버려야 했다. 그러나 싸움 연이 워낙 빨라서 미처 피하기도 전에 얽히고 보면 영락없이 떼이고 만다.
떼인 연이 가까운 곳에 내려앉으면 주워 오기도 하지만 개울이나 무논에 떨어지면 그만이었다. 연을 떼이고 발버둥을 치면서 우는 아이도 많았다.
연도 정월 보름까지였다. 보름이 지난 뒤에도 연을 날리면 쌍놈이라고 했다.
그래서 정월 보름날이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연을 날려 보내기로 돼 있었다. 숯가루를 꼭 궐련 모양으로 한지에 말아 가지고 연에서 두어 자 앞 실에다 매달고 꽁무니에 불을 붙여 연을 올린다.
이 때는 실이 닿는 한 멀리 높게 높게 올린다.
숯가루 궐련이 점점 타 들어가서 실에 닿으면 연은 실과 자새와 주인만을 남기고 팔랑 떠나가 버린다.
어쩌면 새처럼 어쩌면 나뭇잎처럼 까마득히 떠나가는 연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은 제 연이 멀리멀리 떠나가기를 마음 속으로 바랐다.
언제나 가 보고 싶으면서도 가 보지 못하는 산과 강과 마을, 어쩌면 무지개가 선다는 늪, 이빨 없는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다는 산 속, 집채보다도 더 큰 고래가 헤어 다닌다는 바다, 별똥이 떨어지는 어디메쯤 - 소년은 이렇게 떠 가는 연에다 수많은 꿈과 소망을 띄워 보내면서 어느새 인생의 희비애환과 이비를 가릴 줄 아는 나이를 먹어 버렸다. (p.74-76)
(같이 읽으면 좋은 책)

세시 풍속과 전통 놀이 - 최정원 (뭉치)
.............................................................................................................................................................................................................................
오영수(吳永壽, 1909년 2월 11일 ~ 1979년 5월 15일)
대한민국의 소설가이다. 본관은 해주(海州)이며 호(號)는 월주(月洲)였다가 말년에 난계(蘭溪)로 바꾸었다.
경상남도 언양군 언양읍(현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상북면 동부리에서 1909년 2월 11일에 출생하였다. 1926년 언양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며, 1933년에 일본에서 중학교 졸업 후 귀국하였지만 6년 후 1939년 일본으로 다시 건너가, 1941년 도쿄 고쿠인 국민예술학원을 졸업하였다. 그 후 경남여자고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였다.
1949년 〈남이와 엿장수〉를 《신천지》에 발표하였고, 〈머루〉가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됨으로써 문단에 등장하였다. 한국문인협회상·아시아 자유문학상을 받았으며, 저서로 단편집 《머루》 · 《갯마을》 · 《메아리》, 《오영수 전집》 등 5권이 있다.
1979년 5월 15일에 간암으로 웅촌면 곡천리의 자택에서 71세로 세상을 떠났다. 사후 언양읍 송대리에 있는 화장산 선영에 묻혔다.
....................................

갯마을 - 오영수 (커무니케이션북스)

갯마을 - 오영수 (창비 20세기한국소설)
.....................................................................
'I. 한국 문학 > 2. 소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별을 헨다 - 계용묵 (창비) (1) | 2023.02.19 |
|---|---|
| 백치 아다다 - 계용묵 (창비) (2) | 2023.02.19 |
| 사랑손님과 어머니 - 주요섭 (창비) (0) | 2023.02.06 |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 이문열 (아침나라) (1) | 2023.02.05 |
| 메밀꽃 필 무렵 - 이효석 (문학과지성사) (2) | 2023.02.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