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비 20세기 한국문학
주요섭 - 사랑손님과 어머니 (1935년)
나는 금년 여섯 살 난 처녀애입니다. 내 이름은 박옥희이구요. 우리집 식구라구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우리 어머니와 단 두 식구뿐이랍니다. 아차 큰일 났군. 외삼촌을 빼놓을 뻔했으니.
지금 중학교에 다니는 외삼촌은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는지 집에는 끼니때나 외에는 별로 붙어 있지를 않으니까 어떤 때는 한 주일씩 가도 외삼춘 코빼기도 못 보는 때가 많으니까요. 깜빡 잊어버리기도 예사지요, 무얼.
우리 어머니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둘도 없이 곱게 생긴 우리 어머니는, 금년 나이 스물네 살인데 과부랍니다. 과부가 무엇인지 나는 잘 몰라도 하여튼 동리 사람들이 날더러 '과부 딸'이라고들 부르니까 우리 어머니가 과부인 줄을 알지요. 남들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나만은 아버지가 없지요. 아버지가 없다고 아마 '과부 딸'이라나봐요. (p.13-14)
그 아저씨는 그림책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사랑방으로 나가면 그 아저씨는 나를 무릎에 앉히고 그림책들을 보여줍니다. 또 가끔 과자도 주구요.
어느 날은 점심을 먹고 이내 살그머니 사랑에 나가보니까 아저씨는 그때에야 점심을 잡수셔요. 그래 가만히 앉아서 점심 잡숫는 걸 구경하고 있누라니까, 아저씨가
"아저씨는 무슨 반찬이 제일 맛나우?"
하고 물으니까, 그는 한참이나 빙그레 웃고 있드니,
"나두 삶은 달걀."
하겠지요. 나는 좋아서 손뼉을 짤깍짤깍 치고
"아, 나와 같네, 그럼. 가서 어머니한테 알려야지."
그러시지요. 그래두 나는 한 번 맘을 먹은 댐엔 꼭 그대루 하구야 마는 성미지요. 그래 안마당으로 뛰쳐들어가면서,
"엄마, 엄마, 사랑 아저씨두 나처럼 삶은 달걀을 제일 좋아한대."
하고 소리를 질렀지요.
"떠들지 말어."
하고, 어머니는 눈을 흘기십니다.
그러나 사랑 아저씨가 달걀을 좋아하는 것이 내게는 썩 좋게 되었어요. (p.17-18)
나는 아저씨가 아주 좋았어요. 마는 외삼춘은 가끔 툴툴하는 때가 있었어요. 아마 아저씨가 마음에 안 드나봐요. 아니, 그것보다도 아저씨 상 심부름을 꼭 외삼춘이 하게 되니까 그것이 실어서 그러나봐요. 한번은 어머니와 외삼춘이 말다툼하는 것까지 내가 들었어요. 어머니가
"야, 또 어데 나가지 말구 사랑에 있다가 선생님 들어오시거든 상 내가야지."
하고 말씀하시니까, 외삼춘은 얼굴을 찡그리면서
"제길, 남 어데 좀 볼일이 있는 날은 으례이 끼니때에 안 들어오고 늦어지니...."
하고 툴툴하겠지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러니 어짜간니? 너밖에 사랑 출입할 사람이 어데 있니?"
"누님이 좀 상 들구 나가구려. 요샛세상에 내외합니까!"
어머니는 갑자기 얼굴이 발개지시고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외삼춘에게 향하야 눈을 흘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춘은 흥흥 웃으면서 사랑으로 나갔지요. (p.19)
"엄마, 이 풍금 좀 타봐!"
하고 재촉하니까 어머니 얼굴은 약간 흐려지면서
"그 풍금은 너희 아버지가 날 사다주신 거란다. 너희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는 그 풍금은 이때까지 뚜껑두 한 번 안 열어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금방 또 울음보가 터질것만같이 보여서 나는 그만
"엄마, 나 사탕 주어."
하면서 아랫방으로 끌고 내려왔습니다. (p.20-21)
(같이 읽으면 좋은 책)

내 마음의 풍금 - 하근찬 (바다출판사)
...................................................................
아저씨가 사랑방에 와 계신 지 벌써 여러 밤을 잔 뒤입니다. 아마 한 달이나 되었지요. 나는 거의 매일 아저씨 방에 놀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나더러 그렇게 가서 귀찮게 굴면 못쓴다고 가끔 꾸지람을 하시지만 정말인즉 나는 조곰도 아저씨를 귀찮게 굴지는 않었습니다. 도리어 아저씨가 나를 귀찮게 굴었지요.
"옥희 눈은 아버지를 닮었다. 고 고군 코는 아마 어머니를 닮었지, 고 입하고! 응, 그러냐, 안 그러냐? 어머니도 옥희처럼 곱지, 응?..."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물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저씨, 입때 우리 엄마 못 봤수?"
하고 물었더니 아저씨는 잠잠합니다. 그래 나는
"우리 엄마 보러 들어갈까?
하면서 아저씨 소매를 잡아댕겼드니, 아저씨는 펄쩍 뛰면서,
"아니, 아니, 안돼. 난 지금 분주해서."
하면서 나를 잡아끌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는 무슨 그리 분주하지도 않은 모양이었어요. 그러기 나더러 가란 말도 않고 그냥 나를 붙들고 앉어서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뺨에 입도 맞추고 하면서
"요 저구리 누가 해주지?...밤에 엄마하구 한자리에서 자니?"
라는 둥 쓸데없는 말을 자꾸만 물었지요!
그러나 웬일인지 나를 그렇게도 귀애해주든 아저씨도 아랫방에 외삼춘이 들어오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지요. 이것저것 묻지도 않고 나를 꼭 껴안지도 않고 점잖게 앉어서 그림책이나 보여주고 그러지요. 아마 아저씨가 우리 외삼춘을 무서워하나봐요.
하여튼 어머니는 나더러 너무 아저씨를 귀찮게 한다고 어떤 때는 저녁 먹고 나서 나를 꼭 방 안에 가두어두고 못 나가게 하는 때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곰 있다가 어머니가 바느질에 정신이 팔리어서 골몰하고 있을 때 몰래 가만히 일어나서 나오지요. 그런 때에는 어머니는 내가 문 여는 소리를 듣고야 파딱 정신을 채려서 쫓아와 나를 붙들지요. 그러나 그런 때는 어머니는 골은 아니 내시고
"이리 온, 이리 와서 머리 빗고...."
하고 끌어다가 머리를 다시 곱게 땋아주지요.
"머리를 곱게 땋고 가야지. 그렇게 되는대루 하구 가문 아저씨가 숭보시지 않니."
하시면서, 또 어떤 때에는 머리를 다 땋아주시고는
"응, 저구리가 이게 무어냐?"
하시면서 새 저고리를 내어주시는 때도 있었습니다. (p.21-22)
뒷동산에 올라가서는 정거장을 한참 내려다보았으나 기차는 안 지나갔습니다. 나는 풀잎을 쭉쭉 뽑아보기도 하고 땅에 누운 아저씨의 다리를 가서 꼬집어보기도 하면서 놀았습니다. 한참 후에 아저씨가 손목을 잡고 내려오는데 유치원 동무들을 만났습니다.
"옥희가 아빠하구ㅜ 어디 갔다 온다, 응."
하고 한 동무가 말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때 나는 얼마나 이 아저씨가 정말 우리 아버지였드라면 하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정말로 한 번만이라도
"아빠!"
하고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렇게 아저씨하고 손목을 잡고 골목골목을 지나오는 것이 어찌도 재미가 좋았는지요.
나는 대문까지 와서
"난 아저씨가 우리 아빠래문 좋겠다."
하고 불쑥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나를 몹시 흔들면서
"그런 소리 하문 못써."
하고 말하는데 그 목소리가 몹시도 떨렸습니다. 나는 아저씨가 몹시 성이 난 것처럼 보여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어데까지 갔댄?"
하고 나와 안으며 묻는데, 나는 대답도 못하고 그만 쿨쩍쿨쩍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서
"옥희야, 왜 그러니? 응?"
하고 자꾸만 물었으나 나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p.23-24)
예배당에 가서 찬미하고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간에 갑자기 나는, "혹시 아저씨두 예배당에 오지 않었나? 하는 생각이 나서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 남자석을 바라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 바로 거기에 아저씨가 와 앉어 있겠지요. 그런데 아저씨는 어른이면서도 눈감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처럼 눈을 번히 뜨고 여기저기 두리번두리번 바라봅니다. 나는 얼른 아저씨를 알아보았는데 아저씨는 나는 못 알아보았는지 내가 방그레 웃어 보여도 웃지도 않고 멀거니 보고만 있겠지요. 그래 나는 손을 흔들었지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말드군요. 그때에 어머니가 내가 팔 흔드는 것을 깨닫고 두 손으로 나를 붙들고 끌어당기드군요. 나는 어머니 귀에다 입을 대고
"저기 아저씨두 왔어."
하고 속삭이니까 어머니는 흠칫하면서 내 입을 손으로 막고 막 끌어 잡아다가 앞에 앉히고 고개를 누르드군요. 보니까 어머니가 또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군요.
그날 예배는 아주 젬병이었어요. 웬일인지 예배 다 끝날 때까지 어머니는 성이 나서 강대만 향하야 앞으로 바라보고 앉었고, 이전 모양으로 가끔 나를 내려다보고 웃는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저씨를 보려고 남자석을 바라다보아도 아저씨도 한 번도 바라다보아주지도 않고 성이 나서 앉어 있고, 어머니는 나를 보지도 않고 공연히 꽉꽉 잡어당기지요. 왜 모두들 그리 성이 났는지! 나는 그만 으아 하고 한 번 울고 싶었어요. 그러나 바로 멀지 않은 곳에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앉어 있는 고로 울고 싶은 것을 아주 억지로 참었답니다. (p.25-26)
"그 꽃은 어데서 났니? 퍽 곱구나."
하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걸 엄마 드릴라구 유치원서 가져왔어" 하고 말하기가 어째 몹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잠깐 망설이다가
"응, 이 꽃! 저, 사랑 아저씨가 엄마 갖다주라구 줘."
하고 불쑥 말했습니다. 그런 거짓말이 어데서 그렇게 툭 튀어나왔는지 나도 모르지요.
꽃을 들고 냄새를 맡고 있든 어머니는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무엇에 몹시 놀란 사람처럼 화닥닥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금시에 어머니 얼굴이 그 꽃보다도 더 빨갛게 되었습니다. 그 꽃을 든 어머니 손구락이 파르르 떠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무서운 것을 생각하는 듯이 방 안을 휘 한 번 둘러보시더니
"옥희야, 그런 걸 받아오문 안돼."
하고 말하는 목소리는 몹시 떨렸습니다. 나는 꽃을 그렇게도 좋아하는 어머니가 이 꽃을 받고 그처럼 성을 낼 줄은 참으로 뜻밖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도 성을 내는 것을 보니까 그 꽃을 내가 가져왔다고 그러지 않고 아저씨가 주더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 참 잘되었다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성을 내는 까닭을 나는 모르지만 하여튼 성을 낼 바에는 내게 내는 것보다 어저씨에게 내는 것이 내게는 나었기 때문입니다. 한참 있더니 어머니는 나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옥희야, 너 이 꽃 이 얘기 아무보구두 하지 말아라, 응."
하고 타일러주었습니다. 나는
"응."
하고 대답하면서 고개를 여러 번 까닥까닥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꽃을 곧 내버릴 줄로 나는 생각했습니다마는 내버리지 않고 꽃병에 꽂아서 풍금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아마 퍽 여러 밤 자도록 그 꽃은 거기 놓여 있어서 마지막에는 시들었습니다. 꽃이 다시들자 어머니는 가위로 그 대는 잘라 내버리고 꽃만은 찬송가 갈피에 곱게 끼워두었습니다.
내가 어머니께 꽃을 갖다 주든 날 밤에 나는 또 사랑에 놀러 나가서 아저씨 무릎에 앉어서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저씨 몸이 흠칫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귀를 기울입니다. 나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풍금 소리!
그 풍금 소리는 분명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풍금 타나부다."
하고 나는 벌떡 일어나서 안으로 뛰어왔습니다. 안방에는 불을 켜지 않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음력으로 보름께가 되어서 달이 낮같이 밝은데 은빛 같은 흰 달빛이 방 한 절반 가득히 차 있었습니다. 나는 흰옷을 입은 어머니가 풍금 앞에 앉어서 고요히 풍금을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나이 지금 여섯 살밖에 안되었지마는 하여튼 어머니가 풍금을 타시는 것을 보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마는 어머니는 내가 곁에 온 것도 깨닫지 못하는지 그냥 까딱 아니하고 앉어서 풍금을 탔습니다. 조곰 있더니 어머니는 풍금 곡조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렇게도 아름다운 것도 나는 이때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참으로 우리 유치원 선생님보다도 목소리가 훨씬 더 곱고 또 노래도 훨씬 더 잘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서서 어머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노래는 마치 은실을 타고 저 별나라에서 내려오는 노래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얼마 오래지 않어 목소리는 약간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노랫소리, 그에 따라 풍금의 가는 소리도 바르르 떠는듯했습니다. 노랫소리는 차차 가늘어지드니 마지막에는 사르르 없어져버렸습니다. 풍금 소리도 사르르 없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고요히 풍금에서 일어나시더니 옆에 섰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 어머니는 나를 안고 마루로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모 말씀도 없이 그냥 나를 꼭꼭 껴안는 것이었습니다. 달빛을 함뿍 받는 내 어머니의 얼굴은 몹시도 쌔하얗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참으로 천사 같다고 나는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쌔하얀 두 뺨 위로는 쉴 새 없이 두 줄기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니 나도 갑자기 울고 싶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울어?"
하고 나도 쿨쩍거리면서 물었습니다.
"옥희야."
"응?"
한참 동안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참 후에,
"옥희야, 난 너 하나문 그뿐이다."
"엄마."
어머니는 다시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p.30-33)
하루는 밤에 아저씨 방에서 놀다가 졸려서 안방으로 들어오려고 일어서니까 아저씨가 하 - 얀 봉투를 서랍에서 꺼내어 내게 주었습니다.
"옥희, 이것 갖다가 엄마 드리고 지나간 달 밥값이라구, 응."
나는 그 봉투를 갖다가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봉투를 받아 들자 갑자기 얼굴이 파랗게 질리었습니다. 그 전날 달밤에 마루에 앉었을 때보다도 더 쌔하얗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봉투를 들고 어쩔 줄을 모르는 듯이 초조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거 지나간 달 밥값이래."
하고 말을 하니까 어머니는 갑자기 잠자다 깨나는 사람처럼
"응?"
하고 놀라더니 또 금시 백지장같이 쌔하얗든 얼굴이 발갛게 물들었습니다. 봉투 속으로 들어갔든 어머니의 파들파들 떨리는 손고락이 지전을 몇 장 끌고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에 약간 웃음을 떠면서 후 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다시 어머니는 무엇에 놀랐는지 흠칫하더니 금시에 얼굴이 다시 쌔하얘지고 입술이 바를르 떨었습니다. 어머니의 손ㄴ을 바라다보니 거기에는 지전 몇 장 외에 네모로 접은 하 - 얀 조이가 한 장 잡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무슨 결심을 한 듯이 입숭을 악물고 그 조이를 채근채근 펴 들고 그 안에 쓰인 글을 읽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 무슨 글이 씌어 있는지 알 도리가 없었으나 어머니는 그 글을 읽으면서 금시에 얼굴이 파랬다 발갰다 하고 그 조이를 든 손은 잊는 바들바들이 아니라 와들와들 떨리어서 그 조이가 부석부석 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한참 후에 어머니는 그 조이를 아까 모양으로 네모지게 접어서 돈과 함께 봉투에 도루 넣어 반짇그릇에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정신나간 사람처럼 멀거니 앉어서 전등만 치어다보는데 어머니 가슴이 불룩불룩합니다. 나는 어머닌가 혹시 병이나 나지 않었나 하고 염려가 되어서 얼른 가서 무릎에 안기면서
"엄마, 잘까?"
하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 뺨에 입을 맞추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입술이 어쩌면 그리도 뜨거운지요. 마치 불에 달군 돌이 볼에 와 닿는 것 같았습니다. (p.33-35)
"옥희야, 너 아빠가 보고 싶니?"
하고 물으십디다.
"응, 우리두 아빠 하나 있으문."
하고 나는 혀를 까부리고 어리광을 좀 부려가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한참 동안을 어머니는 아모 말씀도 아니하시고 천정만 바라다보시드니
"옥희야, 옥희 아버지는 옥희가 세상에 나오기두 전에 돌아가셨단다. 옥희두 아빠가 없는 건 아니지. 그저 일즉 돌아가셨지. 옥희가 이제 아버지를 새로 또 가지면 세상이 욕을 한단다. 옥희는 아직 철이 없어서 모르지만 세상이 욕을 한단다. 사람들이 욕을 해. 옥희 어머니는 홰냉년이다 이러구 세상이 욕을 해. 옥희 아버지는 죽었는데 옥희는 아버지가 또 하나 생겼대, 참 망측두 하지. 이러구 세상이 욕을 한단다. 그리 되문 옥희는 언제나 손구락질 받구. 옥희는 커두 시집두 훌륭한 데 못 가구. 옥희가 공부를 해서 훌륭하게 돼두. 에 그까짓 홰냥년의 딸, 이러구 남ㅁ들이 욕을 한단다." (p.38-39)
그날 밤 저녁밥 먹고 나니까 어머니는 나를 불러 앉히고 머리를 새로 빗겨주었습니다. 댕기도 새 댕기를 드려주고, 바지, 저고리, 치마, 모두 새것을 꺼내 입혀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
하고 물으니까
"아니."
하고 웃음을 띠면서 대답합니다. 그러더니 풍금 옆에서 새로 대린 하 - 얀 손수건을 내리어 내 손에 쥐어주면서,
"이 손수건, 저 사랑 아저씨 손구건인데, 이것 아저씨 갖다드리구 와, 응. 오래 있지 말구 손수건만 갖다드리구 이니 와, 응."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수건을 들고 사랑으로 나가면서 나는 그 손수건 접이 속에 무슨 발각발각하는 종이가 들어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펴보지 않고 그냥 갖다가 아저씨에게 주었습니다.
아저씨는 방에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손수건을 받는데, 웬일인지 아저씨는 이전처럼 나보고 빙그레 웃지도 ㅇ낳고 얼굴이 몹시 파래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입술을 질근질근 깨밀면서 말 한마디 아니하고 그 수건을 받느군요.
나는 어째 이상한 기분이 돌아서 아저씨 방에 들어가 앉지도 못하고 그냥 뒤돌아서 안방으로 들어왔지요. 어머니는 풍금 앞에 앉어서 무엇을 그리 생각하는지 가만히 들어왔지요. 어머니는 풍금 앞에 앉어서 무엇을 그리 생각하는지 가만히 있드군요. 나는 풍금 옆으로 가서 가만히 그 옆에 앉어 있었습니다. 이윽고 어머니는 조용조용히 풍금을 타십니다. 무슨 곡조인지는 몰라도 어째 구슬푸고 고즈낙한 곡조야요.
밤이 늦도록 어머니는 풍금을 타셨습니다. 그 구슬푸고 고즈낙한 곡조를 계속하고 또 계속하면서. (p.40-41)
여러 밤을 자고 난 어떤 날 오후에 나는 오래간만에 아저씨 방엘 나가보았더니 아저씨가 짐을 싸누라구 분주하겠지요. 내가 아저씨에게 손수건을 갖다드린 다음부터는 웬일인지 아저씨가 나를 보아도 언제나 퍽 슬픈 사람, 무슨 근심이 있는 사람처럼 아모 말도 없이 나를 물끄러미 바라다만 보고 있는 고로 나도 그리 자주 놀러 나오지 않었든 것입니다. 그랬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짐을 꾸리는 것을 보고 나는 놀랐습니다.
"아저씨, 어데 가우?"
"응, 멀리루 간다."
"언제?"
"오늘."
"기차 타구?"
"응, 기차 타구."
"갔다가 언제 또 오우?"
아저씨는 아무 대답도 없이 서랍에서 이뿐 인형을 하나 꺼내서 내게 주었습니다.
"옥희, 이것 가져, 응. 옥희는 아자씨 가구 나문 아자씨 이내 잊어버리구 말겠지!"
나는 갑자기 슬퍼졌습니다. 그래서
"아니."
하고 얼른 대답하고 인형을 안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것 봐. 아자씨가 이것 나 줬다우. 아자씨가 오늘 기차 타구 먼 데루 간대."
하고 내가 말했으나,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십니다.
"엄마, 어자씨 왜 가우?"
"학교 방학했으니깐 가지."
"어데루 가우?"
"아자씨 집으루 가지, 어데루 가."
"갔다가 또 오우?"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십니다.
"난 아자씨 가는 거 나쁘다."
하고 입을 쫑깃했으나, 어머니는 그 말은 대답 않고
"옥희야, 벽장에 가서 달걀 몇 알 남았나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깡충깡충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달걀은 여섯 알이 있었습니다.
"여스 알."
하고 나는 소리쳤습니다.
"응, 다 가지구 이리 나오나라."
어머니는 그 달걀 여섯 알을 다 삶었습니다. 그 삶은 달걀 여섯 알을 손수건에 싸놓고 또 반지에 소곰을 조곰 싸서 한 구퉁이에 넣었습니다.
"옥희야, 너 이것 갖다 아저씨 드리구, 가시다가 찻간에서 잡수시랜다구, 응." (p.41-43)
"아, 저기 기차 온다."
하고 나는 좋아서 소리쳤습니다.
기차는 정거장에 잠ㅅ히 머물더니 금시에 삑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움즉이었습니다.
"기차 떠난다."
하면서 나는 손뼉을 쳤습니다. 기차가 저편 산모퉁이 뒤로 사라질 때까지, 어머니는 가만히 서서 그것을 바라다보았습니다.
뒷동산에서 내려오자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시드니 이때까지 뚜껑을 늘 열어두었든 풍금 뚜껑을 닫으십니다. 그러고는 거기 쇠를 채우고 그 위에다가 이전 모양으로 반짇그릇을 얹어놓으십디다. 그러고는 그 옆에 있는 찬송가를 맥없이 들고 뒤적뒤적하시드니 뺏뺏 마른 꽃송이를 그 갈피에서 집어내시드니
"옥희야, 이것 내다버려라."
하고 그 마른 꽃을 내게 주었습니다. 그 꽃은 내가 유치원에서 갖다가 어머니께 드렸든 그 꽃입니다. 그러자 옆대문이 삐걱 하더니
"달걀 사소."
하고 매일 오는 달걀 장수 노친네가 달걀 버주기를 이고 들어왔습니다.
'인젠 우리 달걀 안 사요. 달걀 먹는 이가 없어요."
하시는 어머니의 이 말씀에 놀라서 떼를 좀 써보려 했으나 석양에 빤히 비치는 어머니 얼굴을 볼 때 그 용기가 없어지구 말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주신 인형 귀에다가 내 입을 갖다 대고 가만히 속삭이었습니다.
"얘, 우리 엄마가 거즛부리 썩 잘하누나. 내가 달걀 좋아하는 줄 잘 알문성 생 먹을 사람이 없대누나. 떼를 좀 쓰구 싶다만 저 우리 엄마 얼굴을 좀 봐라. 어쩌문 저리두 새파래졌을까? 아마 어데가 아픈가보다."
라고요. (p.43-45)
...........................................................................................................................................................................................................................
주요섭(朱耀燮, 1902년 11월 24일 ~ 1972년 11월 14일)
대한민국의 소설가, 시인, 영문학자로 아호는 여심(餘心)·여심생(餘心生), 본관은 신안(新安)이다.
평양의 숭덕소학교를 거쳐 1918년 숭실중학 3학년 때 아버지를 따라 일본으로 가 아오야마학원[靑山學院] 중학부 3학년에 편입하였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귀국하여 지하신문을 발간하다가 출판법 위반으로 10개월의 형을 받았다.1920년 중국으로 가 쑤저우[蘇州] 안세이중학[安晟中學]을 거쳐 1921년 상하이 후장대학[滬江大學] 부속중학교를 졸업하였고, 1927년에는 후장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였다.1928년 미국으로 건너가 스탠포드대학원에서 교육심리학을 전공한 뒤 1929년 귀국하였다. 1931년 동아일보사에 입사하여 『신동아(新東亞)』의 주간으로 일하다가 1934년 중국의 베이징 푸렌대학[輔仁大學] 교수로 취임하였다.1943년 일본의 대륙 침략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방령을 받아 귀국하였다. 1946년부터 1953년 사이에 상호출판사(相互出版社) 주간과 『코리아타임스』의 주필을 역임하였다.1953년부터 경희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1954년부터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사무국장, 1961년 코리안리퍼블릭 이사장, 1968년 한국문학번역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한편, 1959년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국제펜클럽 제30차 세계작가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였고, 1963년 미국의 미주리대학 등 6개 대학에서 ‘아시아 문화 및 문학’을 강의하기도 하였다.
1921년 4월『개벽(開闢)』 제10호에 단편소설 「추운 밤」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여 「여대생과 밍크코우트」(1970)에 이르기까지 40편 가량의 단편소설을 비롯하여 「구름을 잡으려고」(1923)와 「길」(1938) 등 4편의 장편소설과 「첫사랑」(1925)과 「미완성(未完成)」(1936) 등 2편의 중편소설을 남겼다. 「김유신(Kim Yu Shin)」(1947과 「The Frost of the White Rock」(1963) 등의 영문 소설도 있다.
그의 작품 세계는 대략 4단계의 변모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첫째는 「추운 밤」부터 「인력거군(人力車軍)」(1925)·「살인(殺人)」(1925)·「개밥」(1927) 등이 쓰여진 1921년부터 1927년까지의 시기로 주로 극빈한 사람들의 생활과 갈등을 동정하는 시선과 인도주의적 자세로 그려보였다. 이것은 이른바 신경향파로 지목되는 당대의 유행적 경향과도 일치한다.둘째는 「할머니」(1930)에서 「사랑손님과 어머니」(1935)·「아네모네의 마담」(1936)·「추물(醜物)」(1936)·「봉천역식당(奉天驛食堂)」(1937)·「왜 왔던고」(1937)에 이르는 시기로, 문단의 주목을 받게 된 것도 바로 이 때이다. 그의 대표작 및 성숙한 작품들이 발표되었으며 기성 윤리나 외모 또는 배신으로 인한 사랑의 좌절이나 향수 등을 그려 삶의 의미를 추구하였다.셋째는 1946년부터 1958년까지의 시기로 「입을 열어 말하라」(1946)·「대학교수(大學敎授)와 모리배(謀利輩)」(1948)·「해방일주년(解放一周年)」(1948)·「이십오년」(1950) 등을 통하여 광복 후의 무질서와 혼란을 고발하고 비판하면서 사회의식을 각성하고 자아의 자각을 탐색하여나갔다.넷째는 1960년부터 1970년까지의 시기로 「세 죽음」(1965)·「열 줌의 흙」(1967)·「죽고 싶어하는 여인」(1968)·「여대생과 밍크코우트」 등을 통하여 삶과 죽음의 문제, 인간다운 삶의 문제 등을 다루었다. 이러한 변모 과정은 근대적 리얼리즘의 일반적인 성격이 한국 문학 속에서 보편적인 태도와 기법으로 나타나게 되는 데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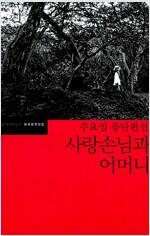
사랑손님과 어머니 - 주요섭 (문학과지성사)

사랑손님과 어머니 - 주요섭 (글누림)
................................................................
'I. 한국 문학 > 2. 소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백치 아다다 - 계용묵 (창비) (2) | 2023.02.19 |
|---|---|
| 요람기 - 오영수 (다림) (0) | 2023.02.09 |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 이문열 (아침나라) (1) | 2023.02.05 |
| 메밀꽃 필 무렵 - 이효석 (문학과지성사) (2) | 2023.02.01 |
| 날개 - 이상 (문학과지성사) (0) | 2023.02.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