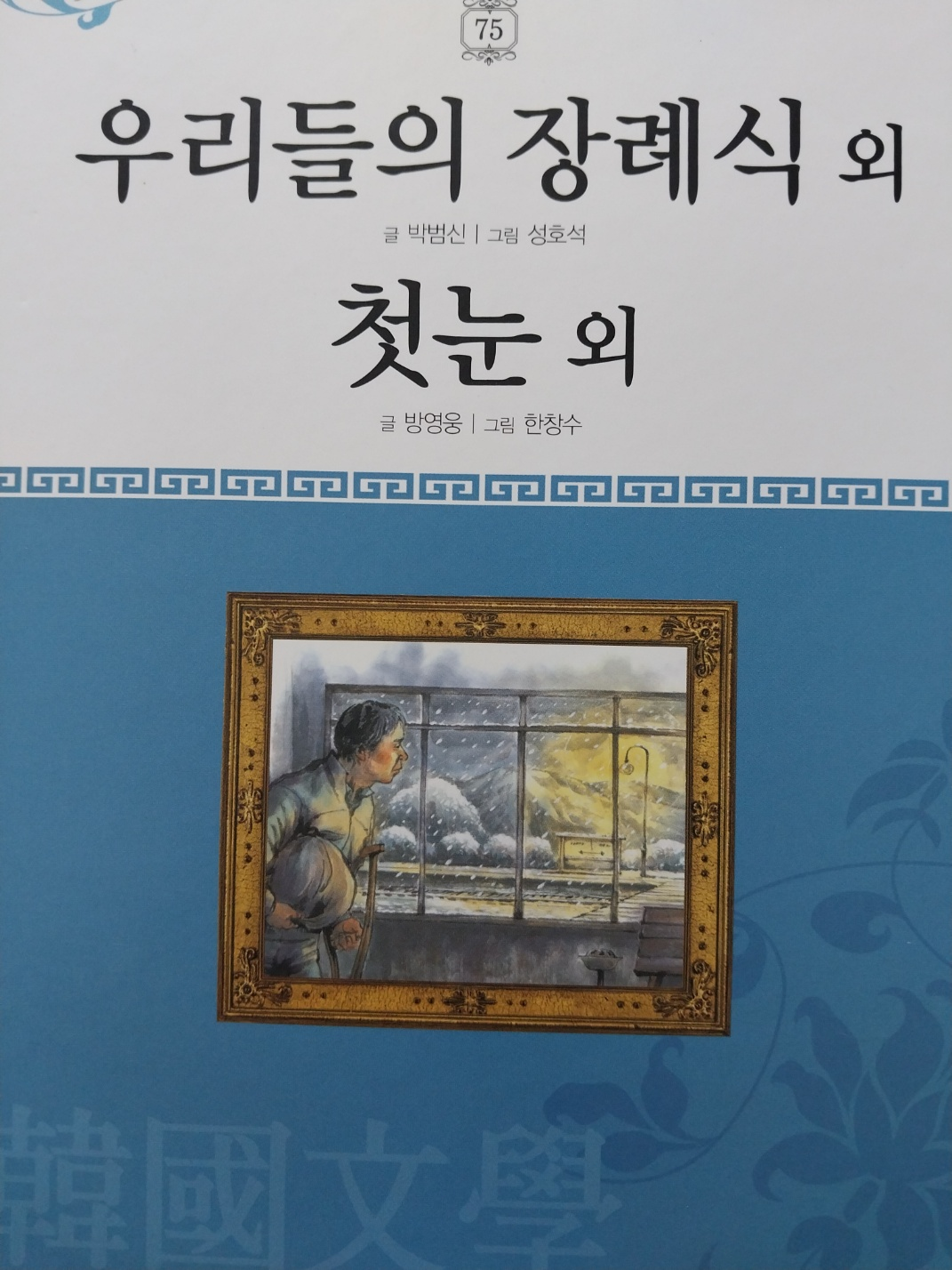
큰한국문학 413 (75권)
목차
박범신
우리들의 장례식
토끼와 잠수함
방영웅
첫눈
노새
.....................................................
박범신 - 토끼와 잠수함 (1973년)
제복의 사내는 나의 어깨를 탁 쳐서 밀어넣고 회색의 문을 닫았다. 버스는 곧 파출소 앞을 출발하여 여름날 오후의 뜨거운 태양이 송글송글 묻어나서 찐득거리는 도심지로 빨려 들어갔다. 나는 엉거주춤 출입구 근처에 선 채 아직 반도 메워지지 않은 버스 속의 갖가지 모양을 한 사람들을 멀거니 둘러보았다.
"뭘 하고 있어?"
갈라져서 오히려 뾰족하게 박혀 오는 목소리가 등을 때렸다. 어깨를 쳐서 밀어넣던 제복의 사내가 옆의 빈 좌석을 가리키고 있었다. 사내의 눈은 체격에 비해 형편없이 작고 차가웠다. 나는 괜히 허둥대며 의자에 앉았다.
"빌어먹을, 당신도 재수가 없는 사람이오. 나도 여럿이 건넜는데 혼자 걸려들었수."
옆에 앉은 텁수룩한 중년의 사내가 나직이 말했다. (p.55)
버스는 단단히 출구를 닫고서 다시 그곳을 떠났다.
아직도 부어오른 얼굴로 제복은 출구를 막아서서 사람들을 샅샅이 훑어보았다. 자, 누구든지 도망가 보아라. 제복의 시선에는 그런 결의가 담겨져 있었다. 사람들은 찔끔하여 눈동자를 내리깔았다.
"여보슈. 경찰 버스는 아무 곳에나 정차해도 도로 교통법에 안 걸리는 거요?"
더벅머리였다. 제복의 당당한 시선을 마주 잡으며 소리친 그는 의외로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야, 이 새꺄!"
더벅머리의 이 용기 있는 도전은 확실히 제복의 신경을 와지직 긁어 놓기에 충분해 보였다. 그러나 더벅머리는 여전히 여유만만했다.
"너무 새끼 새끼 마시오. 누군 처음부터 에미였나요?"
"이 자식이!"
내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제복은 이미 더벅머리의 목을 움켜쥐고 일으켜 세운 다음이었다. 아니, 움켜쥐었다기보다 더벅머리의 몸 전체가 제복의 손목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빤히 제복을 노려보던 더벅머리가 배시시 웃었다.
"이게 누굴 비웃어?"
제복의 주먹이 곧장 더벅머리의 얼굴을 향해 날았다. 더벅머리는 기우뚱거릴 사이도 없이 의자와 의자 사이의 좁은 공간에 거칠게 나뒹굴었다. 무더위로 끈끈해진 버스 속의 공간이 왈칵 곤두서는 것 같았다.
"으흐흐...견딜 수가 없단 말야. 모두 끈끈한 유리 속에 갇혀서 허덕이고만 있어. 찰거머리처럼 온몸을 조여 오는 이놈의 더위를 그럼 어쩌란 말인가. 흐흑...."
더벅머리가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두 주먹으로 버스의 창유리를 힘껏 후려쳤다. 쨍그렁,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더벅머리의 손목에 피가 튀었다.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깨어진 창을 비집고 들어왔다.
"그렇다, 창을 열자. 이 무더위는 더저히 더 견딜 수 없다!"
누군가 소리 질렀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무기력을 털고 일제히 일어선 사람들 때문에 버스 속은 돌연히 수라장이 되었다. 저마다 창문만 열어 놓으면 살겠다는 듯이 사람들은 창으로만 매달렸다. 순간, 삐익 하는 요란한 금속성이 들리며 버스가 급정거하였다. 그 바람에 일제히 일어섰던 사람들이 서로 뒤엉켜서 나뒹굴었다.
"사람이 치였다!"
문득 경악에 가득 찬 부르짖음이 들려왔다.
"여자다! 애기도 죽었다. 저 피!"
경찰 버스에 아기를 안고 가던 여자가 치인 모양이었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둔탁한 것으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아찔해졌다. 도대체 나는 뭘 하고 있단 말인가. 아내는 거꾸로 서서 버둥대는 아기 때문에 사지가 찢겨 죽어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아내는 이미 시뻘겋게 피를 뒤집어쓰고 죽었을 것이다.
나는 필사적으로 사람들이 매달려 아우성치는 출구를 향해 기어 나갔다. 검은 하늘에서 마침내 굵은 빗방울이 후드득 쏟아졌다. (p.86-88)
<작품이해>
<토끼와 잠수함>은 경범죄를 지은 사람들을 태운 경찰 버스 속의 살벌한 풍경을 묘사한다. 주인공은 만삭이 된 아내의 입원비를 빌려 황급히 집에 가느라 무단 횡단을 하다 잡혀 왔다. 소설은 그의 눈에 비친 버스 안의 사람들을 묘사한다. 그들은 모두 제복의 사내로 대변되는 권력 앞에 쩔쩔매는 불쌍하고 힘없는 소시민들일 뿐이다. 군사 독재 시대의 강압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힘없는 하층민을 억압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p.166-167)
...........................................................................................................................................................................................................................................................
박범신(朴範信, 1946년 8월 24일 ~ )
대한민국의 소설가, 아동문학가이다

전라북도 익산군 황화면(現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봉동리에서 출생하였고, 중학교 때부터 충청남도 논산군 강경읍에서 생활하였다. 전주교육대학을 거쳐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을 나온 그는 197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여름의 잔해(殘骸)〉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이어 〈식구〉,〈말뚝과 굴렁쇠〉,〈못과 망치〉 등의 단편과 《죽음보다 깊은 밤》,《깨소금과 옥떨메》,《풀잎처럼 눕다》,《불의 나라》 등의 장편을 신문이나 잡지에 연재했다. 1981년 장편 《겨울강, 하늬바람》으로 제1회 대한민국문학상 신인부문을 수상했다. 창작집 《토끼와 잠수함》이 있고 단편집으로 《아침에 날린 풍선》,《식구》, 중편집 《도시의 이끼》,《그들은 그렇게 잊었다》와 다수의 장편소설을 출간했다.
1993년 한 일간지에 소설을 연재하던 중 절필을 선언하고 1996년 중반까지 칩거에 들어갔으나, 1996년 《문학동네》 가을호에 중편소설 〈흰소가 끄는 수레〉를 발표하면서 다시 글쓰기를 시작하여, 장편 《침묵의 집》(1999)과 단편 〈향기로운 우물이야기〉(2001년) 등을 발표하였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를 지냈고, 2007년 KBS 한국방송공사 이사장과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았으며. 명지대학교로 복귀해서 문예창작학과 교수를 지낸 뒤 2011년 정년퇴임하였고 그 후 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명예교수를 지내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상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좌교수도 지내고 있다.
............................................

토끼와 잠수함 - 박범신 (문학동네)

박범신 중단편집 (문학동네)

은교 - 박범신 (문학동네)

고산자 - 박범신 (문학동네)

토끼와 잠수함 - 박범신 (창비)
.........................................................
'VII. 아동, 청소년 > 1. 한국 문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앞산도 첩첩하고 - 한승원 (한국헤르만헤세) (0) | 2023.07.26 |
|---|---|
| 첫눈 - 방영웅 (한국헤르만헤세) (0) | 2023.07.25 |
| 우리들의 장례식 - 박범신 (한국헤르만헤세) (0) | 2023.07.24 |
| 미지의 새 - 한수산 (한국헤르만헤세) (0) | 2023.07.21 |
| 침묵 - 한수산 (한국헤르만헤세) (0) | 2023.07.21 |



